[취재후] 세계 최고 배송 서비스 뒤에는…‘유령 노동자’의 한숨
입력 2019.05.27 (15:03)
수정 2019.05.27 (15: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무엇이든 집앞까지, 치열한 배송 경쟁
바야흐로 '배송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밤에 주문한 상품이 새벽이면 바로 배송돼 옵니다. 시장이나 대형마트에 들르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이 몇 시간 만에 집앞에 도착하는 세상. 갖가지 배달 음식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유통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배송업계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희한한 시장이 돼가고 있다." 소비자들이 필요를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불필요할 만큼 배송 시장이 과열돼 있다는 겁니다. 총알 배송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전쟁에 뛰어들 자본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배송 전쟁의 그늘이 이뿐만일까요. 무엇보다도 현재 3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배송, 배달 종사자들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노동 환경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분초 쫓겨가며 위험한 질주…"다치면 끝장"
1년 반째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는 최대송 씨를 만나 배달 과정을 동행해봤습니다. 배달 어플에 뜨는 '콜'을 잡아 음식점에 도착하고, 음식을 받아 배달을 완료하기까지 2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5분 안에는 물건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이라니, 아무리 4~5km 안팎의 거리를 왕복한다지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배달업체는 많고, 경쟁은 치열합니다. 한 번 배달에 받는 돈은 3천 원가량. 한 시간에 3~5건을 배달해야 생계가 유지됩니다. 사력을 다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토바이로 도심을 빠르게 달리는 것은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일입니다.
이들은 노동자가 아니고 '특수고용자' 신분입니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자영업자라는 얘기인데,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장의 폭이 넓은 종합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 해 보험료가 5, 6백만 원가량이 훌쩍 넘을 정도로 비싸기 때문입니다. 대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을 듭니다. 책임보험도 2, 3백만 원가량은 됩니다. 일하는 업체로부터 오토바이를 할부로 샀을 경우, 오토바이 가격에 보험료까지 내고 나면 당장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책임보험도 부담입니다.
배달하다가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는 한 배달원을 만났습니다. 이 배달원은 오토바이 없이 일을 시작했기에 배달 대행업체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려 일을 했습니다. 업체 소유의 오토바이였으니, 사고가 나자 업체로 250만 원의 대물보상이 이뤄졌습니다. 업체 사장은 이 배달원에게 '이럴 바에 차라리 개인 오토바이를 사라'고 권했고, 새 오토바이를 소개하며 46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다친 배달원은 사고 이후 결국 210만 원을 더 내고 업체로부터 새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뭔가 억울했지만,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배달원들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사고 내거나 다치면 안 됩니다. 진짜 끝장일 수도 있어요. 번 돈 다 날아갑니다."
배달앱 통해 일하는 '라이더', 소속은 어디?
특수고용직은 노동계의 오래된 논쟁입니다. 분명히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관리 감독도 받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일한 만큼 버는 자영업자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 배송/배달 종사자들은 노동자냐 아니냐,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일하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이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달 초, 배달원들은 자신들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라이더 유니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돼 고정적인 노동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 전속성이 강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쿠팡'처럼 일부 배송원들을 직고용하는 유통업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비정규직 배송원들은 과도한 노동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년 동안의 비정규직 기간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200여 건을 훌쩍 넘는 배송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사의 목표치는 갈수록 올라가고, 배송원들은 감내해야 했습니다. 비정규직 배송원들은 "회사는 우리를 소모품으로만 보는구나"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배달원들, "우리는 유령 노동자"
분명히 일하고 있지만, 노동자로서의 신분과 처우는 모호한 사람들. 배달원들은 자신들을 '유령 노동자'라고 칭합니다.
세상이 변화할수록 비정규직, 임시직, 초단기직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불러서 일을 맡기는 경영 효율화 이면에는 노동자 권리에 대한 책임 회피 문제도 있습니다. '배송 공화국' 대한민국의 그늘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바야흐로 '배송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밤에 주문한 상품이 새벽이면 바로 배송돼 옵니다. 시장이나 대형마트에 들르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이 몇 시간 만에 집앞에 도착하는 세상. 갖가지 배달 음식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유통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배송업계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희한한 시장이 돼가고 있다." 소비자들이 필요를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불필요할 만큼 배송 시장이 과열돼 있다는 겁니다. 총알 배송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전쟁에 뛰어들 자본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배송 전쟁의 그늘이 이뿐만일까요. 무엇보다도 현재 3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배송, 배달 종사자들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노동 환경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분초 쫓겨가며 위험한 질주…"다치면 끝장"
1년 반째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는 최대송 씨를 만나 배달 과정을 동행해봤습니다. 배달 어플에 뜨는 '콜'을 잡아 음식점에 도착하고, 음식을 받아 배달을 완료하기까지 2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5분 안에는 물건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이라니, 아무리 4~5km 안팎의 거리를 왕복한다지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배달업체는 많고, 경쟁은 치열합니다. 한 번 배달에 받는 돈은 3천 원가량. 한 시간에 3~5건을 배달해야 생계가 유지됩니다. 사력을 다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토바이로 도심을 빠르게 달리는 것은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일입니다.
이들은 노동자가 아니고 '특수고용자' 신분입니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자영업자라는 얘기인데,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장의 폭이 넓은 종합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 해 보험료가 5, 6백만 원가량이 훌쩍 넘을 정도로 비싸기 때문입니다. 대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을 듭니다. 책임보험도 2, 3백만 원가량은 됩니다. 일하는 업체로부터 오토바이를 할부로 샀을 경우, 오토바이 가격에 보험료까지 내고 나면 당장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책임보험도 부담입니다.
배달하다가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는 한 배달원을 만났습니다. 이 배달원은 오토바이 없이 일을 시작했기에 배달 대행업체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려 일을 했습니다. 업체 소유의 오토바이였으니, 사고가 나자 업체로 250만 원의 대물보상이 이뤄졌습니다. 업체 사장은 이 배달원에게 '이럴 바에 차라리 개인 오토바이를 사라'고 권했고, 새 오토바이를 소개하며 46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다친 배달원은 사고 이후 결국 210만 원을 더 내고 업체로부터 새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뭔가 억울했지만,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배달원들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사고 내거나 다치면 안 됩니다. 진짜 끝장일 수도 있어요. 번 돈 다 날아갑니다."
배달앱 통해 일하는 '라이더', 소속은 어디?
특수고용직은 노동계의 오래된 논쟁입니다. 분명히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관리 감독도 받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일한 만큼 버는 자영업자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 배송/배달 종사자들은 노동자냐 아니냐,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일하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이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달 초, 배달원들은 자신들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라이더 유니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돼 고정적인 노동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 전속성이 강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쿠팡'처럼 일부 배송원들을 직고용하는 유통업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비정규직 배송원들은 과도한 노동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년 동안의 비정규직 기간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200여 건을 훌쩍 넘는 배송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사의 목표치는 갈수록 올라가고, 배송원들은 감내해야 했습니다. 비정규직 배송원들은 "회사는 우리를 소모품으로만 보는구나"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배달원들, "우리는 유령 노동자"
분명히 일하고 있지만, 노동자로서의 신분과 처우는 모호한 사람들. 배달원들은 자신들을 '유령 노동자'라고 칭합니다.
세상이 변화할수록 비정규직, 임시직, 초단기직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불러서 일을 맡기는 경영 효율화 이면에는 노동자 권리에 대한 책임 회피 문제도 있습니다. '배송 공화국' 대한민국의 그늘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취재후] 세계 최고 배송 서비스 뒤에는…‘유령 노동자’의 한숨
-
- 입력 2019-05-27 15:03:39
- 수정2019-05-27 15:04:09

언제든 무엇이든 집앞까지, 치열한 배송 경쟁
바야흐로 '배송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밤에 주문한 상품이 새벽이면 바로 배송돼 옵니다. 시장이나 대형마트에 들르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이 몇 시간 만에 집앞에 도착하는 세상. 갖가지 배달 음식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유통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배송업계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희한한 시장이 돼가고 있다." 소비자들이 필요를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불필요할 만큼 배송 시장이 과열돼 있다는 겁니다. 총알 배송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전쟁에 뛰어들 자본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배송 전쟁의 그늘이 이뿐만일까요. 무엇보다도 현재 3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배송, 배달 종사자들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노동 환경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분초 쫓겨가며 위험한 질주…"다치면 끝장"
1년 반째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는 최대송 씨를 만나 배달 과정을 동행해봤습니다. 배달 어플에 뜨는 '콜'을 잡아 음식점에 도착하고, 음식을 받아 배달을 완료하기까지 2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5분 안에는 물건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이라니, 아무리 4~5km 안팎의 거리를 왕복한다지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배달업체는 많고, 경쟁은 치열합니다. 한 번 배달에 받는 돈은 3천 원가량. 한 시간에 3~5건을 배달해야 생계가 유지됩니다. 사력을 다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토바이로 도심을 빠르게 달리는 것은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일입니다.
이들은 노동자가 아니고 '특수고용자' 신분입니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자영업자라는 얘기인데,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장의 폭이 넓은 종합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 해 보험료가 5, 6백만 원가량이 훌쩍 넘을 정도로 비싸기 때문입니다. 대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을 듭니다. 책임보험도 2, 3백만 원가량은 됩니다. 일하는 업체로부터 오토바이를 할부로 샀을 경우, 오토바이 가격에 보험료까지 내고 나면 당장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책임보험도 부담입니다.
배달하다가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는 한 배달원을 만났습니다. 이 배달원은 오토바이 없이 일을 시작했기에 배달 대행업체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려 일을 했습니다. 업체 소유의 오토바이였으니, 사고가 나자 업체로 250만 원의 대물보상이 이뤄졌습니다. 업체 사장은 이 배달원에게 '이럴 바에 차라리 개인 오토바이를 사라'고 권했고, 새 오토바이를 소개하며 46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다친 배달원은 사고 이후 결국 210만 원을 더 내고 업체로부터 새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뭔가 억울했지만,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배달원들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사고 내거나 다치면 안 됩니다. 진짜 끝장일 수도 있어요. 번 돈 다 날아갑니다."
배달앱 통해 일하는 '라이더', 소속은 어디?
특수고용직은 노동계의 오래된 논쟁입니다. 분명히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관리 감독도 받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일한 만큼 버는 자영업자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 배송/배달 종사자들은 노동자냐 아니냐,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일하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이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달 초, 배달원들은 자신들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라이더 유니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돼 고정적인 노동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 전속성이 강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쿠팡'처럼 일부 배송원들을 직고용하는 유통업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비정규직 배송원들은 과도한 노동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년 동안의 비정규직 기간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200여 건을 훌쩍 넘는 배송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사의 목표치는 갈수록 올라가고, 배송원들은 감내해야 했습니다. 비정규직 배송원들은 "회사는 우리를 소모품으로만 보는구나"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배달원들, "우리는 유령 노동자"
분명히 일하고 있지만, 노동자로서의 신분과 처우는 모호한 사람들. 배달원들은 자신들을 '유령 노동자'라고 칭합니다.
세상이 변화할수록 비정규직, 임시직, 초단기직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불러서 일을 맡기는 경영 효율화 이면에는 노동자 권리에 대한 책임 회피 문제도 있습니다. '배송 공화국' 대한민국의 그늘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바야흐로 '배송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밤에 주문한 상품이 새벽이면 바로 배송돼 옵니다. 시장이나 대형마트에 들르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이 몇 시간 만에 집앞에 도착하는 세상. 갖가지 배달 음식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유통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배송업계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희한한 시장이 돼가고 있다." 소비자들이 필요를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불필요할 만큼 배송 시장이 과열돼 있다는 겁니다. 총알 배송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전쟁에 뛰어들 자본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배송 전쟁의 그늘이 이뿐만일까요. 무엇보다도 현재 3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배송, 배달 종사자들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노동 환경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분초 쫓겨가며 위험한 질주…"다치면 끝장"
1년 반째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는 최대송 씨를 만나 배달 과정을 동행해봤습니다. 배달 어플에 뜨는 '콜'을 잡아 음식점에 도착하고, 음식을 받아 배달을 완료하기까지 2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5분 안에는 물건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이라니, 아무리 4~5km 안팎의 거리를 왕복한다지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배달업체는 많고, 경쟁은 치열합니다. 한 번 배달에 받는 돈은 3천 원가량. 한 시간에 3~5건을 배달해야 생계가 유지됩니다. 사력을 다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토바이로 도심을 빠르게 달리는 것은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일입니다.
이들은 노동자가 아니고 '특수고용자' 신분입니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자영업자라는 얘기인데,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장의 폭이 넓은 종합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 해 보험료가 5, 6백만 원가량이 훌쩍 넘을 정도로 비싸기 때문입니다. 대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을 듭니다. 책임보험도 2, 3백만 원가량은 됩니다. 일하는 업체로부터 오토바이를 할부로 샀을 경우, 오토바이 가격에 보험료까지 내고 나면 당장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책임보험도 부담입니다.
배달하다가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는 한 배달원을 만났습니다. 이 배달원은 오토바이 없이 일을 시작했기에 배달 대행업체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려 일을 했습니다. 업체 소유의 오토바이였으니, 사고가 나자 업체로 250만 원의 대물보상이 이뤄졌습니다. 업체 사장은 이 배달원에게 '이럴 바에 차라리 개인 오토바이를 사라'고 권했고, 새 오토바이를 소개하며 46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다친 배달원은 사고 이후 결국 210만 원을 더 내고 업체로부터 새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뭔가 억울했지만,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배달원들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사고 내거나 다치면 안 됩니다. 진짜 끝장일 수도 있어요. 번 돈 다 날아갑니다."
배달앱 통해 일하는 '라이더', 소속은 어디?
특수고용직은 노동계의 오래된 논쟁입니다. 분명히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관리 감독도 받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일한 만큼 버는 자영업자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 배송/배달 종사자들은 노동자냐 아니냐,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일하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이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달 초, 배달원들은 자신들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라이더 유니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돼 고정적인 노동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 전속성이 강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쿠팡'처럼 일부 배송원들을 직고용하는 유통업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비정규직 배송원들은 과도한 노동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년 동안의 비정규직 기간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200여 건을 훌쩍 넘는 배송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사의 목표치는 갈수록 올라가고, 배송원들은 감내해야 했습니다. 비정규직 배송원들은 "회사는 우리를 소모품으로만 보는구나"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배달원들, "우리는 유령 노동자"
분명히 일하고 있지만, 노동자로서의 신분과 처우는 모호한 사람들. 배달원들은 자신들을 '유령 노동자'라고 칭합니다.
세상이 변화할수록 비정규직, 임시직, 초단기직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불러서 일을 맡기는 경영 효율화 이면에는 노동자 권리에 대한 책임 회피 문제도 있습니다. '배송 공화국' 대한민국의 그늘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
손은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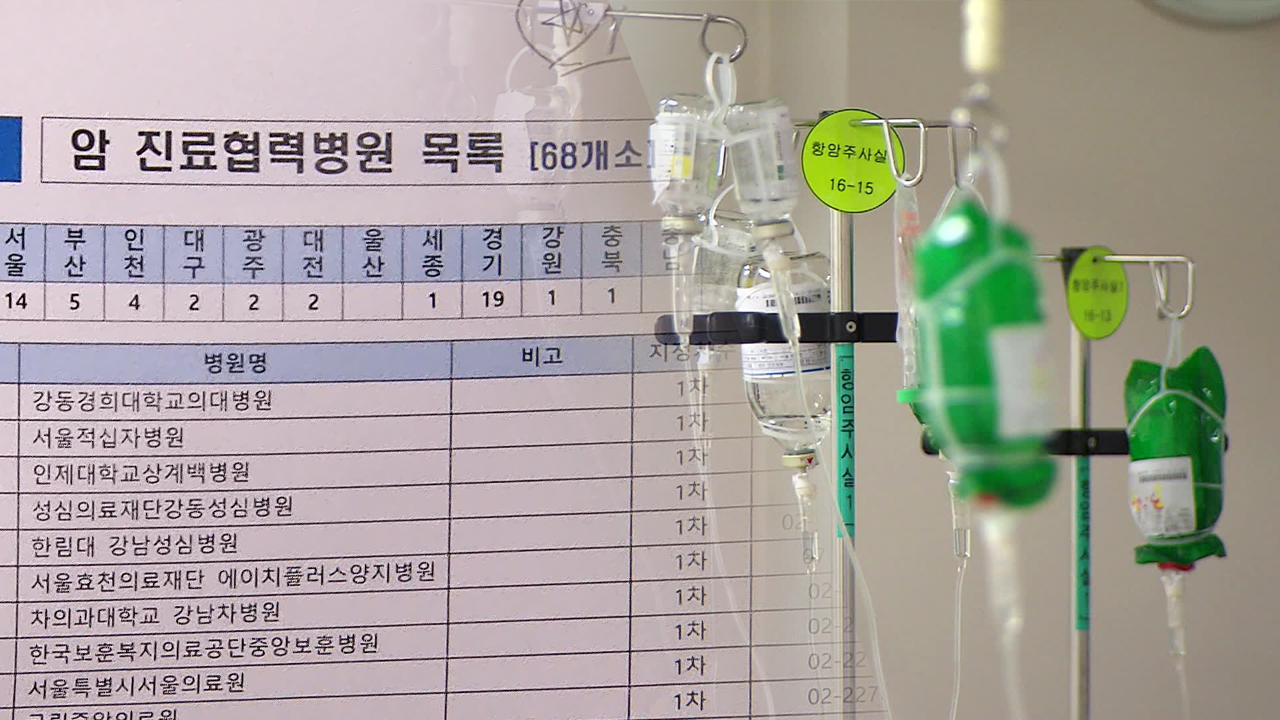

![[단독] “쿵쿵거리지 마” 이웃에 가스총 발사 난동 60대 체포](/data/layer/904/2024/04/20240426_kEfhp6.jpg)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