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반도체도 디스플레이도 없다…일, 전자산업의 몰락
입력 2019.04.19 (17: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안정 추구, 굼뜬 결정…사업 변신 늦어
‘재팬 스트라이크존’…1억 대 이상 시장에서 패퇴

‘일본, 액정산업 소멸’…‘재팬디스플레이, 중국·타이완 연합 밑으로’
지난 13일 도쿄 신문 1면 기사 제목이다.
실적 부진을 겪던 중소형 액정 패널 업체 JDI(재팬디스플레이)가 중국과 타이완 기업 연합으로부터 8백억 엔, 우리 돈 8,000억 원가량의 자금 지원을 받아 그 산하로 편입됐다는 기사다.
JDI는 2012년 히타치와 도시바, 소니의 디스플레이 사업부문을 통합해, 민관 펀드가 2,000억 엔, 2조 원 가량을 투입하며 출범한 회사였지만 불과 10년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매각의 길을 걷게 됐다.
2019년까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실적이 악화일로인데다 패널 부분에서의 사업 변신도 늦어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히노마루 액정'이라는 깃발을 치켜들었던 일본 정부도 손을 든 셈이다.
1990년대 후반 전 세계 LCD 시장 점유율을 80%까지 차지하며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일본 전자업계, 하지만 2016년 샤프가 타이완 업체에 넘어가고, 이번에 JDI까지 사실상 매각되면서 불과 20년 만에 이제 독자적인 일본 디스플레이 회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
돗토리 현과 이시가와 현에 위치한 JDI의 공장도 통폐합에 내몰리는 상황. 디스플레이도, 반도체도 이제 없는 일본 전자 업계의 몰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굼뜬 결정…사업 변신 늦어

JDI 경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늦은 사업 변신이 꼽힌다. 휴대전화 등에 쓰이는 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이 삼성 등이 주도하는 OLED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지만, JDI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도 LCD를 고수했다.
결국, 주 고객이었던 애플까지 LCD 대신 OLED 사용을 늘리면서 실적이 직격탄을 맞았고, 지분 매각에까지 이르게 됐다.
'결정의 지연', '선제적 투자의 결여' 등 일본 업체 특유의 단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과정이었다.
‘재팬 스트라이크존’…규모 커지면 ‘볼’ 남발
일본 전자업계 전문가인 도쿄이과대학 와카바야시 교수는 지난 18일 요미우리 기사를 통해 소니와 히타치 등 일본 전자 주요 8개 회사와 여기서 분리된 사업체의 이익을 모두 합한 총액이 30년 전인 1998년과 지난해인 2018년 사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인은 무엇일까?
'재팬 스트라이크존'. 와카바야시 교수가 일본 전자 업계의 부진을 설명하기 위해 내놓은 틀이다.
시장 규모가 1억 대를 넘지 않고, 제품 교체 사이클이 5년 이상 되는 존을 설정할 경우 이른바 이 같은 '재팬 스트라이크존' 내에서는 일본 기업이 강점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제품 사이클이 짧아질 경우 일본 기업은 부진을 못한다는 분석이다.
거액의 투자자금을 신속하게 투자하는 등 톱다운 형태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경영이 안 되기 때문인데 휴대전화, 컴퓨터 등이 모두 1억 대 이상의 규모를 넘어서자 일본 기업들의 존재감이 급속하게 약화됐다.
결국, 일본 전자 업계는 2000년대 들어 사업 재편에 직면하게 됐고, 2009년 파나소닉의 일본 내 다른 기업으로의 편입, 2011년 NEC의 컴퓨터 사업 중국 매각, 2012년 히타치와 NEC의 반도체 사업 부분을 합쳐 세운 엘피다의 파산, 2016년 샤프의 타이완에로의 매각 등 축소 일로를 걷게 됐다.
도시바 또한 회계 분식이 적발돼 SK 등이 참여한 펀드에 대규모 지분 매각을 단행해야만 했다.
안정 추구…변혁 못 해 결국 뒤처져
요미우리 신문은 90년대 전반까지 메모리 반도체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히타치에서 반도체 분야를 담당했던 한 이사의 말을 실었다.
"경영회의에서 위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안정적인 것을 목표로 해라. 매출 확대만을 염두에 두지 마라"
매출 확대와 기술 개발,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해 투자를 계속한 삼성전자에 일본 업체들이 패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첨단 기술을 자랑하던 일본 기업이었지만 급격한 매출 확대를 바탕으로 기술 개발에 올인한 삼성에 기술면에서도 뒤처지는 결과를 맞게 된 것이다.
가전에서 통신, 전력인프라까지 일본 가전업체들의 문어발식 사업 영역은 안정적인 성장에는 도움이 됐지만, 반도체 분야에서의 혁명적인 변화를 따라 잡을 의사 결정을 내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1990년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10위 기업 가운데 6개 이름을 올렸던 일본 전자업계는 지난해에는 단 한 곳도 10위 안에 들지 못했다.
지난 13일 도쿄 신문 1면 기사 제목이다.
실적 부진을 겪던 중소형 액정 패널 업체 JDI(재팬디스플레이)가 중국과 타이완 기업 연합으로부터 8백억 엔, 우리 돈 8,000억 원가량의 자금 지원을 받아 그 산하로 편입됐다는 기사다.
JDI는 2012년 히타치와 도시바, 소니의 디스플레이 사업부문을 통합해, 민관 펀드가 2,000억 엔, 2조 원 가량을 투입하며 출범한 회사였지만 불과 10년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매각의 길을 걷게 됐다.
2019년까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실적이 악화일로인데다 패널 부분에서의 사업 변신도 늦어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히노마루 액정'이라는 깃발을 치켜들었던 일본 정부도 손을 든 셈이다.
1990년대 후반 전 세계 LCD 시장 점유율을 80%까지 차지하며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일본 전자업계, 하지만 2016년 샤프가 타이완 업체에 넘어가고, 이번에 JDI까지 사실상 매각되면서 불과 20년 만에 이제 독자적인 일본 디스플레이 회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
돗토리 현과 이시가와 현에 위치한 JDI의 공장도 통폐합에 내몰리는 상황. 디스플레이도, 반도체도 이제 없는 일본 전자 업계의 몰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굼뜬 결정…사업 변신 늦어

JDI 경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늦은 사업 변신이 꼽힌다. 휴대전화 등에 쓰이는 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이 삼성 등이 주도하는 OLED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지만, JDI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도 LCD를 고수했다.
결국, 주 고객이었던 애플까지 LCD 대신 OLED 사용을 늘리면서 실적이 직격탄을 맞았고, 지분 매각에까지 이르게 됐다.
'결정의 지연', '선제적 투자의 결여' 등 일본 업체 특유의 단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과정이었다.
‘재팬 스트라이크존’…규모 커지면 ‘볼’ 남발
일본 전자업계 전문가인 도쿄이과대학 와카바야시 교수는 지난 18일 요미우리 기사를 통해 소니와 히타치 등 일본 전자 주요 8개 회사와 여기서 분리된 사업체의 이익을 모두 합한 총액이 30년 전인 1998년과 지난해인 2018년 사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인은 무엇일까?
'재팬 스트라이크존'. 와카바야시 교수가 일본 전자 업계의 부진을 설명하기 위해 내놓은 틀이다.
시장 규모가 1억 대를 넘지 않고, 제품 교체 사이클이 5년 이상 되는 존을 설정할 경우 이른바 이 같은 '재팬 스트라이크존' 내에서는 일본 기업이 강점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제품 사이클이 짧아질 경우 일본 기업은 부진을 못한다는 분석이다.
거액의 투자자금을 신속하게 투자하는 등 톱다운 형태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경영이 안 되기 때문인데 휴대전화, 컴퓨터 등이 모두 1억 대 이상의 규모를 넘어서자 일본 기업들의 존재감이 급속하게 약화됐다.
결국, 일본 전자 업계는 2000년대 들어 사업 재편에 직면하게 됐고, 2009년 파나소닉의 일본 내 다른 기업으로의 편입, 2011년 NEC의 컴퓨터 사업 중국 매각, 2012년 히타치와 NEC의 반도체 사업 부분을 합쳐 세운 엘피다의 파산, 2016년 샤프의 타이완에로의 매각 등 축소 일로를 걷게 됐다.
도시바 또한 회계 분식이 적발돼 SK 등이 참여한 펀드에 대규모 지분 매각을 단행해야만 했다.
안정 추구…변혁 못 해 결국 뒤처져
요미우리 신문은 90년대 전반까지 메모리 반도체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히타치에서 반도체 분야를 담당했던 한 이사의 말을 실었다.
"경영회의에서 위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안정적인 것을 목표로 해라. 매출 확대만을 염두에 두지 마라"
매출 확대와 기술 개발,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해 투자를 계속한 삼성전자에 일본 업체들이 패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첨단 기술을 자랑하던 일본 기업이었지만 급격한 매출 확대를 바탕으로 기술 개발에 올인한 삼성에 기술면에서도 뒤처지는 결과를 맞게 된 것이다.
가전에서 통신, 전력인프라까지 일본 가전업체들의 문어발식 사업 영역은 안정적인 성장에는 도움이 됐지만, 반도체 분야에서의 혁명적인 변화를 따라 잡을 의사 결정을 내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1990년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10위 기업 가운데 6개 이름을 올렸던 일본 전자업계는 지난해에는 단 한 곳도 10위 안에 들지 못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파원리포트] 반도체도 디스플레이도 없다…일, 전자산업의 몰락
-
- 입력 2019-04-19 17:32:27
안정 추구, 굼뜬 결정…사업 변신 늦어
<br />‘재팬 스트라이크존’…1억 대 이상 시장에서 패퇴

‘일본, 액정산업 소멸’…‘재팬디스플레이, 중국·타이완 연합 밑으로’
지난 13일 도쿄 신문 1면 기사 제목이다.
실적 부진을 겪던 중소형 액정 패널 업체 JDI(재팬디스플레이)가 중국과 타이완 기업 연합으로부터 8백억 엔, 우리 돈 8,000억 원가량의 자금 지원을 받아 그 산하로 편입됐다는 기사다.
JDI는 2012년 히타치와 도시바, 소니의 디스플레이 사업부문을 통합해, 민관 펀드가 2,000억 엔, 2조 원 가량을 투입하며 출범한 회사였지만 불과 10년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매각의 길을 걷게 됐다.
2019년까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실적이 악화일로인데다 패널 부분에서의 사업 변신도 늦어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히노마루 액정'이라는 깃발을 치켜들었던 일본 정부도 손을 든 셈이다.
1990년대 후반 전 세계 LCD 시장 점유율을 80%까지 차지하며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일본 전자업계, 하지만 2016년 샤프가 타이완 업체에 넘어가고, 이번에 JDI까지 사실상 매각되면서 불과 20년 만에 이제 독자적인 일본 디스플레이 회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
돗토리 현과 이시가와 현에 위치한 JDI의 공장도 통폐합에 내몰리는 상황. 디스플레이도, 반도체도 이제 없는 일본 전자 업계의 몰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굼뜬 결정…사업 변신 늦어

JDI 경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늦은 사업 변신이 꼽힌다. 휴대전화 등에 쓰이는 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이 삼성 등이 주도하는 OLED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지만, JDI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도 LCD를 고수했다.
결국, 주 고객이었던 애플까지 LCD 대신 OLED 사용을 늘리면서 실적이 직격탄을 맞았고, 지분 매각에까지 이르게 됐다.
'결정의 지연', '선제적 투자의 결여' 등 일본 업체 특유의 단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과정이었다.
‘재팬 스트라이크존’…규모 커지면 ‘볼’ 남발
일본 전자업계 전문가인 도쿄이과대학 와카바야시 교수는 지난 18일 요미우리 기사를 통해 소니와 히타치 등 일본 전자 주요 8개 회사와 여기서 분리된 사업체의 이익을 모두 합한 총액이 30년 전인 1998년과 지난해인 2018년 사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인은 무엇일까?
'재팬 스트라이크존'. 와카바야시 교수가 일본 전자 업계의 부진을 설명하기 위해 내놓은 틀이다.
시장 규모가 1억 대를 넘지 않고, 제품 교체 사이클이 5년 이상 되는 존을 설정할 경우 이른바 이 같은 '재팬 스트라이크존' 내에서는 일본 기업이 강점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제품 사이클이 짧아질 경우 일본 기업은 부진을 못한다는 분석이다.
거액의 투자자금을 신속하게 투자하는 등 톱다운 형태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경영이 안 되기 때문인데 휴대전화, 컴퓨터 등이 모두 1억 대 이상의 규모를 넘어서자 일본 기업들의 존재감이 급속하게 약화됐다.
결국, 일본 전자 업계는 2000년대 들어 사업 재편에 직면하게 됐고, 2009년 파나소닉의 일본 내 다른 기업으로의 편입, 2011년 NEC의 컴퓨터 사업 중국 매각, 2012년 히타치와 NEC의 반도체 사업 부분을 합쳐 세운 엘피다의 파산, 2016년 샤프의 타이완에로의 매각 등 축소 일로를 걷게 됐다.
도시바 또한 회계 분식이 적발돼 SK 등이 참여한 펀드에 대규모 지분 매각을 단행해야만 했다.
안정 추구…변혁 못 해 결국 뒤처져
요미우리 신문은 90년대 전반까지 메모리 반도체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히타치에서 반도체 분야를 담당했던 한 이사의 말을 실었다.
"경영회의에서 위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안정적인 것을 목표로 해라. 매출 확대만을 염두에 두지 마라"
매출 확대와 기술 개발,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해 투자를 계속한 삼성전자에 일본 업체들이 패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첨단 기술을 자랑하던 일본 기업이었지만 급격한 매출 확대를 바탕으로 기술 개발에 올인한 삼성에 기술면에서도 뒤처지는 결과를 맞게 된 것이다.
가전에서 통신, 전력인프라까지 일본 가전업체들의 문어발식 사업 영역은 안정적인 성장에는 도움이 됐지만, 반도체 분야에서의 혁명적인 변화를 따라 잡을 의사 결정을 내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1990년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10위 기업 가운데 6개 이름을 올렸던 일본 전자업계는 지난해에는 단 한 곳도 10위 안에 들지 못했다.
지난 13일 도쿄 신문 1면 기사 제목이다.
실적 부진을 겪던 중소형 액정 패널 업체 JDI(재팬디스플레이)가 중국과 타이완 기업 연합으로부터 8백억 엔, 우리 돈 8,000억 원가량의 자금 지원을 받아 그 산하로 편입됐다는 기사다.
JDI는 2012년 히타치와 도시바, 소니의 디스플레이 사업부문을 통합해, 민관 펀드가 2,000억 엔, 2조 원 가량을 투입하며 출범한 회사였지만 불과 10년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매각의 길을 걷게 됐다.
2019년까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실적이 악화일로인데다 패널 부분에서의 사업 변신도 늦어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히노마루 액정'이라는 깃발을 치켜들었던 일본 정부도 손을 든 셈이다.
1990년대 후반 전 세계 LCD 시장 점유율을 80%까지 차지하며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일본 전자업계, 하지만 2016년 샤프가 타이완 업체에 넘어가고, 이번에 JDI까지 사실상 매각되면서 불과 20년 만에 이제 독자적인 일본 디스플레이 회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
돗토리 현과 이시가와 현에 위치한 JDI의 공장도 통폐합에 내몰리는 상황. 디스플레이도, 반도체도 이제 없는 일본 전자 업계의 몰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굼뜬 결정…사업 변신 늦어

JDI 경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늦은 사업 변신이 꼽힌다. 휴대전화 등에 쓰이는 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이 삼성 등이 주도하는 OLED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지만, JDI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도 LCD를 고수했다.
결국, 주 고객이었던 애플까지 LCD 대신 OLED 사용을 늘리면서 실적이 직격탄을 맞았고, 지분 매각에까지 이르게 됐다.
'결정의 지연', '선제적 투자의 결여' 등 일본 업체 특유의 단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과정이었다.
‘재팬 스트라이크존’…규모 커지면 ‘볼’ 남발
일본 전자업계 전문가인 도쿄이과대학 와카바야시 교수는 지난 18일 요미우리 기사를 통해 소니와 히타치 등 일본 전자 주요 8개 회사와 여기서 분리된 사업체의 이익을 모두 합한 총액이 30년 전인 1998년과 지난해인 2018년 사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인은 무엇일까?
'재팬 스트라이크존'. 와카바야시 교수가 일본 전자 업계의 부진을 설명하기 위해 내놓은 틀이다.
시장 규모가 1억 대를 넘지 않고, 제품 교체 사이클이 5년 이상 되는 존을 설정할 경우 이른바 이 같은 '재팬 스트라이크존' 내에서는 일본 기업이 강점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제품 사이클이 짧아질 경우 일본 기업은 부진을 못한다는 분석이다.
거액의 투자자금을 신속하게 투자하는 등 톱다운 형태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경영이 안 되기 때문인데 휴대전화, 컴퓨터 등이 모두 1억 대 이상의 규모를 넘어서자 일본 기업들의 존재감이 급속하게 약화됐다.
결국, 일본 전자 업계는 2000년대 들어 사업 재편에 직면하게 됐고, 2009년 파나소닉의 일본 내 다른 기업으로의 편입, 2011년 NEC의 컴퓨터 사업 중국 매각, 2012년 히타치와 NEC의 반도체 사업 부분을 합쳐 세운 엘피다의 파산, 2016년 샤프의 타이완에로의 매각 등 축소 일로를 걷게 됐다.
도시바 또한 회계 분식이 적발돼 SK 등이 참여한 펀드에 대규모 지분 매각을 단행해야만 했다.
안정 추구…변혁 못 해 결국 뒤처져
요미우리 신문은 90년대 전반까지 메모리 반도체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히타치에서 반도체 분야를 담당했던 한 이사의 말을 실었다.
"경영회의에서 위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안정적인 것을 목표로 해라. 매출 확대만을 염두에 두지 마라"
매출 확대와 기술 개발,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해 투자를 계속한 삼성전자에 일본 업체들이 패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첨단 기술을 자랑하던 일본 기업이었지만 급격한 매출 확대를 바탕으로 기술 개발에 올인한 삼성에 기술면에서도 뒤처지는 결과를 맞게 된 것이다.
가전에서 통신, 전력인프라까지 일본 가전업체들의 문어발식 사업 영역은 안정적인 성장에는 도움이 됐지만, 반도체 분야에서의 혁명적인 변화를 따라 잡을 의사 결정을 내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1990년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10위 기업 가운데 6개 이름을 올렸던 일본 전자업계는 지난해에는 단 한 곳도 10위 안에 들지 못했다.
-
-

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이승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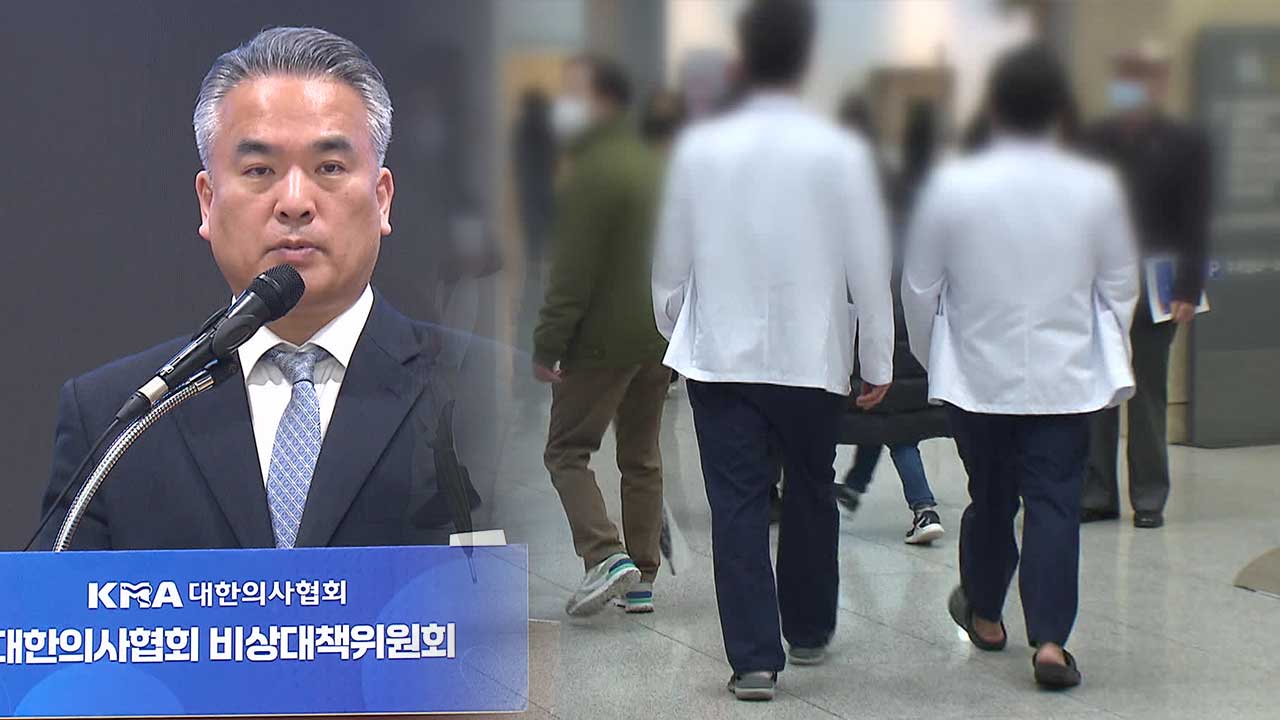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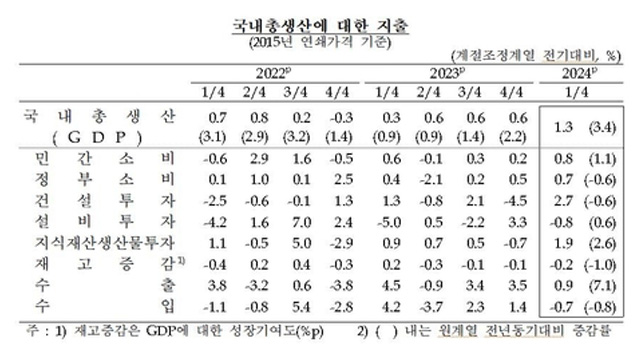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