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라이벌 프레이저, 간암 이겨라!”
입력 2011.11.07 (13:25)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CLOVA Summary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복서 무하마드 알리(69)가 한때 적수였던 조 프레이저(67)에게 간암과의 싸움에서 이기라는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고 미국 CBS방송이 7일 보도했다.
알리의 라이벌이었던 프레이저는 4~5주 전쯤 간암 진단을 받고 현재 미국 필라델피아의 호스피스 시설에서 투병 중이다.
알리는 이날 성명서에서 "조와 관련된 소식을 믿기 어려웠고 받아들이기는 더더욱 어려웠다. 조는 파이터이고 챔피언이다. 나는 그의 '최후의 승부'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 가족과 나는 조와 그의 가족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 나 역시 조를 응원하는 많은 친구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프레이저는 알리, 조지 포먼(62)과 함께 1970년대 헤비급 복싱 전성기를 이끌었다.
1970년 지미 엘리스를 5라운드 만에 캔버스에 눕히고 헤비급 챔피언 벨트를 차지한 프레이저는 1973년 포먼에게 2라운드 동안 여섯 차례나 쓰러진 끝에 KO패할 때까지 4차례나 성공적으로 타이틀을 방어했다.
프레이저는 작은 체구에도 '스모킹(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라는 의미) 조'라고 불릴 정도로 펀치를 폭풍처럼 뿜어내며 상대를 맹렬하게 공격했다. 특히 전광석화 같은 레프트 훅은 일품이었다.
프레이저는 알리를 처음으로 꺾은 복서로 유명하다.
프레이저는 1971년 3월8일 미국 뉴욕의 메디슨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알리와의 경기에서 15라운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심판 전원 판정승을 거뒀다.
프레이저는 '세기의 대결'로 알려진 이 경기에서 승리했지만 이후 2차례에 걸친 맞대결에서는 모두 졌다.
1975년 10월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세기의 대결' 마지막 경기 15라운드에서는 프레이저의 한쪽 눈이 부어 올라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이르렀다.
프레이저는 계속 싸우길 원했지만 트레이너가 수건을 던져 경기를 포기했다.
알리는 그 승부가 끝난 뒤 그가 상상할 수 있는 죽음에 가장 근접한 시합이었다고 회고했다.
프레이저는 그를 '엉클 톰', '고릴라'라고 부르며 조롱한 알리에 대해 수십 년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곤 했지만 최근에는 알리의 거친 말들과 행동을 모두 용서한다고 말했다.
알리의 라이벌이었던 프레이저는 4~5주 전쯤 간암 진단을 받고 현재 미국 필라델피아의 호스피스 시설에서 투병 중이다.
알리는 이날 성명서에서 "조와 관련된 소식을 믿기 어려웠고 받아들이기는 더더욱 어려웠다. 조는 파이터이고 챔피언이다. 나는 그의 '최후의 승부'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 가족과 나는 조와 그의 가족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 나 역시 조를 응원하는 많은 친구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프레이저는 알리, 조지 포먼(62)과 함께 1970년대 헤비급 복싱 전성기를 이끌었다.
1970년 지미 엘리스를 5라운드 만에 캔버스에 눕히고 헤비급 챔피언 벨트를 차지한 프레이저는 1973년 포먼에게 2라운드 동안 여섯 차례나 쓰러진 끝에 KO패할 때까지 4차례나 성공적으로 타이틀을 방어했다.
프레이저는 작은 체구에도 '스모킹(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라는 의미) 조'라고 불릴 정도로 펀치를 폭풍처럼 뿜어내며 상대를 맹렬하게 공격했다. 특히 전광석화 같은 레프트 훅은 일품이었다.
프레이저는 알리를 처음으로 꺾은 복서로 유명하다.
프레이저는 1971년 3월8일 미국 뉴욕의 메디슨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알리와의 경기에서 15라운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심판 전원 판정승을 거뒀다.
프레이저는 '세기의 대결'로 알려진 이 경기에서 승리했지만 이후 2차례에 걸친 맞대결에서는 모두 졌다.
1975년 10월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세기의 대결' 마지막 경기 15라운드에서는 프레이저의 한쪽 눈이 부어 올라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이르렀다.
프레이저는 계속 싸우길 원했지만 트레이너가 수건을 던져 경기를 포기했다.
알리는 그 승부가 끝난 뒤 그가 상상할 수 있는 죽음에 가장 근접한 시합이었다고 회고했다.
프레이저는 그를 '엉클 톰', '고릴라'라고 부르며 조롱한 알리에 대해 수십 년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곤 했지만 최근에는 알리의 거친 말들과 행동을 모두 용서한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많이 본 뉴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


![[영상] 트럼프-머스크 “또 만났네”, 이번엔 스페이스X 발사 현장](/data/fckeditor/vod/2024/11/20/328301732099112829.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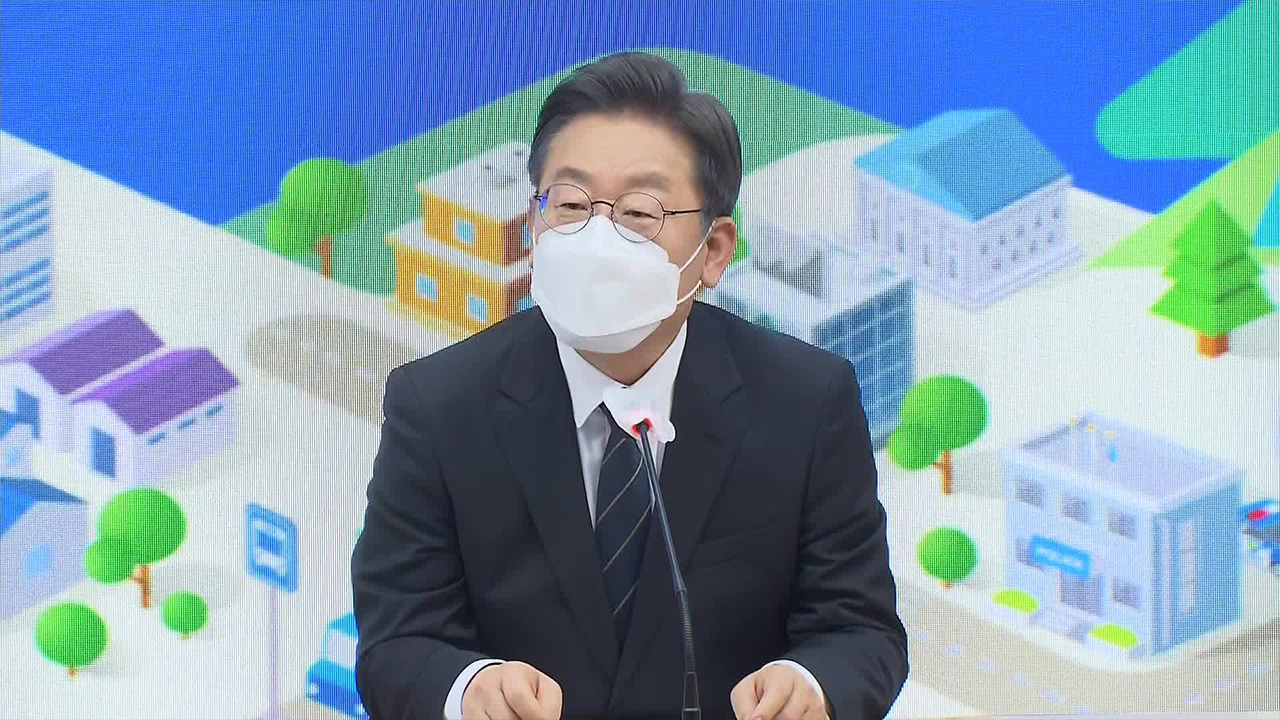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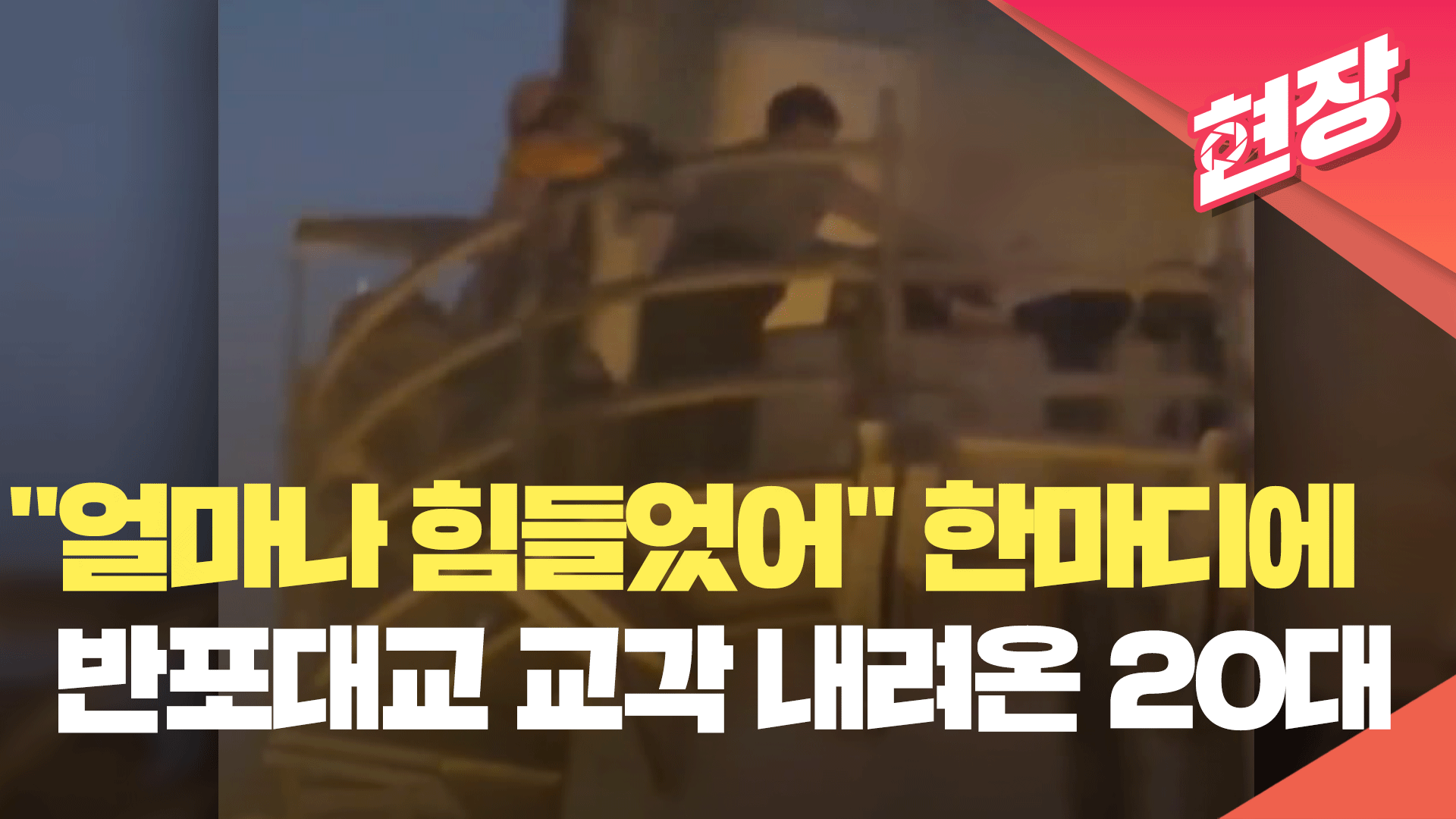


![[KBS 스페셜] 박영석 대장, 안나푸르나 마지막 10일의 기록](/data/news/2011/11/13/2387659_5W5.jpg)
![[활력충전] “감 먹으면 변비”…진실은?](/data/news/2011/10/31/2380518_1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