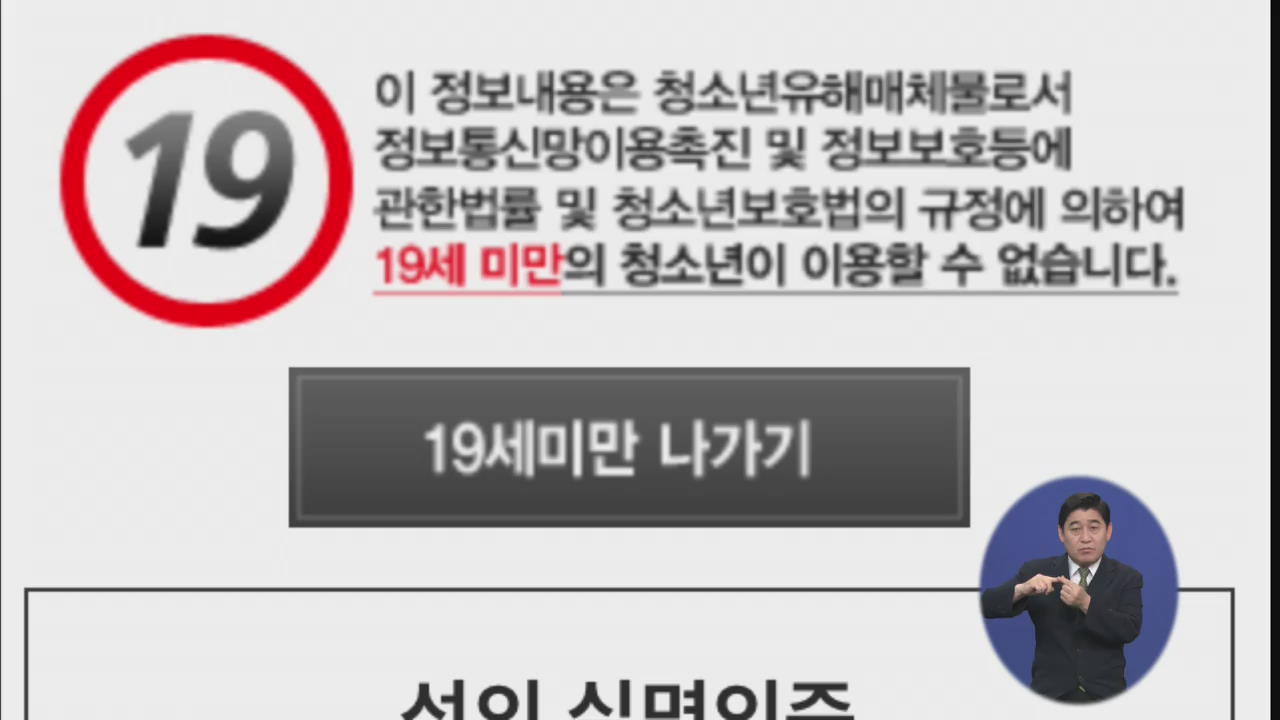[뉴스해설] 양적완화 축소에 대비해야
입력 2013.06.17 (07:35)
수정 2013.06.17 (07:57)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CLOVA Summary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전주성 객원해설위원]
최근 들어 세계 금융시장이 급격히 출렁이면서 대외 여건에 예민한 우리 경제의 전망도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주도하고 유럽과 일본이 따라한 양적완화, 즉 돈 풀기 정책이 한계점에 도달했고, 앞으로는 유동성 축소가 새로운 기조로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물론 경기가 나쁠 때 유동성을 공급해 총수요를 늘이고, 경기가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면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것이 정상적인 통화정책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정상적인 수단이 잘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제각각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실물경제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초저금리가 유지되다 보니 금융 자본은 조금이라도 더 수익이 클 듯한 곳을 찾아 세계 시장을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우리처럼 외국자본 노출이 큰 신흥시장입니다.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신흥시장국 주식시장과 환율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돈이 지나치게 풀려서 거품이 형성됐다가 이것이 꺼지는 시점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국제자본시장이 통합되어 있는 오늘 날에는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거품의 붕괴가 우리에게도 직격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08년도의 미국발 금융위기에 우리 자본시장이 붕괴직전까지 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문제는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몇 년간 고삐 없이 풀려나갔던 선진국의 유동성이 방향을 틀게 되면 우리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는 상당한 충격과 변동성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 까요. 수출을 통해 외환보유고를 늘이고, 자본유출입 규제를 강화하고, 통화 스와프와 같은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늘 취약하기만 한 우리의 금융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최근 들어 세계 금융시장이 급격히 출렁이면서 대외 여건에 예민한 우리 경제의 전망도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주도하고 유럽과 일본이 따라한 양적완화, 즉 돈 풀기 정책이 한계점에 도달했고, 앞으로는 유동성 축소가 새로운 기조로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물론 경기가 나쁠 때 유동성을 공급해 총수요를 늘이고, 경기가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면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것이 정상적인 통화정책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정상적인 수단이 잘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제각각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실물경제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초저금리가 유지되다 보니 금융 자본은 조금이라도 더 수익이 클 듯한 곳을 찾아 세계 시장을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우리처럼 외국자본 노출이 큰 신흥시장입니다.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신흥시장국 주식시장과 환율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돈이 지나치게 풀려서 거품이 형성됐다가 이것이 꺼지는 시점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국제자본시장이 통합되어 있는 오늘 날에는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거품의 붕괴가 우리에게도 직격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08년도의 미국발 금융위기에 우리 자본시장이 붕괴직전까지 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문제는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몇 년간 고삐 없이 풀려나갔던 선진국의 유동성이 방향을 틀게 되면 우리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는 상당한 충격과 변동성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 까요. 수출을 통해 외환보유고를 늘이고, 자본유출입 규제를 강화하고, 통화 스와프와 같은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늘 취약하기만 한 우리의 금융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많이 본 뉴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
![[톡톡! 생활] 시원하고 상쾌하게! 얼음의 재탄생](https://news.kbs.co.kr/data/news/2013/06/17/2676142_21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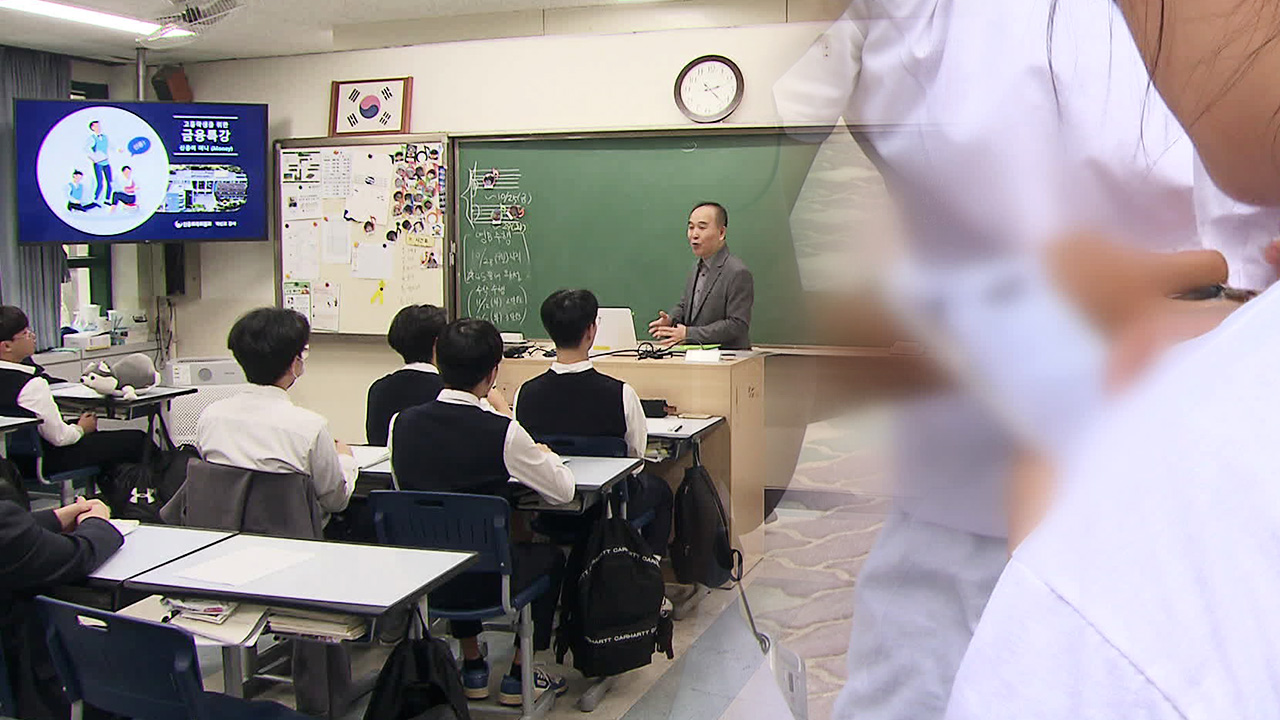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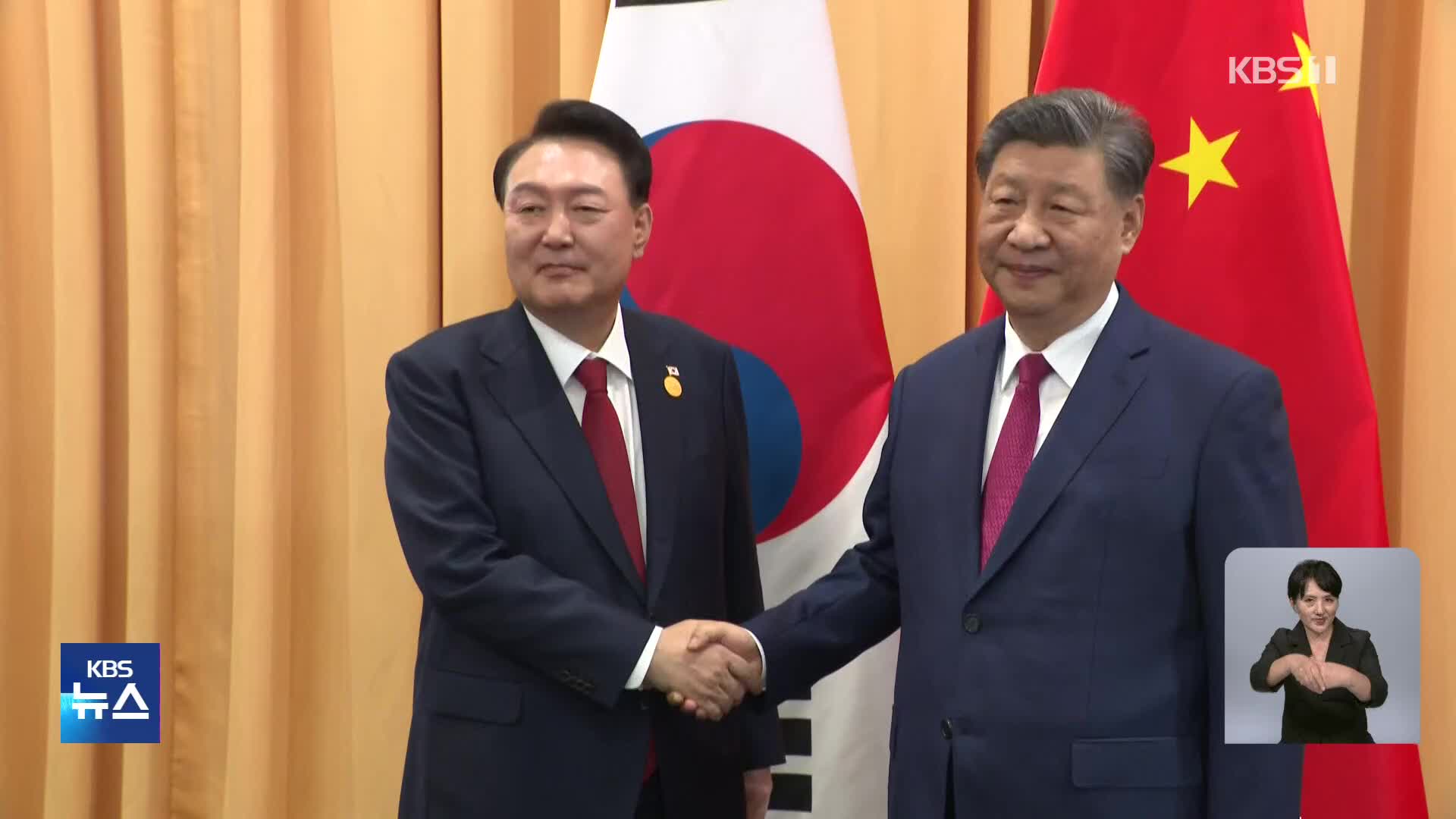
![[단독] 한동훈 “민주당, ‘현타’ 올 것…겁박 시위가 오히려 역효과 내”](/data/news/2024/11/15/20241115_zy0ZHv.jpg)
![[단독] ‘킥보드 폭행’ 유치원 교사, 피해 아동 11명 더 있었다…“떨어진 밥 주워먹어”](/data/fckeditor/new/image/2024/11/16/333831731671826376.jpg)
![[건강충전] ‘성인 아토피’ 급증, 원인과 대책?](/data/news/2013/06/13/2674396_90.jpg)
![[이슈&뉴스] 생활고에 시달리는 6.25 참전용사](/data/news/2013/06/06/2671197_14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