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노장 명장, 아들 뻘 감독들에 도전
입력 2013.12.23 (16:47)
수정 2013.12.23 (22:18)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CLOVA Summary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차만(63) 감독을 선임한 경남FC에 이어 성남시민축구단(가칭)이 23일 '승부사' 박종환(75) 감독을 초대 사령탑으로 임명했다.
K리그는 최근 몇 년 사이 40대 초반의 지도자들이 잇따라 지휘봉을 잡아 '준수한' 성적을 거두며 '젊은 감독 전성시대'가 이어져왔다.
신태용(43) 감독이 2008년부터 4년간 성남 일화를 이끌며 2010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2011년 대한축구협회(FA)컵 우승을 일구며 새 물결에 앞장섰다.
최용수(40) 감독은 마흔살도 채 되지 않은 2012년 FC서울을 K리그 챔피언 자리에 올려놨고, 황선홍(45) 감독은 외국인 선수 한 명도 없이 올시즌 K리그와 FA컵에서 정상에 오르는 '더블' 신화를 썼다.
서정원(43) 감독도 올해부터 수원 삼성을 이끌며 명가 재건을 이끌고 있다.
기업구단이 호성적을 올리자 시민구단들도 올해 강원FC가 김용갑(44) 전 감독을, 대전시티즌이 김인완(42) 감독을 사령탑에 앉히며 젊은 바람에 동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분위기에 밀려 경험과 관록을 갖춘 실력 있는 노장들이 일찍부터 설 자리를 잃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지난 시즌 K리그 최고령 감독이었던 김호곤(62) 전 울산 현대 감독은 최근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노장은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것"이라는 말로 이런 젊은 감독을 선호하는 분위기에 대해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렇게 젊은 감독을 선호하던 프로축구계가 내년 시즌을 앞두고 다시 노장을 불러들인 데에는 올해부터 본격 도입된 승강제의 영향이 커 보인다.
올해 막판 치열한 강등권 싸움이 벌어지자 구단들이 돌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팀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노장들에 눈길을 돌린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정된 예산으로 기업구단들과 겨뤄야 하는 시민구단들은 이미 뚜렷한 성과를 낸 감독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 감독과 박 감독을 선임한 경남FC와 성남 모두 시민구단이다.
신문선 명지대 교수는 "경남과 성남의 감독 선임 배경에 차이가 있지만 부족한 예산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적합해 보이는 인사를 골랐다는 것은 공통점"이라면서 "과거 성과를 기준으로 내년 시즌 성적 면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감독을 선택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오랜 기간 K리그 현장을 떠나있던 이들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현대 축구의 흐름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지 미지수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감독은 15년, 박 감독은 7년만의 프로축구 무대 복귀다.
신 교수는 "2∼3년은 상전벽해 수준으로 축구의 흐름이 변하는 시간"이라면서 "두 노장이 현장에 있을 때보다 축구가 훨씬 간결해지고 점유율 싸움이 치열해졌다. 과거 자신들의 전술이 이런 변화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많이 본 뉴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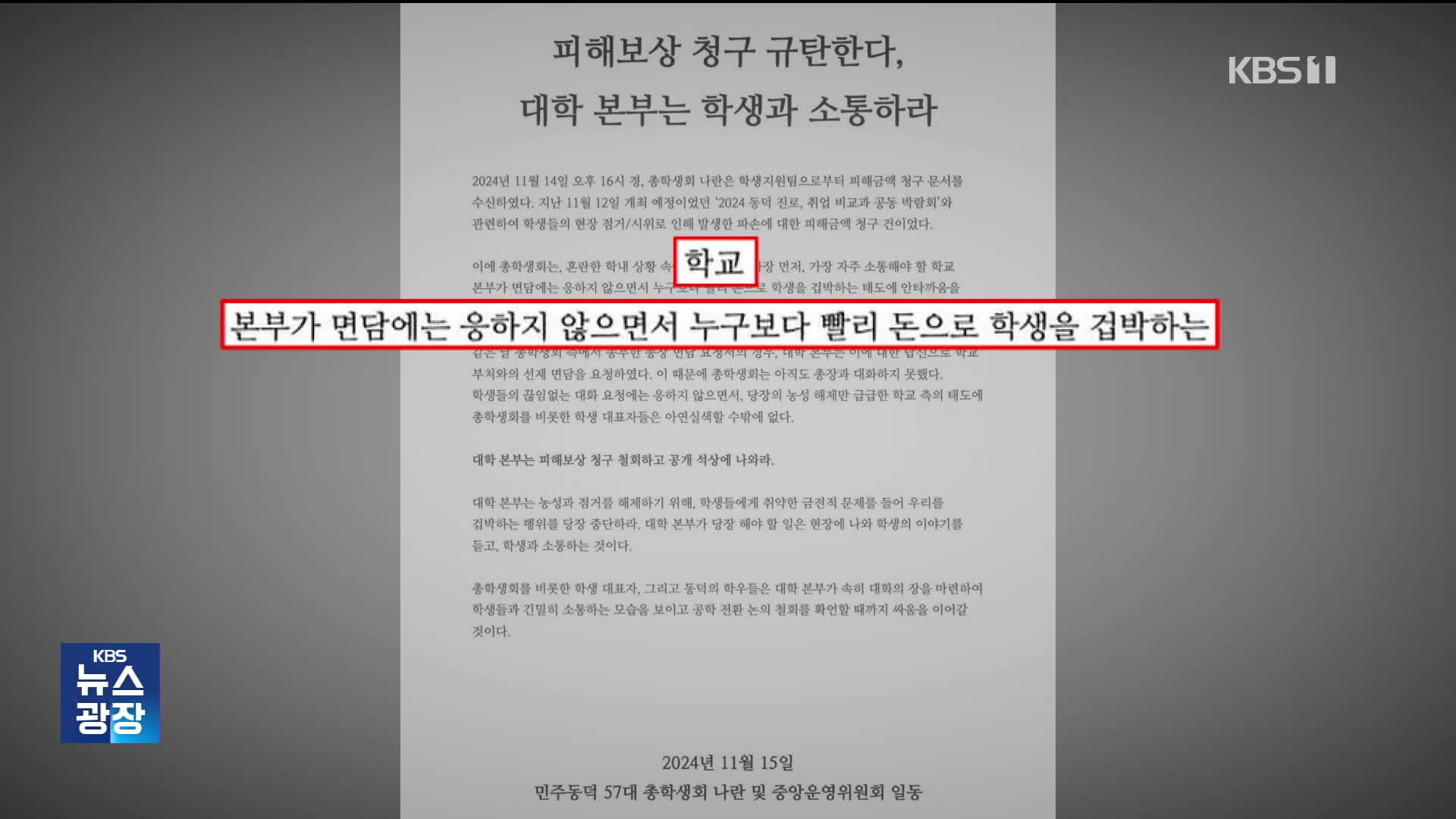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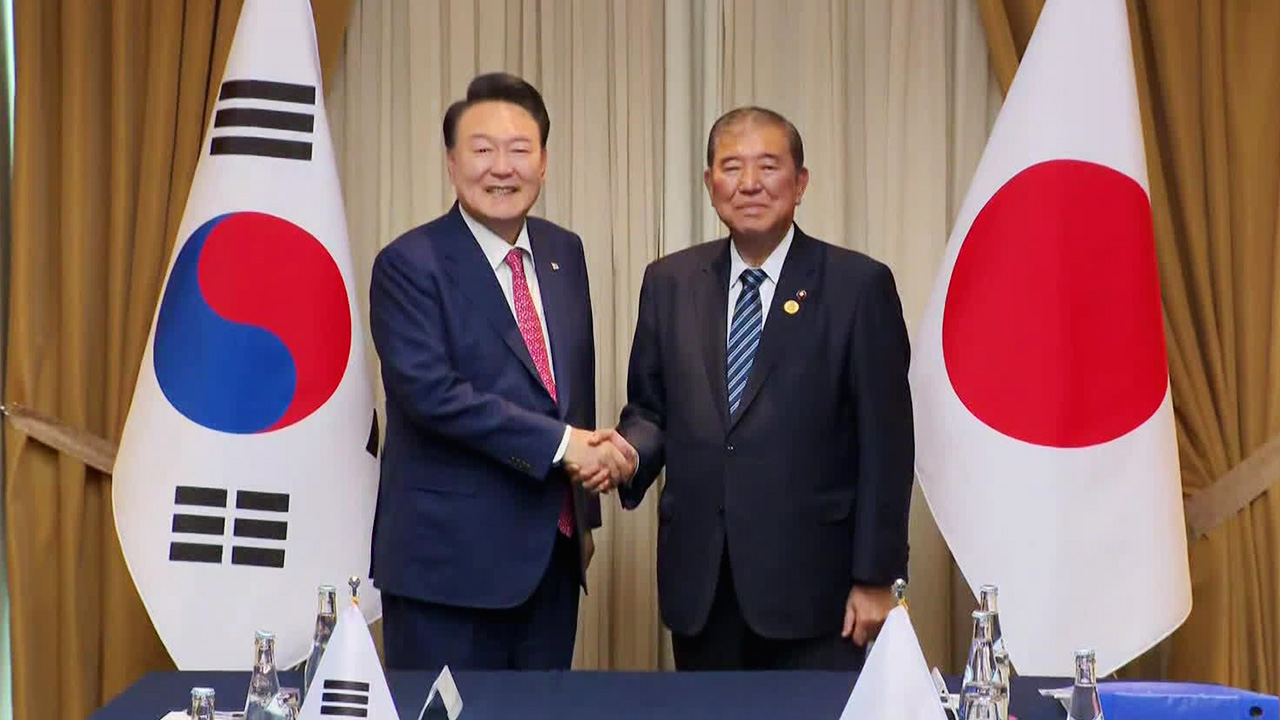


![[주요장면] ‘네이마르 해트트릭’ 바르샤, 16강행](/data/news/2013/12/12/2770684_tSj.jpg)
![[화제포착] 유통기한 지나면 그냥 버린다? 진실은…](/data/news/2013/12/09/2768515_9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