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 올림픽, 그 현장을 가다
입력 2013.08.06 (06:23)
수정 2013.08.06 (07:21)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CLOVA Summary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앵커 멘트>
악성코드가 핵폭탄이나 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일 수 있다는 현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최근 들어 화이트 해커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해커 올림픽 대회가 열렸는데, 그 현장을 박영환 특파원이 가봤습니다.
<리포트>
세계 최고 해커들이 전쟁을 치루는 현장은 어두웠습니다.
8명이 한 팀을 이뤘습니다.
20여 개 팀이 50시간 동안 공격과 방어를 되풀이 했습니다.
상대편 비밀번호를 뚫어 서버에 침투한 뒤 자신의 키를 심으면 득점을 얻는 방식.
한국팀은 1위,2위를 미국에 내줬지만 일본,중국을 꺾고 3위에 올랐습니다.
<인터뷰> 박찬암(라온 시큐어 팀장) : "악의적인 사이버 범죄자나 해커들로 부터 컴퓨터 시스템이나 자기 자산을 보호하는 그런 기술을 익히는 것이..."
올해가 21번째인 대회는 국가 대항전 성격도 있어 '해커 올림픽'으로도 불립니다.
화이트 해커 양성과 유치가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데프콘 대회는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게리 라이머(미국 보안업체 직원) : "컴퓨터 보안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용자들은 좋은 보호프로그램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훌륭한 해커를 구하고 싶습니다."
사설 해커 집단이 마련한 국제해킹대회는 전 세계에서 내노라하는 전문가 5천 여명이 몰려드는 등 사이버 보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악성코드가 핵폭탄이나 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일 수 있다는 현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최근 들어 화이트 해커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해커 올림픽 대회가 열렸는데, 그 현장을 박영환 특파원이 가봤습니다.
<리포트>
세계 최고 해커들이 전쟁을 치루는 현장은 어두웠습니다.
8명이 한 팀을 이뤘습니다.
20여 개 팀이 50시간 동안 공격과 방어를 되풀이 했습니다.
상대편 비밀번호를 뚫어 서버에 침투한 뒤 자신의 키를 심으면 득점을 얻는 방식.
한국팀은 1위,2위를 미국에 내줬지만 일본,중국을 꺾고 3위에 올랐습니다.
<인터뷰> 박찬암(라온 시큐어 팀장) : "악의적인 사이버 범죄자나 해커들로 부터 컴퓨터 시스템이나 자기 자산을 보호하는 그런 기술을 익히는 것이..."
올해가 21번째인 대회는 국가 대항전 성격도 있어 '해커 올림픽'으로도 불립니다.
화이트 해커 양성과 유치가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데프콘 대회는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게리 라이머(미국 보안업체 직원) : "컴퓨터 보안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용자들은 좋은 보호프로그램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훌륭한 해커를 구하고 싶습니다."
사설 해커 집단이 마련한 국제해킹대회는 전 세계에서 내노라하는 전문가 5천 여명이 몰려드는 등 사이버 보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많이 본 뉴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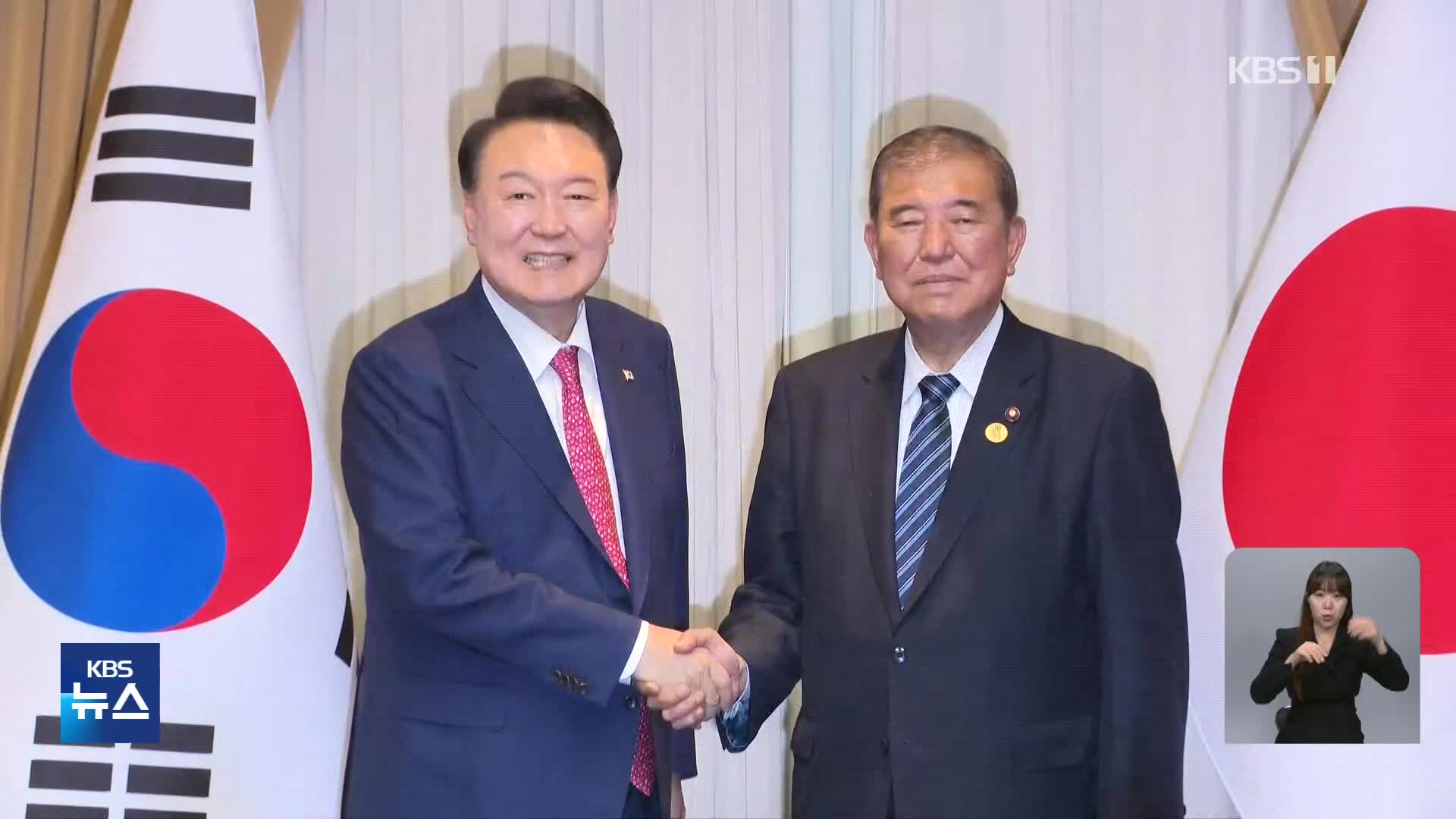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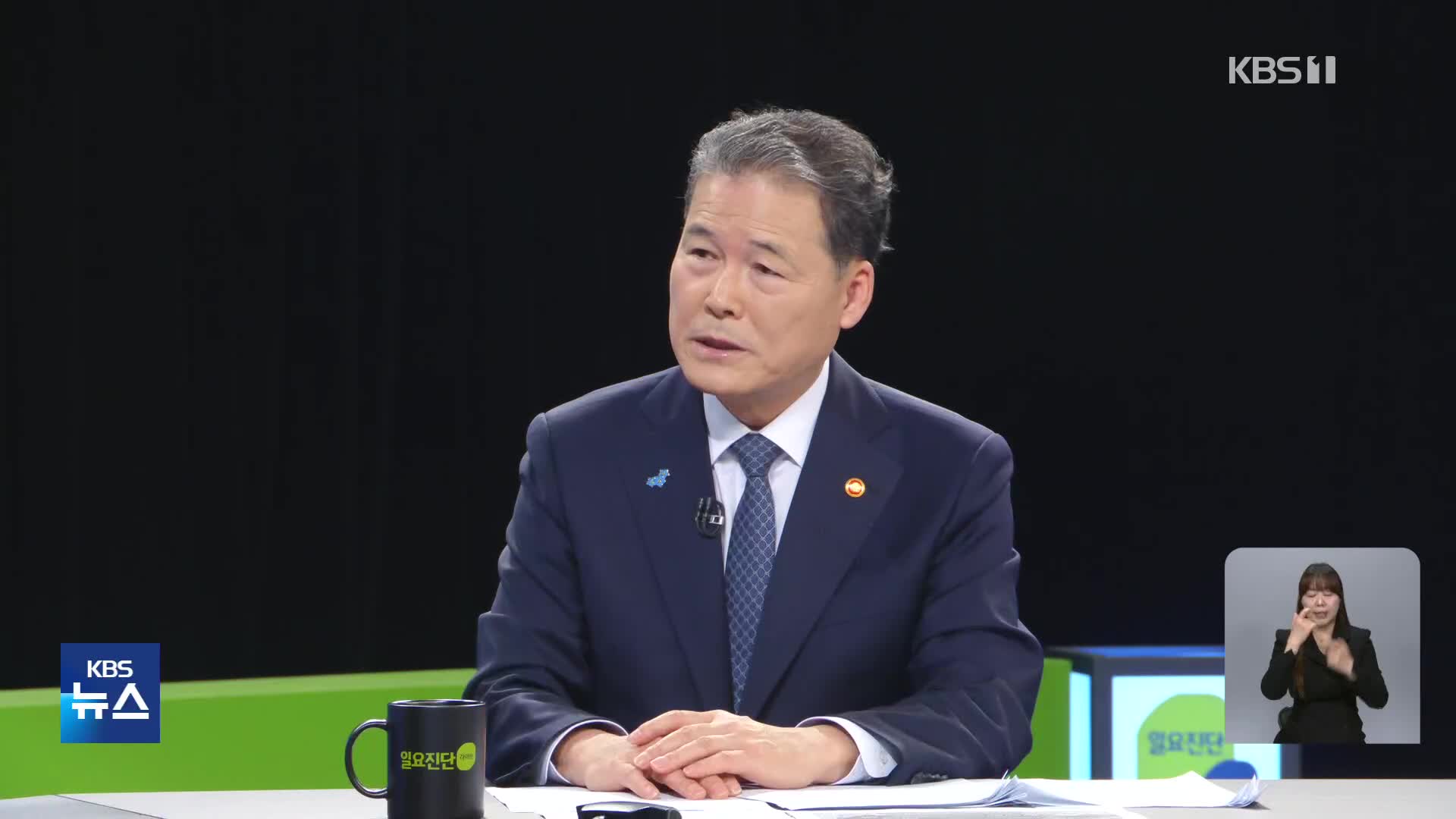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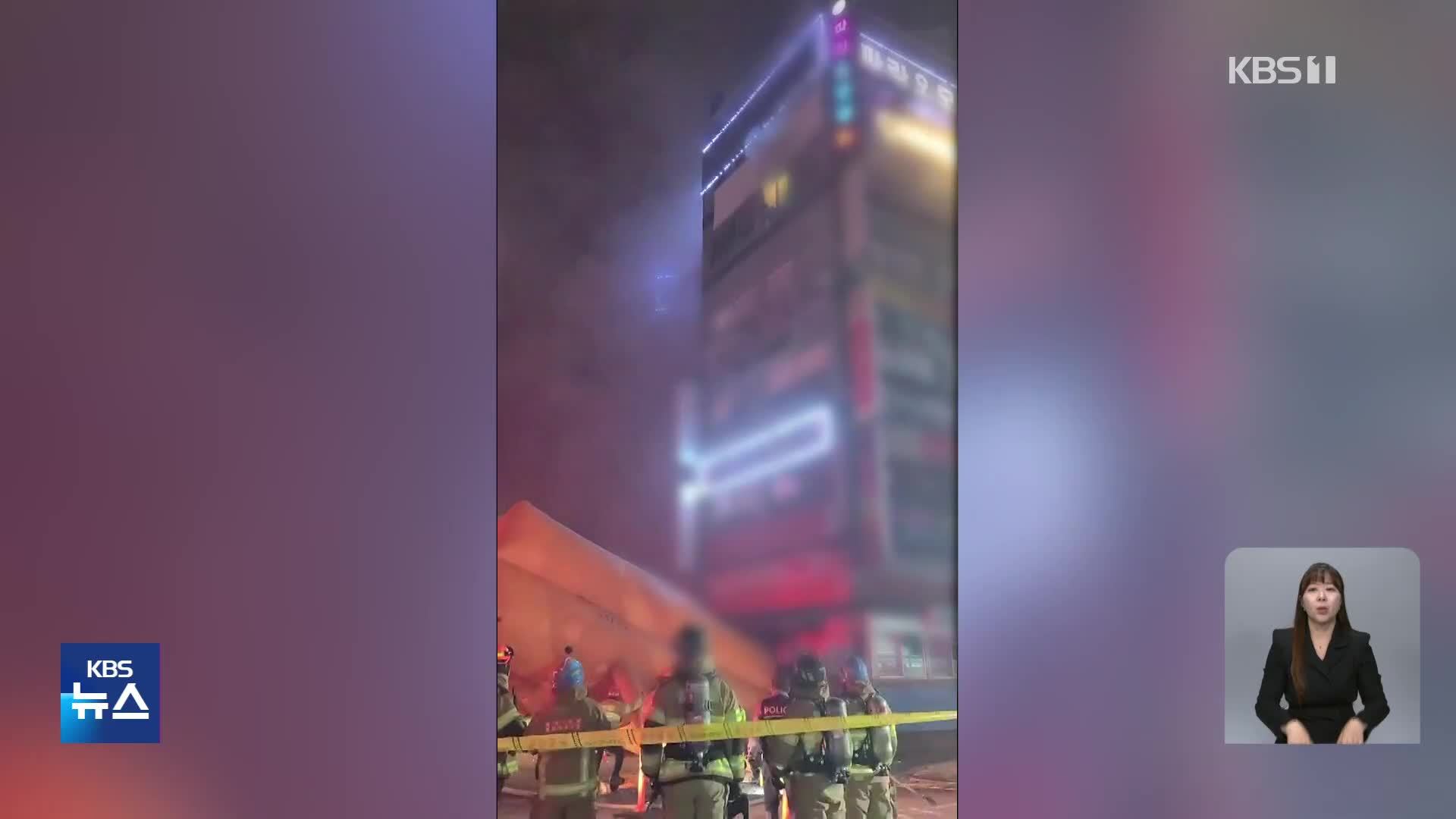
![[영상] 류중일 호의 특급 불펜 김서현, ‘이 남자, 성장 속도 미쳤다’](/data/fckeditor/vod/2024/11/17/kn10539173186604740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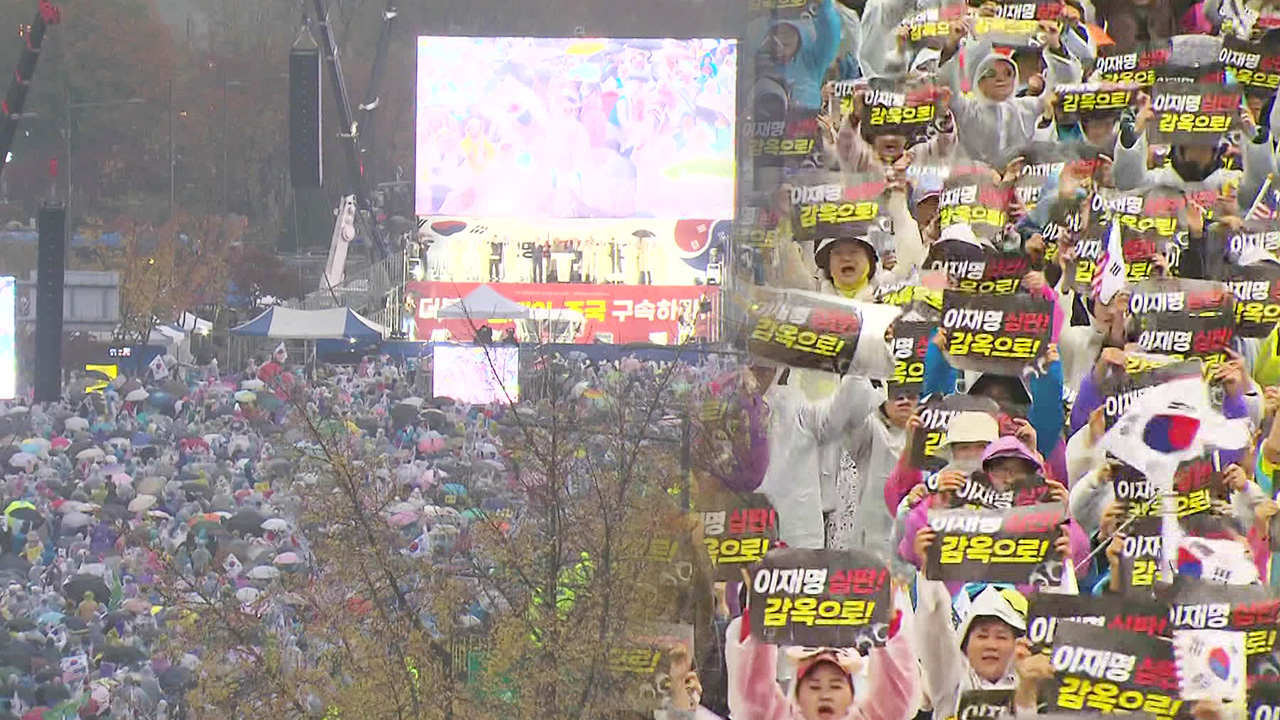


![[화제포착] “집 나간 고양이, 이것만 알면 찾아요”](/data/news/2013/07/25/2696845_13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