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상품권 안 받아요” 시장서 외면…왜?
입력 2014.08.30 (06:52)
수정 2014.08.30 (08:28)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CLOVA Summary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앵커 멘트>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 대거 풀리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조차 외면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물건을 고르고 상품권을 내밀자, 상인은 손사래를 치며 현금을 요구합니다.
가맹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녹취> 전통시장 상인 :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되는 줄 모르고 그냥 (가맹) 안 했어요."
전국의 전통시장 점포 18만여 곳 가운데 온누리 상품권 가맹 계약을 아예 맺지 않은 곳이 15퍼센트나 됩니다.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도 현금 결제를 유도합니다.
<녹취> 시장 상인 : "(가맹을 안 하셨어요?) 했는데, (상품권) 안 받으려고. (받긴 받으시죠?) 될 수 있으면 안 받으려고."
은행을 직접 찾아가 상품권을 줘야 하고 다음날에야 통장에 입금되는 불편 때문에 일부 상인들이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고객들의 불편과 불만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시장 고객 : "일반적으로는 (상품권) 잘 안 받으려고 하죠. 이쪽 시장에서는 안 받아요."
상품권 발행과 유통, 관리 예산은 한 해 2백50억 원.
상품권 구입 때 할인해 주는 것을 보전해 주는 금액도 5년 동안 2백억 원에 이릅니다.
대형 마트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는 전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된 온누리 상품권.
한 해 수백억 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사용을 적극 권장해야 할 상인들 조차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 대거 풀리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조차 외면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물건을 고르고 상품권을 내밀자, 상인은 손사래를 치며 현금을 요구합니다.
가맹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녹취> 전통시장 상인 :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되는 줄 모르고 그냥 (가맹) 안 했어요."
전국의 전통시장 점포 18만여 곳 가운데 온누리 상품권 가맹 계약을 아예 맺지 않은 곳이 15퍼센트나 됩니다.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도 현금 결제를 유도합니다.
<녹취> 시장 상인 : "(가맹을 안 하셨어요?) 했는데, (상품권) 안 받으려고. (받긴 받으시죠?) 될 수 있으면 안 받으려고."
은행을 직접 찾아가 상품권을 줘야 하고 다음날에야 통장에 입금되는 불편 때문에 일부 상인들이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고객들의 불편과 불만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시장 고객 : "일반적으로는 (상품권) 잘 안 받으려고 하죠. 이쪽 시장에서는 안 받아요."
상품권 발행과 유통, 관리 예산은 한 해 2백50억 원.
상품권 구입 때 할인해 주는 것을 보전해 주는 금액도 5년 동안 2백억 원에 이릅니다.
대형 마트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는 전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된 온누리 상품권.
한 해 수백억 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사용을 적극 권장해야 할 상인들 조차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많이 본 뉴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
![[세상의 창] 에너지 넘치는 해양 스포츠 천국 외](https://news.kbs.co.kr/data/news/2014/08/30/2921346_310.jpg)










![[단독] 한동훈 “민주당, ‘현타’ 올 것…겁박 시위가 오히려 역효과 내”](/data/news/2024/11/15/20241115_zy0ZHv.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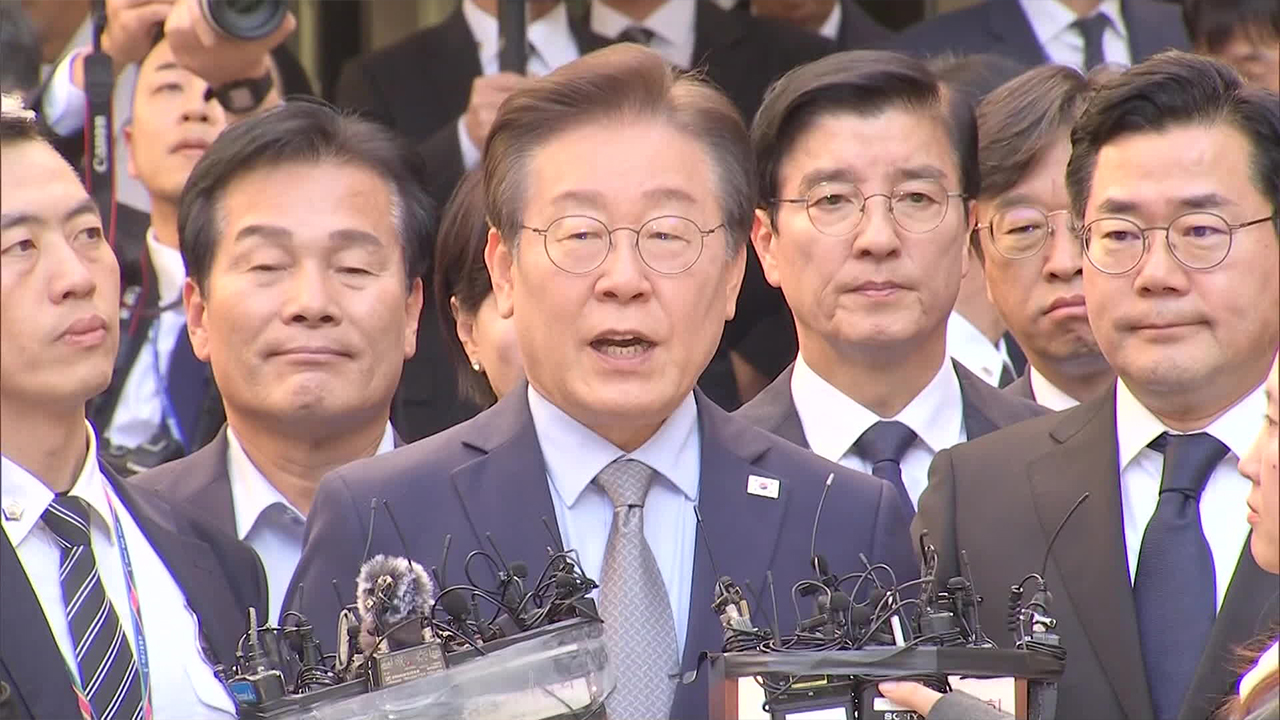


![[클릭!다시보기] 외로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색, 블루’](/data/news/2014/09/09/2926992_1ID.jpg)
![[살림충전] 세균 ‘득실득실’ 수세미…이렇게 쓰세요!](/data/news/2014/09/03/2923611_120.jpg)

![[건강충전] 덥고 습한 날씨, ‘피부 곰팡이’ 주의!](/data/news/2014/08/18/2913492_13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