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낮았는데 산사태…위험지도 실효성 논란
입력 2025.07.21 (21:09)
수정 2025.07.21 (21:19)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및 OpenAI 社의 AI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앵커]
산림청은 2022년부터 산사태 위험지도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남 산청은 위험 등급이 낮은 곳에서 대형 산사태와 인명 피해가 나 실효성이 있는 거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경남 산청군 단성면 수해 현장, 산 중턱엔 거대한 계곡이 만들어졌고, 떠내려온 돌들은 지붕 높이까지 쌓였습니다.
[주민 : "갑자기 흙하고 막 한 번에 우르르 내려오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피하고. 집사람은 저리 피하고."]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지도'를 찾아봤습니다.
전체 5단계 가운데 산사태 위험이 높은 곳은 붉은색으로 낮은 곳은 푸른색으로 표시되는데, 정작 이 산사태가 난 단성면은 위험이 낮은 4~5단계로 분류돼 있습니다.
밀려온 토사에 주민 1명이 실종되고 국도가 끊긴 산청군 신안면.
이 지역의 산사태 위험도 역시 대부분 3등급에서 5등급 사이였습니다.
산사태 위험이 낮다고 평가된 곳에서 잇따라 대형 산사태가 난 겁니다.
이유는 뭘까?
경사도 위주로 위험도를 측정할 뿐, 벌목 등으로 주변 환경이 바뀌어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수곤/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거기(위험 등급 낮은 곳에) 개발을 하게 되면 산을 깎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이 1등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시간 산사태 위험지도' 앱에는 주소 입력이나 위치 확인 기능이 없어 편의성이 떨어집니다.
[남기훈/창신대 소방방재공학과 교수 : "너무 복잡한 이런 시스템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 클릭하면 자기 위치 기반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1년 주기로 매년 2월 갱신하는 '산사태 위험지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산림청은 2022년부터 산사태 위험지도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남 산청은 위험 등급이 낮은 곳에서 대형 산사태와 인명 피해가 나 실효성이 있는 거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경남 산청군 단성면 수해 현장, 산 중턱엔 거대한 계곡이 만들어졌고, 떠내려온 돌들은 지붕 높이까지 쌓였습니다.
[주민 : "갑자기 흙하고 막 한 번에 우르르 내려오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피하고. 집사람은 저리 피하고."]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지도'를 찾아봤습니다.
전체 5단계 가운데 산사태 위험이 높은 곳은 붉은색으로 낮은 곳은 푸른색으로 표시되는데, 정작 이 산사태가 난 단성면은 위험이 낮은 4~5단계로 분류돼 있습니다.
밀려온 토사에 주민 1명이 실종되고 국도가 끊긴 산청군 신안면.
이 지역의 산사태 위험도 역시 대부분 3등급에서 5등급 사이였습니다.
산사태 위험이 낮다고 평가된 곳에서 잇따라 대형 산사태가 난 겁니다.
이유는 뭘까?
경사도 위주로 위험도를 측정할 뿐, 벌목 등으로 주변 환경이 바뀌어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수곤/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거기(위험 등급 낮은 곳에) 개발을 하게 되면 산을 깎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이 1등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시간 산사태 위험지도' 앱에는 주소 입력이나 위치 확인 기능이 없어 편의성이 떨어집니다.
[남기훈/창신대 소방방재공학과 교수 : "너무 복잡한 이런 시스템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 클릭하면 자기 위치 기반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1년 주기로 매년 2월 갱신하는 '산사태 위험지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많이 본 뉴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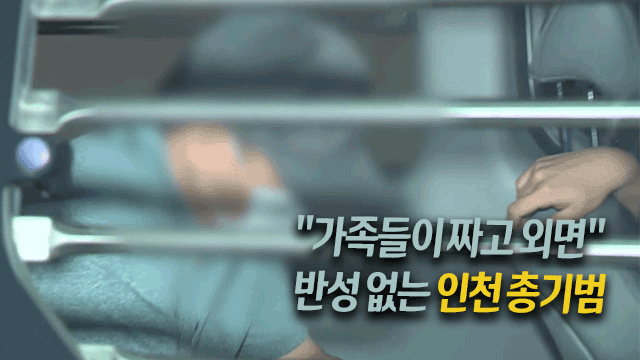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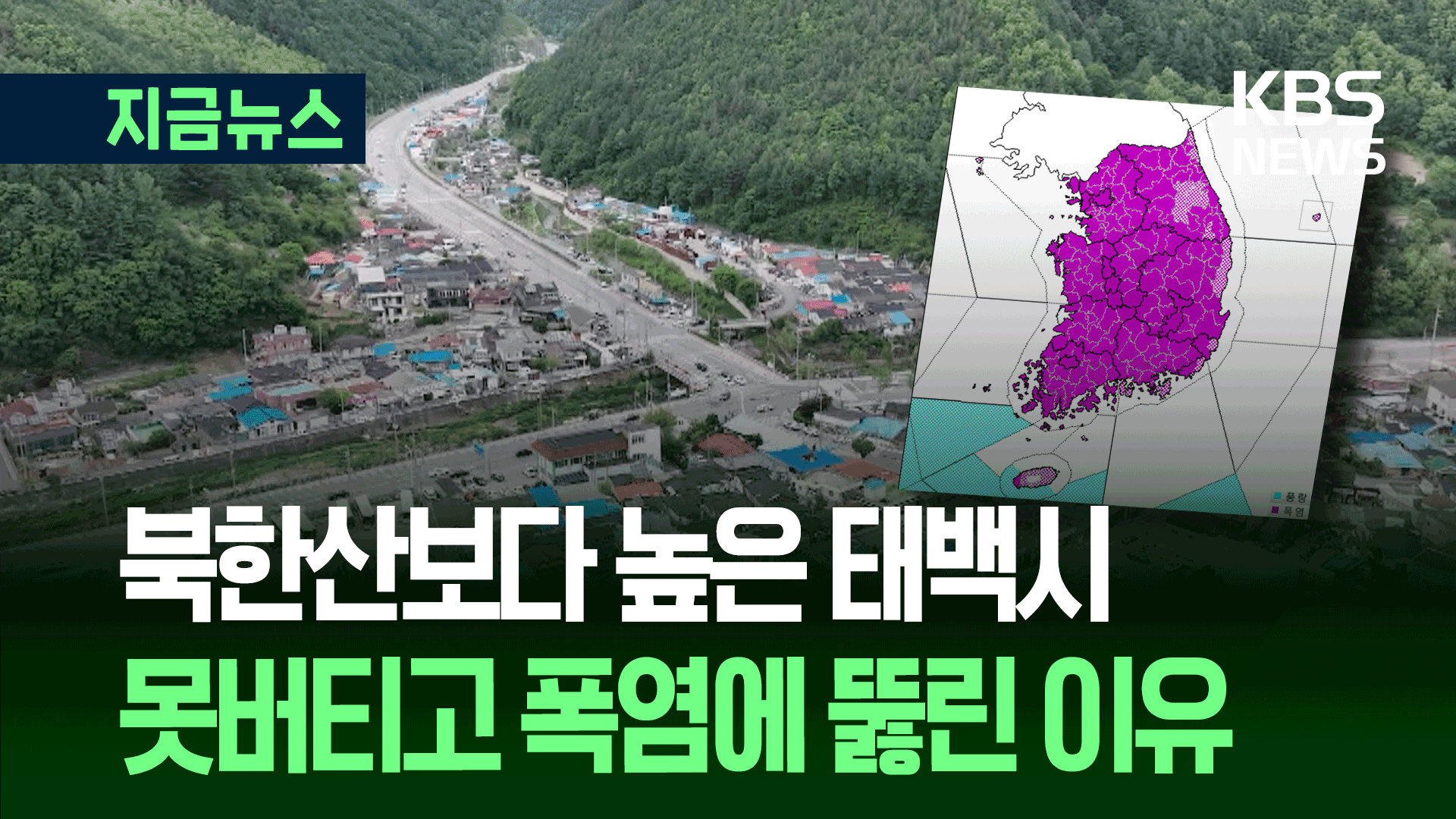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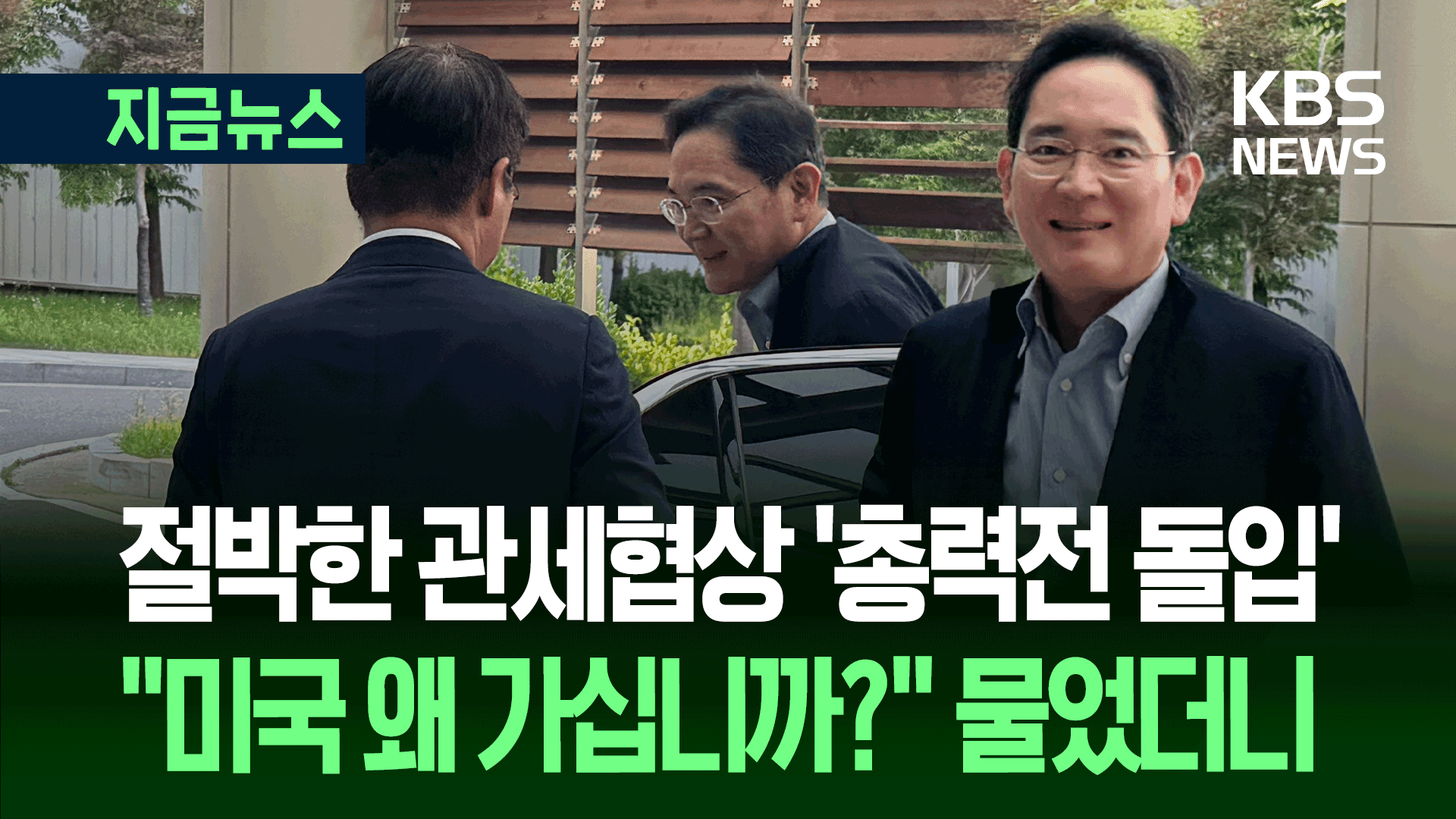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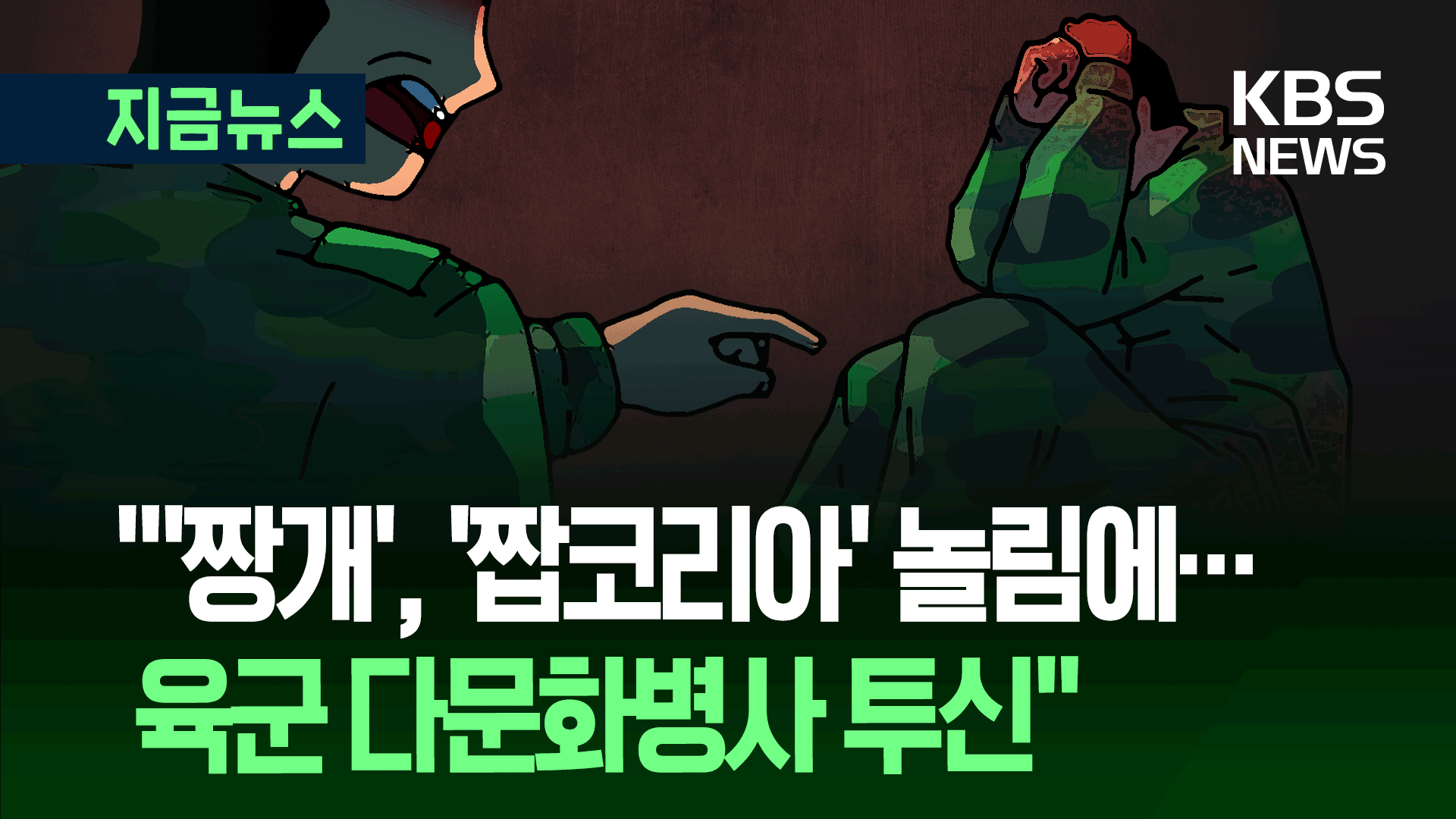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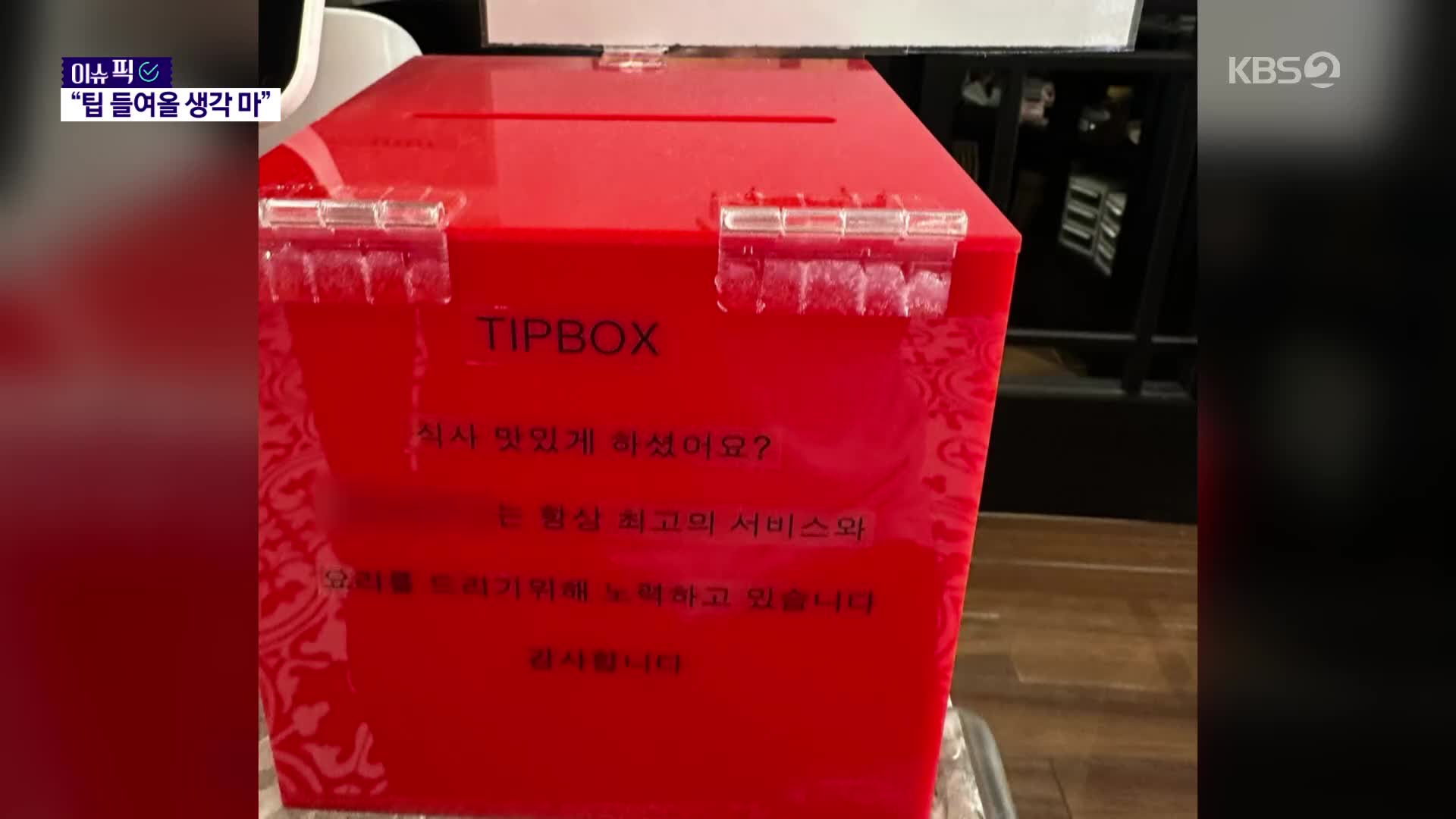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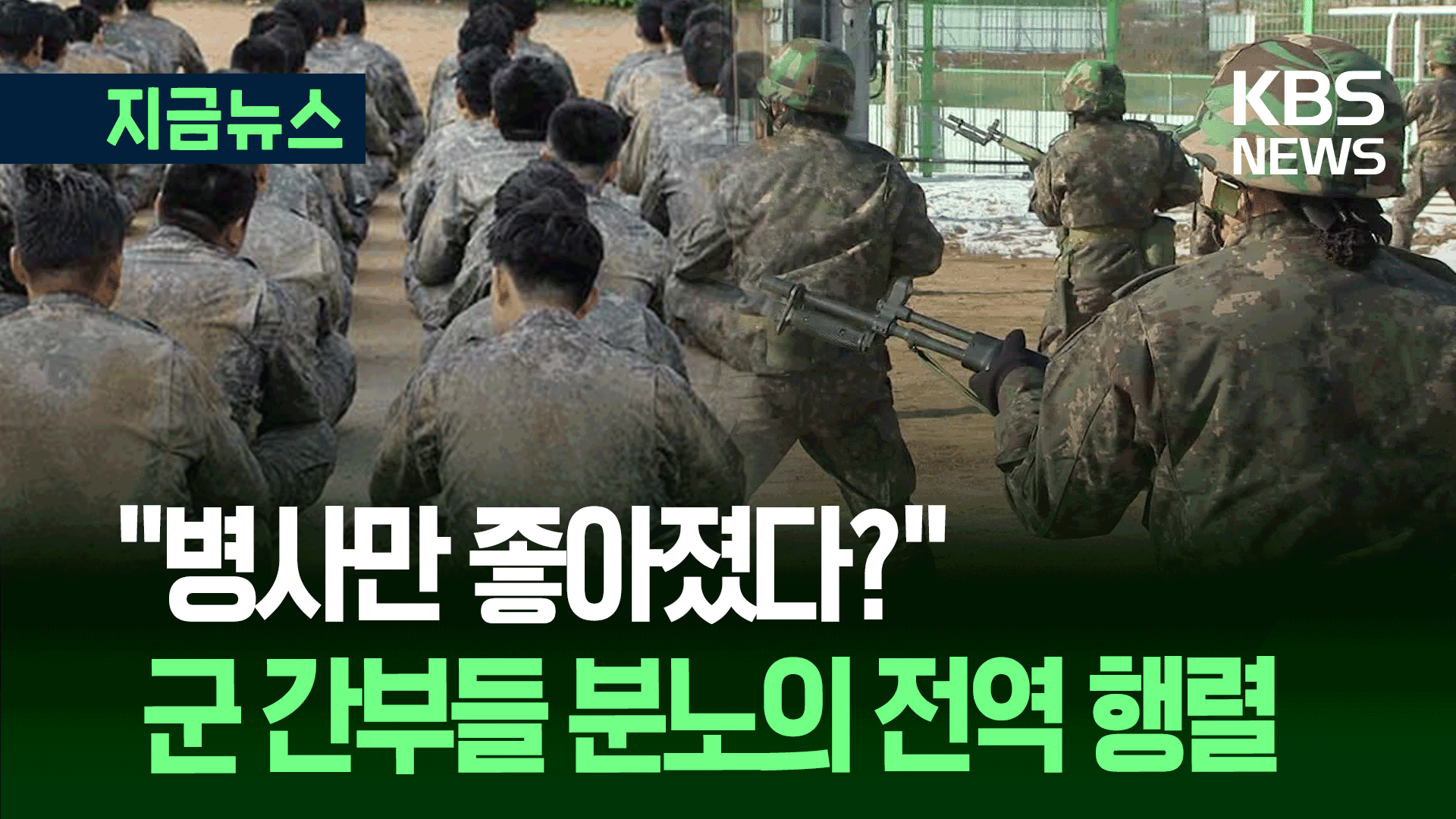
![[단독] 특검, ‘김건희 목걸이’ 모조품 판단…‘바꿔치기’ 의심](/data/news/2025/07/29/20250729_tuvz9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