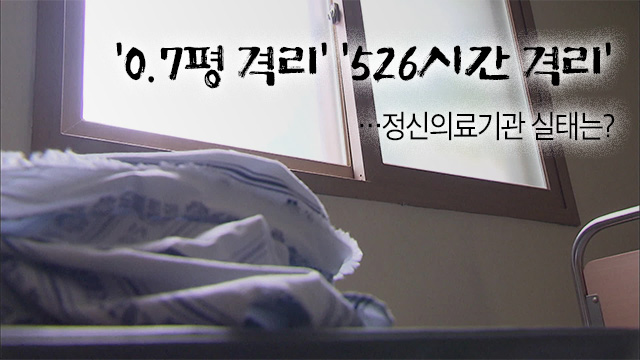
2.3 ㎡에 불과한 공간에 환자를 격리하거나 한 번에 526시간을 격리시키는 등, 국내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와 강박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다섯 달 동안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방문 조사 결과를 오늘(22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51시간 동안 환자를 강박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강박 해제 직후 3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 격리실 벽과 침대에 끼어 환자가 질식사한 사건 등 사망 사건이 잇달아 알려지자, 인권위가 착수했던 조사입니다.
■ '21일 22시간 강박' 사례도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지침은 '격리'를 시행한 후 다음 단계로 '강박'을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격리 후 강박' 시도 병원은 4개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를 격리할 때 1회에 최대로 허용되는 시간은 12시간이었지만 인권위가 조사한 격리 167건 중 최대 연속 격리는 526시간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21일하고도 2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강박의 경우 1회 최대 허용 시간이 4시간이지만 24시간 연속 강박 사례가 있었습니다.
20개 병원 모두 격리 시 최소 1시간, 강박 시 최소 30분마다 환자를 관찰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지침을 지킨다고 답했습니다. 억제대를 사용해 강박할 경우 1시간마다 혈압과 맥박 등 활력 증후를 체크한다고도 답했습니다. 하지만 2개 병원에서는 이 같은 모습이 CCTV상에서 확인되지 않아 답변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 0.7평에서 격리…끼어서 사망
20개 기관 중 격리(강박)실 면적이 가장 좁은 곳은 2.3 ㎡로 조사됐습니다. 양손을 펼치면 벽에 손이 닿는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면적으로, 신문지 다섯 장 반에 해당합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4월 환자가 격리 중 침대와 벽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격리실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해당 병원은 간호사실로 가려면 3개의 잠금 문을 통과해야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를 잘 관찰하려면 격리실은 가능하면 간호사실과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20개 병원 중 12개 병원은 간호사실 외부에 격리실을 설치했고, 일부는 간호사실과의 직선거리가 15~20m에 달했습니다.
좌변기와 침대 사이에 칸막이조차 두지 않고 화장실을 설치한 곳도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대부분의 격리실에서 악취가 심하게 났다"며 "환경미화원이 청소하지 않고 보호사가 임의로 청소하거나 환기를 자주 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곳은 벽면충격 완화 장치를 설치했지만 8곳은 일반 콘크리트 벽으로 이뤄져 있었습니다.
■ 격리·강박 수행 '보호사'가 배식·청소
보건복지부 지침은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존중하고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훈련된 직원들이 격리와 강박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정해둡니다. 이번에 조사를 받은 병원들은 '보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격리·강박 시행뿐 아니라 배식과 청소, 택배 전달 등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호사에게 자격 기준조차 요구하지 않는 병원이 17곳이었습니다. 자격 기준이 있어도 '고졸 이상 남자, 40대 이상'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인권위는 아동·청소년 시설에 취업할 때 관련 법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심사받는 것과 달리 정신의료기관에서 보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이 같은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군데에서만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로 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20곳 중 3곳은 보호사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 중 2곳은 환자를 폭행하거나 장기간 격리해 인권위에서 시정 권고한 병원이었습니다.
■ 인권위 "격리·강박 지침, 법으로 만들어야"
인권위는 이 같은 격리·강박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격리·강박 지침'을 법령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침은 규범력이 떨어지고 강제력이 낮은데, 그나마도 격리실 면적 기준이 없어 '0.7평 격리실'이 등장할 정도로 구체적이지도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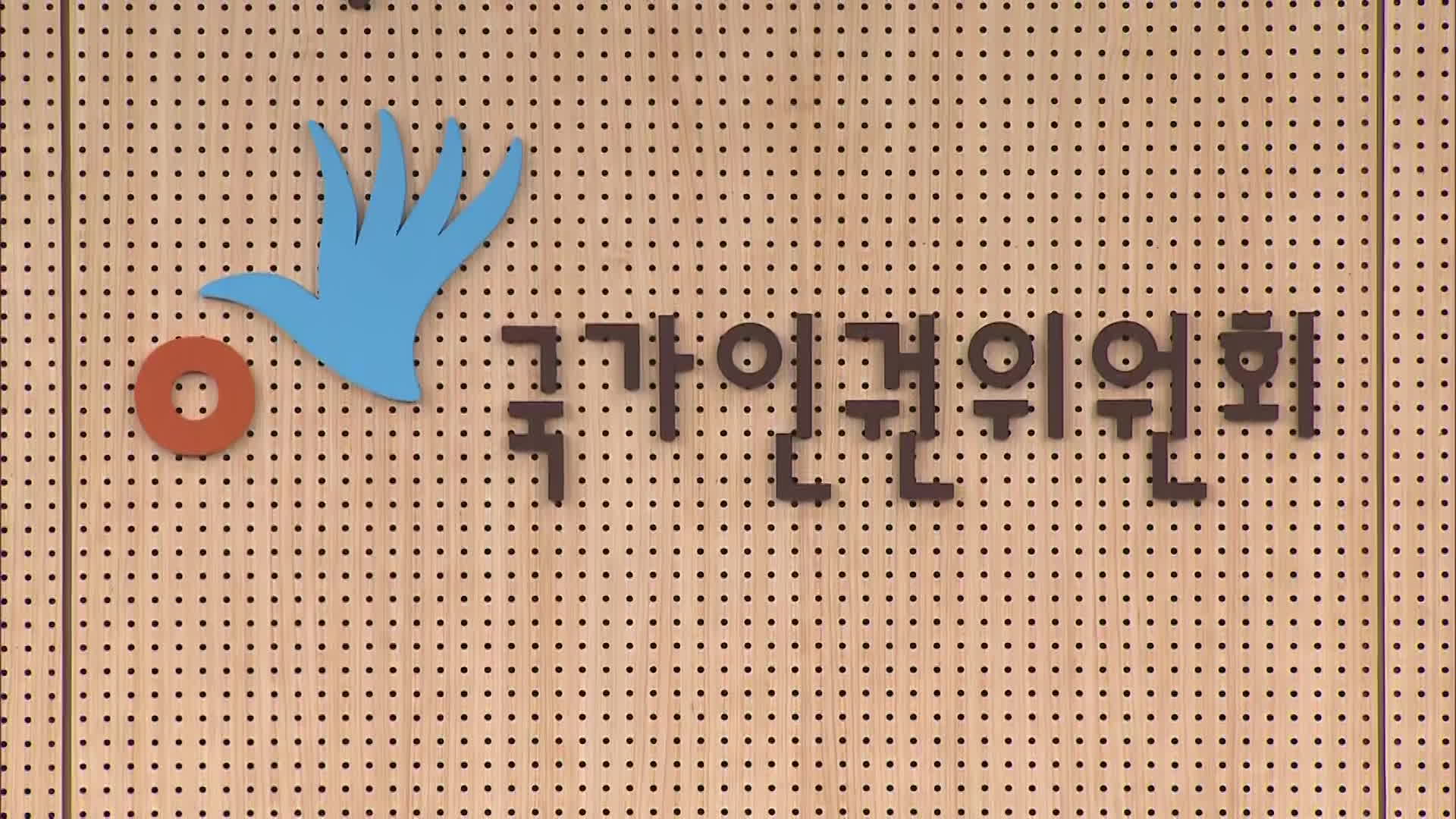
또 보호사를 고용해 격리·강박을 수행하고 보조하도록 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행위가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보호사 자격과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사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의 개발 보급도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실은 외부인의 접근이 제한돼 있어 입원환자가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기 매우 어렵고, CCTV 보관 기간도 짧아 확보하기 쉽지 않은 만큼, 위법 부당한 격리·강박을 방지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0.7평’ ‘526시간’ 격리…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실태는?
-
- 입력 2025-04-22 10:0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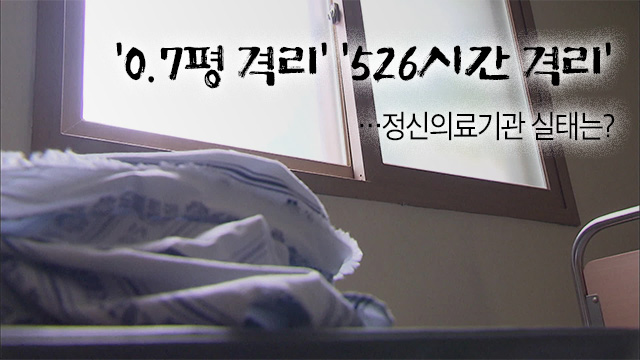
2.3 ㎡에 불과한 공간에 환자를 격리하거나 한 번에 526시간을 격리시키는 등, 국내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와 강박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다섯 달 동안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방문 조사 결과를 오늘(22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51시간 동안 환자를 강박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강박 해제 직후 3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 격리실 벽과 침대에 끼어 환자가 질식사한 사건 등 사망 사건이 잇달아 알려지자, 인권위가 착수했던 조사입니다.
■ '21일 22시간 강박' 사례도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지침은 '격리'를 시행한 후 다음 단계로 '강박'을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격리 후 강박' 시도 병원은 4개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를 격리할 때 1회에 최대로 허용되는 시간은 12시간이었지만 인권위가 조사한 격리 167건 중 최대 연속 격리는 526시간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21일하고도 2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강박의 경우 1회 최대 허용 시간이 4시간이지만 24시간 연속 강박 사례가 있었습니다.
20개 병원 모두 격리 시 최소 1시간, 강박 시 최소 30분마다 환자를 관찰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지침을 지킨다고 답했습니다. 억제대를 사용해 강박할 경우 1시간마다 혈압과 맥박 등 활력 증후를 체크한다고도 답했습니다. 하지만 2개 병원에서는 이 같은 모습이 CCTV상에서 확인되지 않아 답변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 0.7평에서 격리…끼어서 사망
20개 기관 중 격리(강박)실 면적이 가장 좁은 곳은 2.3 ㎡로 조사됐습니다. 양손을 펼치면 벽에 손이 닿는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면적으로, 신문지 다섯 장 반에 해당합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4월 환자가 격리 중 침대와 벽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격리실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해당 병원은 간호사실로 가려면 3개의 잠금 문을 통과해야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를 잘 관찰하려면 격리실은 가능하면 간호사실과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20개 병원 중 12개 병원은 간호사실 외부에 격리실을 설치했고, 일부는 간호사실과의 직선거리가 15~20m에 달했습니다.
좌변기와 침대 사이에 칸막이조차 두지 않고 화장실을 설치한 곳도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대부분의 격리실에서 악취가 심하게 났다"며 "환경미화원이 청소하지 않고 보호사가 임의로 청소하거나 환기를 자주 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곳은 벽면충격 완화 장치를 설치했지만 8곳은 일반 콘크리트 벽으로 이뤄져 있었습니다.
■ 격리·강박 수행 '보호사'가 배식·청소
보건복지부 지침은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존중하고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훈련된 직원들이 격리와 강박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정해둡니다. 이번에 조사를 받은 병원들은 '보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격리·강박 시행뿐 아니라 배식과 청소, 택배 전달 등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호사에게 자격 기준조차 요구하지 않는 병원이 17곳이었습니다. 자격 기준이 있어도 '고졸 이상 남자, 40대 이상'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인권위는 아동·청소년 시설에 취업할 때 관련 법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심사받는 것과 달리 정신의료기관에서 보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이 같은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군데에서만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로 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20곳 중 3곳은 보호사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 중 2곳은 환자를 폭행하거나 장기간 격리해 인권위에서 시정 권고한 병원이었습니다.
■ 인권위 "격리·강박 지침, 법으로 만들어야"
인권위는 이 같은 격리·강박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격리·강박 지침'을 법령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침은 규범력이 떨어지고 강제력이 낮은데, 그나마도 격리실 면적 기준이 없어 '0.7평 격리실'이 등장할 정도로 구체적이지도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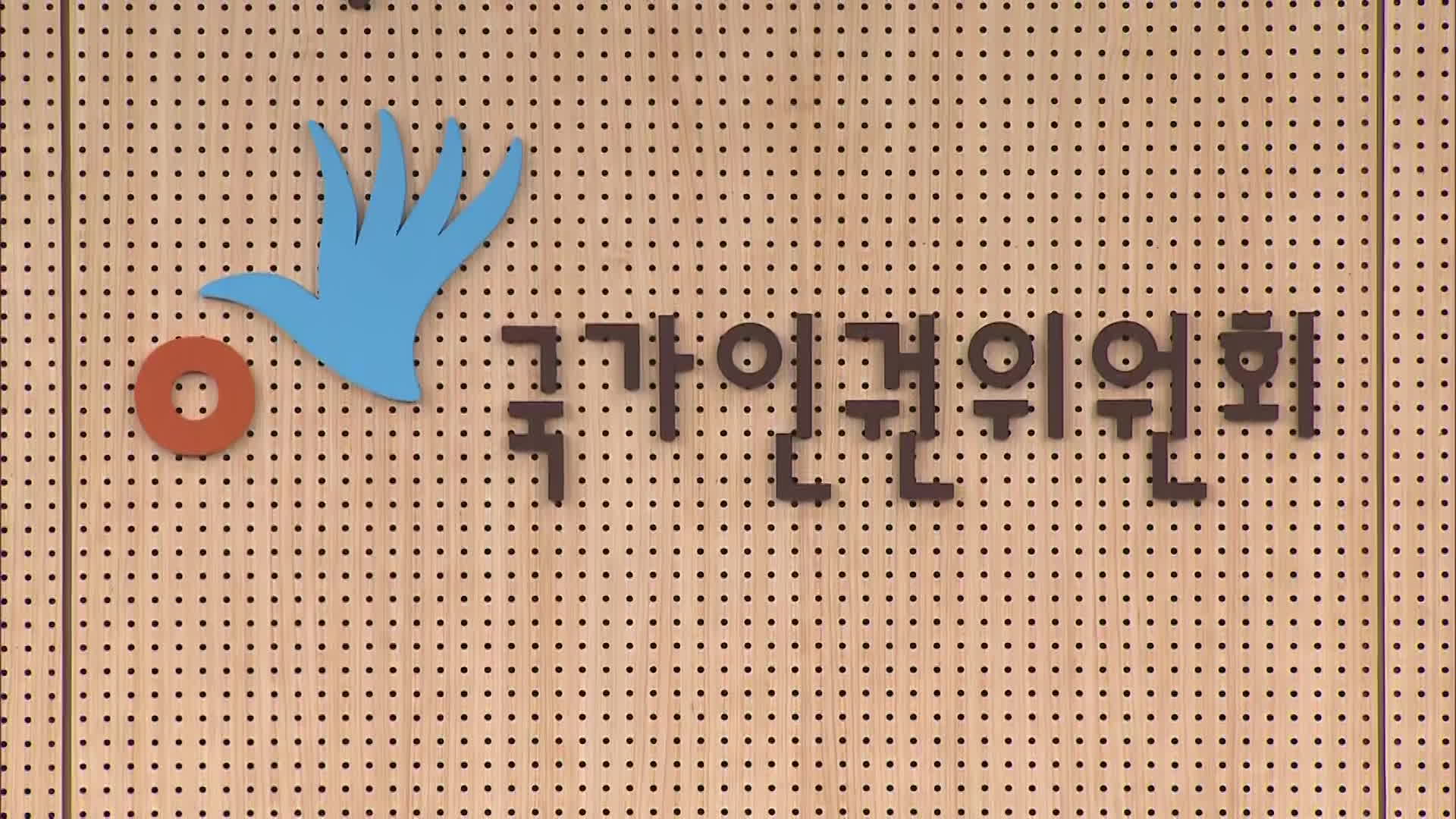
또 보호사를 고용해 격리·강박을 수행하고 보조하도록 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행위가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보호사 자격과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사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의 개발 보급도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실은 외부인의 접근이 제한돼 있어 입원환자가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기 매우 어렵고, CCTV 보관 기간도 짧아 확보하기 쉽지 않은 만큼, 위법 부당한 격리·강박을 방지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
-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문예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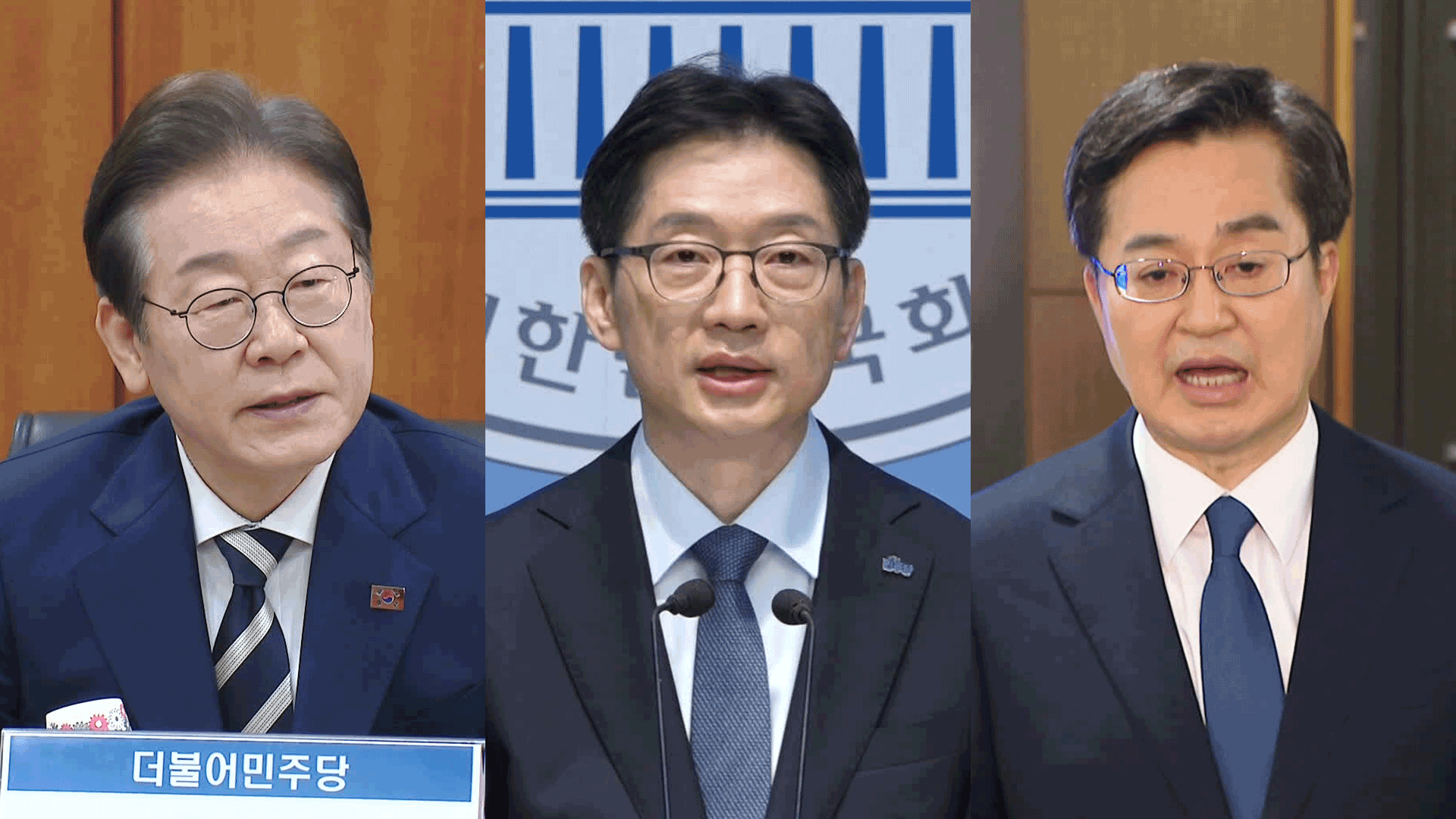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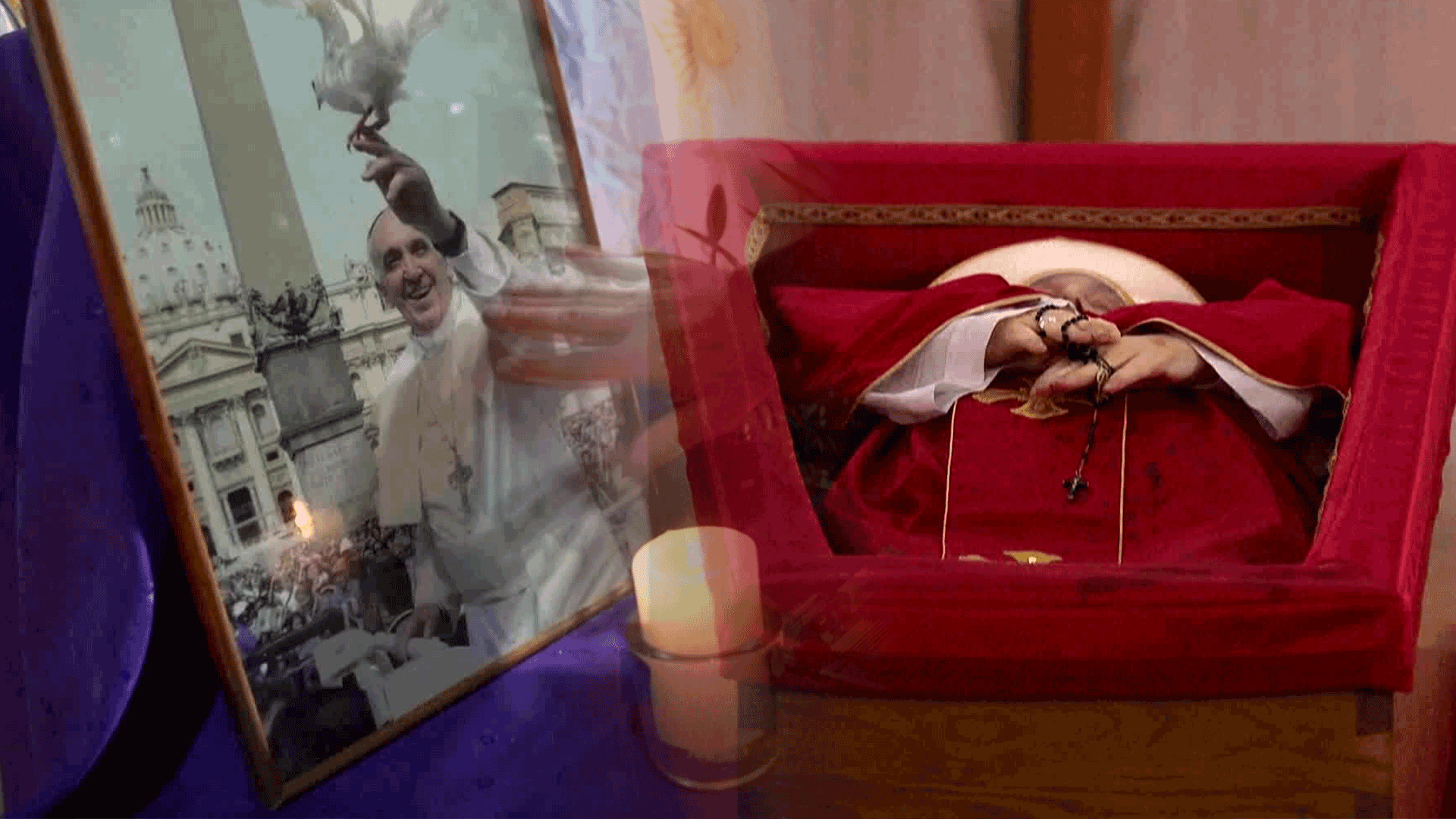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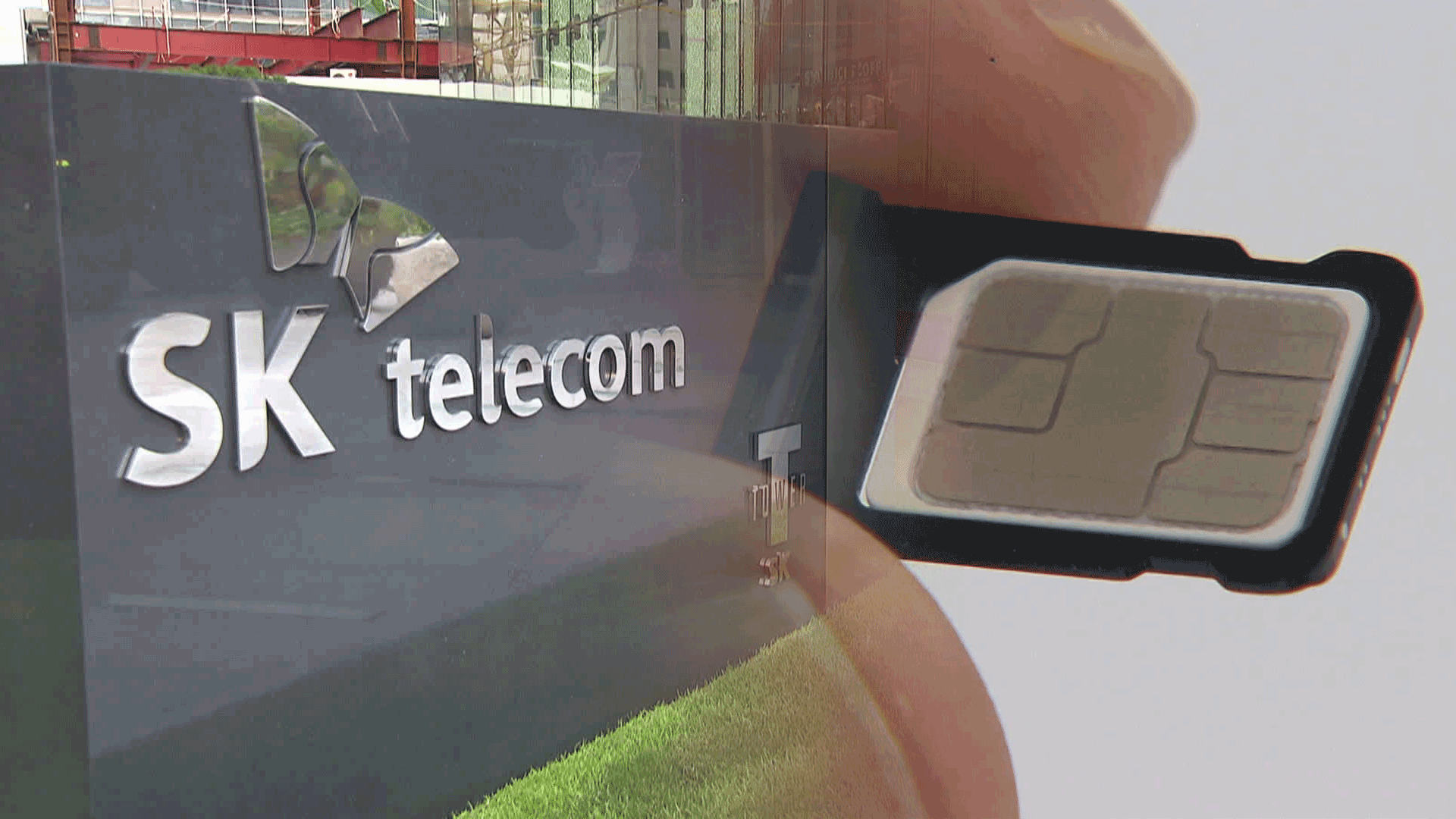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