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감기엔 땀 빼는 게 특효? 위험할 수 있다
입력 2014.11.17 (14:26)
수정 2014.11.17 (16: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건조한 환절기.
출퇴근 길, 사무실, 공공장소에서 감기 환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품이나 생활습관에 대한 정보는 대중적으로 충분히 알려졌지만 여전히 잘못된 민간요법을 고집하는 경우도 많다.
몸살감기에 걸리면 몸을 뜨겁게 해 땀을 쭉 빼는 방법도 그 중 하나다.
온몸이 쑤시고 열이 나면서 오한 증세까지 겹칠 경우 실내 온도를 높이고 두꺼운 이불을 겹겹이 덮어 땀을 내면 한결 나아진다는 속설 말이다.
실제로 고열에 시달리다가도 땀을 흠뻑 흘리면서 자고 나면 다음날 한결 나아진 기분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문의들에 따르면 이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건 좋지만, 억지로 땀을 내는 건 오히려 피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jpg)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는 것은 면역반응에 의한 현상이다.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감염 요인이 침입할 경우 면역 세포를 늘리기 위해 스스로 체온을 높인다.
열이 나면서 오한이 느껴지는 것도 몸을 웅크려 온도를 더 높이기 위한 방어기제다. 바이러스는 고온에서 약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속설대로 두꺼운 이불을 덮어 체온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 바이러스만큼 우리 몸의 뇌세포나 신경세포도 고열에 약하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약자나 아이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생후 9개월에서 5세 사이의 소아는 고열이 심할 경우 ‘열성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 열이 38도까지 올라간다면 병원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체온이 41도를 넘어가면 치명적이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내과 염호기 교수는 “열이 날 때 땀을 더 내려고 열을 가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신체 온도가 40도에 가까워지면 뇌손상이 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몸에서 열이 많이 날 경우 해열제를 먹고 미지근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아 열을 식히는 것이 좋다.
땀을 흠뻑 흘린 다음날 아침 몸이 개운한 느낌이 드는 것은 기분 탓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땀을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면 한결 나아진 느낌이 들 수 있다.
.jpg)
과도한 땀 빼기는 탈수증상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수 교수는 “노약자나 몸이 많이 약해진 사람의 경우 과도하게 땀을 빼면 오히려 합병증이 생기거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몸살감기로 열이 날 때는 땀으로 평소보다 30-40%정도 체내수분이 더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물을 하루에 몇 리터 이상씩 마시라고 권장하기도 하지만 사람마다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이 달라 그럴 필요는 없다. 물 권장량에 너무 집착하기 보다는 갈증이 나기 전에 물을 마신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된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해서 수분이 필요하면 ‘갈증’을 통해 물을 마시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마시면 별 문제 없다는 얘기다. 실내가 특별히 건조하다면 의식적으로 좀 더 자주 마셔주면 된다.
실내 온도와 습도도 알맞게 유지해야 한다. 실내 적정 온도는 대개 18~22℃, 습도는 50~60%가 적당하다.
코와 입, 기관지의 점막이 촉촉할 때는 호흡 시 외부 오염물질을 충분히 걸러줘 문제가 없지만, 건조해지면 점막 표면이 마른 땅처럼 갈라지고 그 사이로 병원균과 오염물질이 달라붙어 감기나 각종 질환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출퇴근 길, 사무실, 공공장소에서 감기 환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품이나 생활습관에 대한 정보는 대중적으로 충분히 알려졌지만 여전히 잘못된 민간요법을 고집하는 경우도 많다.
몸살감기에 걸리면 몸을 뜨겁게 해 땀을 쭉 빼는 방법도 그 중 하나다.
온몸이 쑤시고 열이 나면서 오한 증세까지 겹칠 경우 실내 온도를 높이고 두꺼운 이불을 겹겹이 덮어 땀을 내면 한결 나아진다는 속설 말이다.
실제로 고열에 시달리다가도 땀을 흠뻑 흘리면서 자고 나면 다음날 한결 나아진 기분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문의들에 따르면 이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건 좋지만, 억지로 땀을 내는 건 오히려 피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jpg)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는 것은 면역반응에 의한 현상이다.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감염 요인이 침입할 경우 면역 세포를 늘리기 위해 스스로 체온을 높인다.
열이 나면서 오한이 느껴지는 것도 몸을 웅크려 온도를 더 높이기 위한 방어기제다. 바이러스는 고온에서 약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속설대로 두꺼운 이불을 덮어 체온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 바이러스만큼 우리 몸의 뇌세포나 신경세포도 고열에 약하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약자나 아이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생후 9개월에서 5세 사이의 소아는 고열이 심할 경우 ‘열성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 열이 38도까지 올라간다면 병원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체온이 41도를 넘어가면 치명적이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내과 염호기 교수는 “열이 날 때 땀을 더 내려고 열을 가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신체 온도가 40도에 가까워지면 뇌손상이 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몸에서 열이 많이 날 경우 해열제를 먹고 미지근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아 열을 식히는 것이 좋다.
땀을 흠뻑 흘린 다음날 아침 몸이 개운한 느낌이 드는 것은 기분 탓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땀을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면 한결 나아진 느낌이 들 수 있다.
.jpg)
과도한 땀 빼기는 탈수증상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수 교수는 “노약자나 몸이 많이 약해진 사람의 경우 과도하게 땀을 빼면 오히려 합병증이 생기거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몸살감기로 열이 날 때는 땀으로 평소보다 30-40%정도 체내수분이 더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물을 하루에 몇 리터 이상씩 마시라고 권장하기도 하지만 사람마다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이 달라 그럴 필요는 없다. 물 권장량에 너무 집착하기 보다는 갈증이 나기 전에 물을 마신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된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해서 수분이 필요하면 ‘갈증’을 통해 물을 마시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마시면 별 문제 없다는 얘기다. 실내가 특별히 건조하다면 의식적으로 좀 더 자주 마셔주면 된다.
실내 온도와 습도도 알맞게 유지해야 한다. 실내 적정 온도는 대개 18~22℃, 습도는 50~60%가 적당하다.
코와 입, 기관지의 점막이 촉촉할 때는 호흡 시 외부 오염물질을 충분히 걸러줘 문제가 없지만, 건조해지면 점막 표면이 마른 땅처럼 갈라지고 그 사이로 병원균과 오염물질이 달라붙어 감기나 각종 질환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몸살감기엔 땀 빼는 게 특효? 위험할 수 있다
-
- 입력 2014-11-17 14:26:19
- 수정2014-11-17 16:04:53

찬바람이 불고 건조한 환절기.
출퇴근 길, 사무실, 공공장소에서 감기 환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품이나 생활습관에 대한 정보는 대중적으로 충분히 알려졌지만 여전히 잘못된 민간요법을 고집하는 경우도 많다.
몸살감기에 걸리면 몸을 뜨겁게 해 땀을 쭉 빼는 방법도 그 중 하나다.
온몸이 쑤시고 열이 나면서 오한 증세까지 겹칠 경우 실내 온도를 높이고 두꺼운 이불을 겹겹이 덮어 땀을 내면 한결 나아진다는 속설 말이다.
실제로 고열에 시달리다가도 땀을 흠뻑 흘리면서 자고 나면 다음날 한결 나아진 기분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문의들에 따르면 이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건 좋지만, 억지로 땀을 내는 건 오히려 피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jpg)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는 것은 면역반응에 의한 현상이다.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감염 요인이 침입할 경우 면역 세포를 늘리기 위해 스스로 체온을 높인다.
열이 나면서 오한이 느껴지는 것도 몸을 웅크려 온도를 더 높이기 위한 방어기제다. 바이러스는 고온에서 약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속설대로 두꺼운 이불을 덮어 체온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 바이러스만큼 우리 몸의 뇌세포나 신경세포도 고열에 약하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약자나 아이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생후 9개월에서 5세 사이의 소아는 고열이 심할 경우 ‘열성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 열이 38도까지 올라간다면 병원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체온이 41도를 넘어가면 치명적이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내과 염호기 교수는 “열이 날 때 땀을 더 내려고 열을 가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신체 온도가 40도에 가까워지면 뇌손상이 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몸에서 열이 많이 날 경우 해열제를 먹고 미지근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아 열을 식히는 것이 좋다.
땀을 흠뻑 흘린 다음날 아침 몸이 개운한 느낌이 드는 것은 기분 탓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땀을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면 한결 나아진 느낌이 들 수 있다.
.jpg)
과도한 땀 빼기는 탈수증상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수 교수는 “노약자나 몸이 많이 약해진 사람의 경우 과도하게 땀을 빼면 오히려 합병증이 생기거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몸살감기로 열이 날 때는 땀으로 평소보다 30-40%정도 체내수분이 더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물을 하루에 몇 리터 이상씩 마시라고 권장하기도 하지만 사람마다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이 달라 그럴 필요는 없다. 물 권장량에 너무 집착하기 보다는 갈증이 나기 전에 물을 마신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된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해서 수분이 필요하면 ‘갈증’을 통해 물을 마시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마시면 별 문제 없다는 얘기다. 실내가 특별히 건조하다면 의식적으로 좀 더 자주 마셔주면 된다.
실내 온도와 습도도 알맞게 유지해야 한다. 실내 적정 온도는 대개 18~22℃, 습도는 50~60%가 적당하다.
코와 입, 기관지의 점막이 촉촉할 때는 호흡 시 외부 오염물질을 충분히 걸러줘 문제가 없지만, 건조해지면 점막 표면이 마른 땅처럼 갈라지고 그 사이로 병원균과 오염물질이 달라붙어 감기나 각종 질환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출퇴근 길, 사무실, 공공장소에서 감기 환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품이나 생활습관에 대한 정보는 대중적으로 충분히 알려졌지만 여전히 잘못된 민간요법을 고집하는 경우도 많다.
몸살감기에 걸리면 몸을 뜨겁게 해 땀을 쭉 빼는 방법도 그 중 하나다.
온몸이 쑤시고 열이 나면서 오한 증세까지 겹칠 경우 실내 온도를 높이고 두꺼운 이불을 겹겹이 덮어 땀을 내면 한결 나아진다는 속설 말이다.
실제로 고열에 시달리다가도 땀을 흠뻑 흘리면서 자고 나면 다음날 한결 나아진 기분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문의들에 따르면 이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건 좋지만, 억지로 땀을 내는 건 오히려 피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jpg)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는 것은 면역반응에 의한 현상이다.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감염 요인이 침입할 경우 면역 세포를 늘리기 위해 스스로 체온을 높인다.
열이 나면서 오한이 느껴지는 것도 몸을 웅크려 온도를 더 높이기 위한 방어기제다. 바이러스는 고온에서 약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속설대로 두꺼운 이불을 덮어 체온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 바이러스만큼 우리 몸의 뇌세포나 신경세포도 고열에 약하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약자나 아이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생후 9개월에서 5세 사이의 소아는 고열이 심할 경우 ‘열성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 열이 38도까지 올라간다면 병원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체온이 41도를 넘어가면 치명적이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내과 염호기 교수는 “열이 날 때 땀을 더 내려고 열을 가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신체 온도가 40도에 가까워지면 뇌손상이 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몸에서 열이 많이 날 경우 해열제를 먹고 미지근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아 열을 식히는 것이 좋다.
땀을 흠뻑 흘린 다음날 아침 몸이 개운한 느낌이 드는 것은 기분 탓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땀을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면 한결 나아진 느낌이 들 수 있다.
.jpg)
과도한 땀 빼기는 탈수증상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수 교수는 “노약자나 몸이 많이 약해진 사람의 경우 과도하게 땀을 빼면 오히려 합병증이 생기거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몸살감기로 열이 날 때는 땀으로 평소보다 30-40%정도 체내수분이 더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물을 하루에 몇 리터 이상씩 마시라고 권장하기도 하지만 사람마다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이 달라 그럴 필요는 없다. 물 권장량에 너무 집착하기 보다는 갈증이 나기 전에 물을 마신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된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해서 수분이 필요하면 ‘갈증’을 통해 물을 마시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마시면 별 문제 없다는 얘기다. 실내가 특별히 건조하다면 의식적으로 좀 더 자주 마셔주면 된다.
실내 온도와 습도도 알맞게 유지해야 한다. 실내 적정 온도는 대개 18~22℃, 습도는 50~60%가 적당하다.
코와 입, 기관지의 점막이 촉촉할 때는 호흡 시 외부 오염물질을 충분히 걸러줘 문제가 없지만, 건조해지면 점막 표면이 마른 땅처럼 갈라지고 그 사이로 병원균과 오염물질이 달라붙어 감기나 각종 질환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
-

임주현 기자 leg@kbs.co.kr
임주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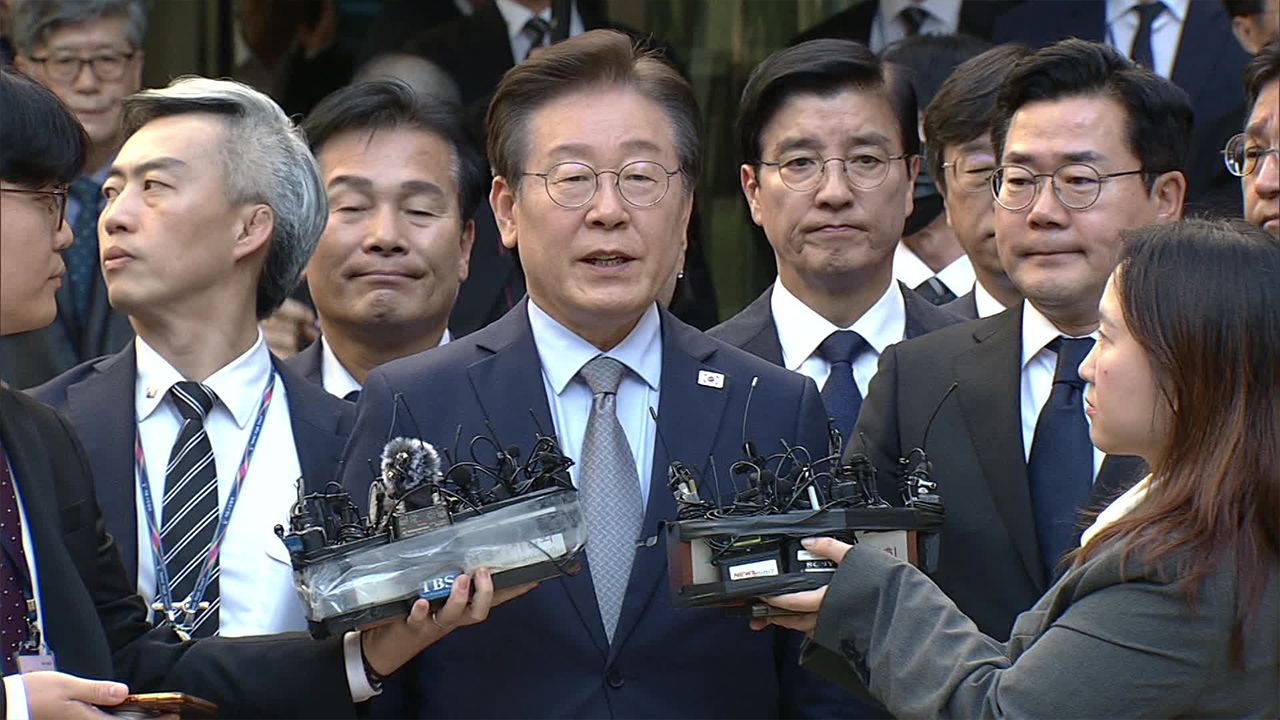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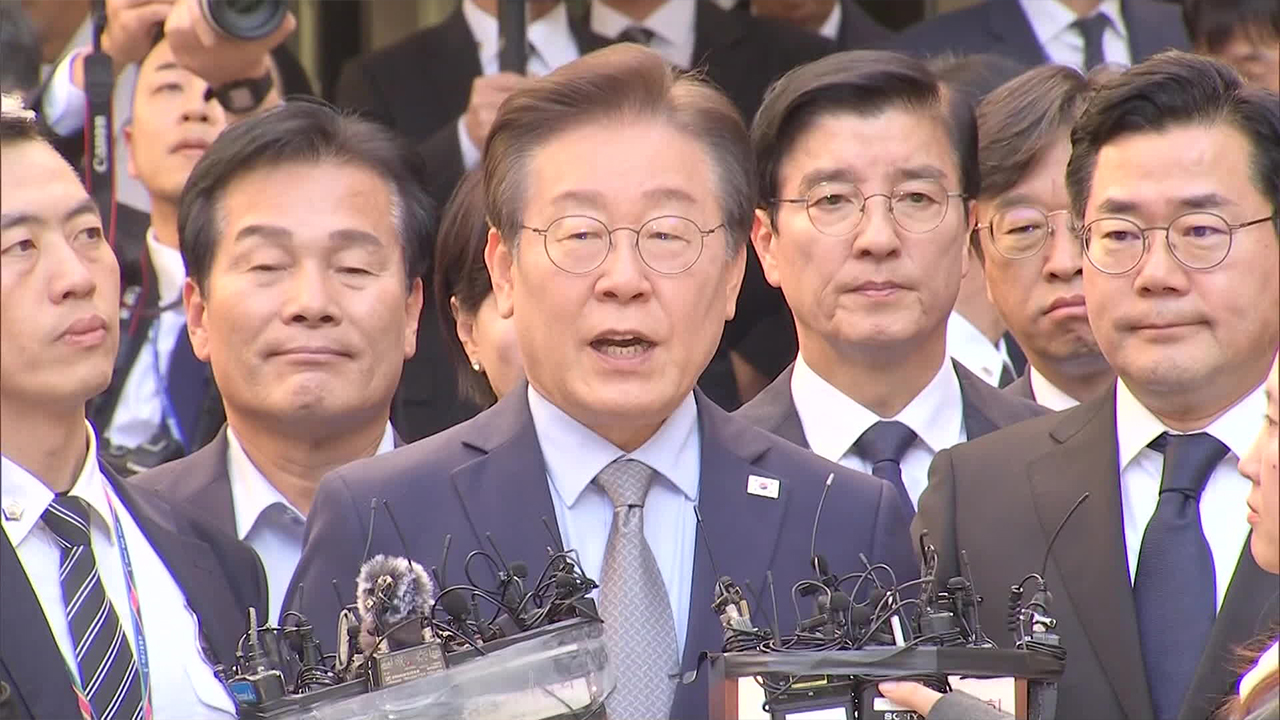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