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프로야구행 대신 미국 직행을 선택하며 야심 찬 포부를 드러냈던 심준석(2023년 1월 피츠버그 입단식 당시)
한국 프로야구행 대신 미국 직행을 선택하며 야심 찬 포부를 드러냈던 심준석(2023년 1월 피츠버그 입단식 당시)3년 전만 해도 한국 프로야구의 미래를 이끌 초특급 유망주로 평가받았던 마이너리거 심준석(21)이 소속팀 마이애미에서 방출 통보를 받았다.
덕수고 1학년 때부터 특급 유망주로 주목받은 심준석은 고3이던 2022년엔 최고 시속 160km를 던져 '괴물 유망주 투수', '제2의 박찬호'라는 수식어까지 붙을 정도로 장래가 촉망되던 선수였다.
그해 열린 KBO리그 신인드래프트는 일찌감치 '심준석 드래프트'라는 별칭이 붙었을 정도로 심준석은 KBO 리그행을 택했더라면 전체 1순위로 한화 유니폼을 입을 것이 유력했었다.
하지만, 심준석은 한국 프로야구 대신 꿈의 무대인 미국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기 위해 미국행을 택했다.
피츠버그와 계약금 75만 달러, 우리 돈 약 10억 원에 계약을 맺었고, 특급 유망주 심준석의 입단식은 당시 KBS 스포츠 뉴스9를 비롯한 여러 방송사 뉴스에도 보도될 정도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계속된 부상 불운이 심준석을 괴롭혔다. 미국에서 허리와 어깨 등을 다치며 부상에 신음했고 피츠버그 구단은 지난해 7월 트레이드를 통해 심준석을 마이애미로 보냈다.
심준석은 마이너리그 생활 3년 동안 17경기에 등판해 21.1이닝을 던지는 데 그쳤고, 고질적인 제구력 불안 문제를 노출하며 평균자책점 8.02로 부진해 결국 쓰디쓴 방출 통보까지 받게 됐다.
무적 신분이 된 심준석은 이제 다른 마이너리그 팀과 계약을 맺어 메이저리거라는 꿈을 향한 도전을 계속하거나, 한국행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다만, 한국 무대 복귀 시에는 KBO 규정에 따라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심준석이 미국이 아닌 한국 프로야구행을 택했더라면 현재 모습은 어땠을까?
심준석이 부상에 신음했더라도, 1라운드 지명권을 소모한 구단은 군대 문제를 해결하게 한 뒤 계속해서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심준석과 동급생인 한화 김서현과 문현빈 등은 KBO리그 1군에서 스타 선수로 활약 중이다.
21살 특급 유망주가 미국에서 맞이한 냉혹한 현실, 부상 문제가 가장 크긴 했지만, 미국 직행을 꿈꾸는 여러 야구 유망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선구자' 박찬호 이후 계속된 유망주들의 낭만의 도전…하지만 미국은 냉혹하다
1994년 박찬호가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거로 대성공을 거두면서 '제2의 코리안 특급'을 꿈꾸는 유망주들의 도전은 계속됐다.
박찬호 이후 김병현과 추신수, 최지만 등 극히 일부 선수들이 대성공을 거뒀지만, 대부분은 마이너리그에서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보내다 한국 무대로 돌아오거나 쓸쓸히 은퇴하는 경우가 많았다.
박찬호 이후 지금까지 60여 명의 선수가 아마추어 신분으로 미국 직행을 선택했지만, 마이너리그를 거쳐 메이저리그 무대를 한 번이라도 밟은 선수는 박찬호를 포함해 조진호, 김병현, 김선우, 봉중근, 서재응, 최희섭, 백차승, 추신수, 류제국, 최지만, 박효준, 배지환 등 13명에 불과하다.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의 계약금을 투자한 외국인 유망주가 아닌 이상,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은 이들이 마이너리그 단계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가차 없이 방출한다.
경쟁에서 살아남아 메이저리그에 데뷔하더라도 대체 선수급 이상의 생산성을 내지 못하는 경우, 방출 대상이 되거나 마이너리그 강등 칼바람을 받는다.
메이저리그 데뷔에 성공한 이들 13명의 한국인 선수들 중에서 수백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 등 대성공을 거둔 선수를 꼽자면, 박찬호와 김병현, 추신수, 최지만 4명 정도 밖에 없다.
나머지 한국인 메이저리거들은 나름 쏠쏠한 활약을 했지만, 오 랜기간 메이저리거로 활약하지 못하고 대부분 KBO리그 유턴을 선택했다.
■ KBO에서 데뷔해 메이저리거 된 선수는 15명…'한국 최고'된다면 특급 대우까지
한국 프로야구에서 데뷔한 뒤 메이저리거의 꿈을 이룬 선수는 이상훈, 류현진, 임창용, 강정호, 오승환, 이대호, 박병호, 김현수, 황재균, 양현종, 김하성, 이정후, 김혜성 등 15명이다.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프로 선수로 데뷔해 메이저리거가 되는 것보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데뷔해 메이저리거가 된 선수가 2명 더 많았다.
이들은 팬들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KBO리그 대표 스타 출신인데, 대부분 좋은 대우를 받고 미국 무대에서 뛰었다.
류현진의 경우, KBO리그에서 발휘한 재능만으로도 2013년 6년 총액 3,600만 달러(약 500억 원)의 특급 대우를 받았다. 소속팀 한화 역시 포스팅 이적료로 2,573만 달러(약 358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정후 역시 2024년 포스팅을 통해 샌프란시스코와 계약하며 6년 총액 1억 1,300만 달러, 우리 돈 1,57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대우를 받았다. 당시 25살의 나이로 억만장자가 된 것이다.
추신수가 10년 전 텍사스와 맺은 7년 1억 3,000만 달러 계약과 비슷한 규모인데, 마이너리그에서 긴 시간을 보낸 추신수는 메이저리그 서비스 타임까지 채운 뒤 FA 자격을 얻어 이정후보다 7살 늦은 32살의 나이에 억만장자가 됐다.
■ 선진 육성 시스템 구축해 유망주들의 KBO리그 불신 해소 필요
오는 9월에 열리는 신인 드래프트를 앞두고 이미 대형 유망주들이 미국 직행을 선택했다.
광주일고 김성준이 텍사스와 120만 달러(16억 원)에 계약을 맺었고, 장충고 에이스 문서준 또한 미국행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 큰 무대에서 경쟁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꽃피우고 싶은 유망주들의 순수한 열망과 직업 선택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이들은 미국 무대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 무대로 돌아올 시 2년간 쉬어야 하는 페널티를 감수하고 도전을 선택한다.
다만, 한국 야구계는 이러한 유망주들의 미국 직행 현상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육성 시스템 및 리그 수준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일부 유망주들은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야구계 문화,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의 육성 시스템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 프로야구의 놀라운 발전 속도와 WBC 국제대회에서의 좋은 성적을 봤을 때 이들의 지적은 분명 일리가 있다.
한국 프로야구는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과 2009 WBC 준우승의 쾌거 이후, 리그 규모와 흥행은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좋은 재능을 지닌 유망주들이 미국 무대에서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고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은 한국 야구의 크나큰 손실이다.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 KBO리그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고, 이를 통해 성장한 어린 스타들을 MLB 등 더 큰 무대에 진출시켜 포스팅 수익 실현은 물론, 국제대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초특급 유망주의 씁쓸한 방출 소식…MLB 낭만 도전의 차가운 현실
-
- 입력 2025-08-06 17:35:01

3년 전만 해도 한국 프로야구의 미래를 이끌 초특급 유망주로 평가받았던 마이너리거 심준석(21)이 소속팀 마이애미에서 방출 통보를 받았다.
덕수고 1학년 때부터 특급 유망주로 주목받은 심준석은 고3이던 2022년엔 최고 시속 160km를 던져 '괴물 유망주 투수', '제2의 박찬호'라는 수식어까지 붙을 정도로 장래가 촉망되던 선수였다.
그해 열린 KBO리그 신인드래프트는 일찌감치 '심준석 드래프트'라는 별칭이 붙었을 정도로 심준석은 KBO 리그행을 택했더라면 전체 1순위로 한화 유니폼을 입을 것이 유력했었다.
하지만, 심준석은 한국 프로야구 대신 꿈의 무대인 미국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기 위해 미국행을 택했다.
피츠버그와 계약금 75만 달러, 우리 돈 약 10억 원에 계약을 맺었고, 특급 유망주 심준석의 입단식은 당시 KBS 스포츠 뉴스9를 비롯한 여러 방송사 뉴스에도 보도될 정도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계속된 부상 불운이 심준석을 괴롭혔다. 미국에서 허리와 어깨 등을 다치며 부상에 신음했고 피츠버그 구단은 지난해 7월 트레이드를 통해 심준석을 마이애미로 보냈다.
심준석은 마이너리그 생활 3년 동안 17경기에 등판해 21.1이닝을 던지는 데 그쳤고, 고질적인 제구력 불안 문제를 노출하며 평균자책점 8.02로 부진해 결국 쓰디쓴 방출 통보까지 받게 됐다.
무적 신분이 된 심준석은 이제 다른 마이너리그 팀과 계약을 맺어 메이저리거라는 꿈을 향한 도전을 계속하거나, 한국행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다만, 한국 무대 복귀 시에는 KBO 규정에 따라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심준석이 미국이 아닌 한국 프로야구행을 택했더라면 현재 모습은 어땠을까?
심준석이 부상에 신음했더라도, 1라운드 지명권을 소모한 구단은 군대 문제를 해결하게 한 뒤 계속해서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심준석과 동급생인 한화 김서현과 문현빈 등은 KBO리그 1군에서 스타 선수로 활약 중이다.
21살 특급 유망주가 미국에서 맞이한 냉혹한 현실, 부상 문제가 가장 크긴 했지만, 미국 직행을 꿈꾸는 여러 야구 유망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선구자' 박찬호 이후 계속된 유망주들의 낭만의 도전…하지만 미국은 냉혹하다
1994년 박찬호가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거로 대성공을 거두면서 '제2의 코리안 특급'을 꿈꾸는 유망주들의 도전은 계속됐다.
박찬호 이후 김병현과 추신수, 최지만 등 극히 일부 선수들이 대성공을 거뒀지만, 대부분은 마이너리그에서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보내다 한국 무대로 돌아오거나 쓸쓸히 은퇴하는 경우가 많았다.
박찬호 이후 지금까지 60여 명의 선수가 아마추어 신분으로 미국 직행을 선택했지만, 마이너리그를 거쳐 메이저리그 무대를 한 번이라도 밟은 선수는 박찬호를 포함해 조진호, 김병현, 김선우, 봉중근, 서재응, 최희섭, 백차승, 추신수, 류제국, 최지만, 박효준, 배지환 등 13명에 불과하다.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의 계약금을 투자한 외국인 유망주가 아닌 이상,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은 이들이 마이너리그 단계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가차 없이 방출한다.
경쟁에서 살아남아 메이저리그에 데뷔하더라도 대체 선수급 이상의 생산성을 내지 못하는 경우, 방출 대상이 되거나 마이너리그 강등 칼바람을 받는다.
메이저리그 데뷔에 성공한 이들 13명의 한국인 선수들 중에서 수백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 등 대성공을 거둔 선수를 꼽자면, 박찬호와 김병현, 추신수, 최지만 4명 정도 밖에 없다.
나머지 한국인 메이저리거들은 나름 쏠쏠한 활약을 했지만, 오 랜기간 메이저리거로 활약하지 못하고 대부분 KBO리그 유턴을 선택했다.
■ KBO에서 데뷔해 메이저리거 된 선수는 15명…'한국 최고'된다면 특급 대우까지
한국 프로야구에서 데뷔한 뒤 메이저리거의 꿈을 이룬 선수는 이상훈, 류현진, 임창용, 강정호, 오승환, 이대호, 박병호, 김현수, 황재균, 양현종, 김하성, 이정후, 김혜성 등 15명이다.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프로 선수로 데뷔해 메이저리거가 되는 것보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데뷔해 메이저리거가 된 선수가 2명 더 많았다.
이들은 팬들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KBO리그 대표 스타 출신인데, 대부분 좋은 대우를 받고 미국 무대에서 뛰었다.
류현진의 경우, KBO리그에서 발휘한 재능만으로도 2013년 6년 총액 3,600만 달러(약 500억 원)의 특급 대우를 받았다. 소속팀 한화 역시 포스팅 이적료로 2,573만 달러(약 358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정후 역시 2024년 포스팅을 통해 샌프란시스코와 계약하며 6년 총액 1억 1,300만 달러, 우리 돈 1,57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대우를 받았다. 당시 25살의 나이로 억만장자가 된 것이다.
추신수가 10년 전 텍사스와 맺은 7년 1억 3,000만 달러 계약과 비슷한 규모인데, 마이너리그에서 긴 시간을 보낸 추신수는 메이저리그 서비스 타임까지 채운 뒤 FA 자격을 얻어 이정후보다 7살 늦은 32살의 나이에 억만장자가 됐다.
■ 선진 육성 시스템 구축해 유망주들의 KBO리그 불신 해소 필요
오는 9월에 열리는 신인 드래프트를 앞두고 이미 대형 유망주들이 미국 직행을 선택했다.
광주일고 김성준이 텍사스와 120만 달러(16억 원)에 계약을 맺었고, 장충고 에이스 문서준 또한 미국행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 큰 무대에서 경쟁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꽃피우고 싶은 유망주들의 순수한 열망과 직업 선택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이들은 미국 무대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 무대로 돌아올 시 2년간 쉬어야 하는 페널티를 감수하고 도전을 선택한다.
다만, 한국 야구계는 이러한 유망주들의 미국 직행 현상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육성 시스템 및 리그 수준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일부 유망주들은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야구계 문화,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의 육성 시스템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 프로야구의 놀라운 발전 속도와 WBC 국제대회에서의 좋은 성적을 봤을 때 이들의 지적은 분명 일리가 있다.
한국 프로야구는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과 2009 WBC 준우승의 쾌거 이후, 리그 규모와 흥행은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좋은 재능을 지닌 유망주들이 미국 무대에서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고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은 한국 야구의 크나큰 손실이다.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 KBO리그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고, 이를 통해 성장한 어린 스타들을 MLB 등 더 큰 무대에 진출시켜 포스팅 수익 실현은 물론, 국제대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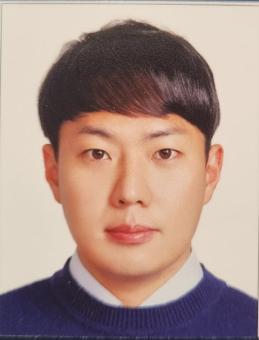
하무림 기자 hagosu@kbs.co.kr
하무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단독] “다이아 큰 거라서 놀라셨다”…‘통일교 목걸이’ 메시지 나왔다](/data/layer/904/2025/08/20250807_joBfVV.png)
![[단독]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보좌관도 국정기획위 소속이었다…“어제 해촉”](/data/news/2025/08/07/20250807_SYg4zY.jpg)
![[단독] ‘양호’ 등급에도 붕괴…‘안전등급제’는 면피용?](/data/layer/904/2025/08/20250807_rP288r.jpg)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