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경제] 생활인구 제도, 활성화하려면?
입력 2025.04.16 (19:15)
수정 2025.04.16 (19: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소비를 위해 생활 속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같이경제' 시간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 속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인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인구까지 포함된 개념인데요.
지난해 8월 생활인구는 3천3백만 명을 넘어,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5.9배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서 9월 중 최고값으로 행안부와 통계청은 여름 휴가철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류인구 특성을 보면 평균 체류일수는 3.2일 평균 체류시간은 12시간이었고요.
단기숙박형은 여성과 30살 미만 비중이 높았고, 통근통학형은 남성과 40~50대 비중이 높았습니다.
대구·경북만 보면, 체류인구 배수 상위 10개 지역에 7월에는 영덕, 9월에는 군위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북은 평균 체류일수와 6개월 내 재방문율이 높은 반면, 유출인구 대비 유입인구 비율은 다른 시도에 비해 낮았는데요.
경북 도민들이 다른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가운데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체류인구 유입 규모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체류일수 데이터 등을 활용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토연구원 자료를 보면, 체류인구에 체류일수 가중치를 적용하자 충남 보령과 충북 단양은 규모가 줄었고, 영천과 전남 영암은 증가했는데요.
영천, 영암은 상대적으로 체류인구의 체류일수가 길다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 단기, 장기 체류자 맞춤형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류 인프라 부족도 지적됐는데요.
대규모인 관광숙박업은 전체의 14.1%만 인구감소지역에서 운영 중인데 반해, 소규모인 관광펜션업과 농어촌 민박업은 50~60%가량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인구감소지역 안에서도 격차는 컸는데요.
경기 가평이나 충남 태안, 경남 남해는 체류 인프라가 천 개가 넘는 반면, 고령과 영양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체류인구가 더 오래, 잘 머무를 수 있도록 공간과 사람에 대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공간'에 대해서는 방문, 체류, 정주 매력도를 높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방문과 체류, 이주가 가능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을 보면요.
용도변경에 제한이 있는 유휴 공공건물을 인구감소지역에서 문화, 교육, 숙박시설로 활용할 때는 특례를 도입하고요.
폐교의 무상 대부 요건을 문화시설, 교육용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의 거주자격을 완화하고, 빈집 재생 농어촌 민박 운영 주체로 마을기업과 소셜벤처 등을 특례사업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산간 벽지와 도서지역 외에는 조식만 제공할 수 있는 농어촌 민박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밀키트로 점심과 저녁 식사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단순 방문, 관광이 아닌 '체류'를 위해서는 직업적, 교육적 불이익이 없어야겠죠.
원격 근무와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과 복수 주소제 도입 등 유연한 거주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같이경제' 오아영입니다.
그래픽:김지현
인구 소멸 위기 속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인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인구까지 포함된 개념인데요.
지난해 8월 생활인구는 3천3백만 명을 넘어,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5.9배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서 9월 중 최고값으로 행안부와 통계청은 여름 휴가철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류인구 특성을 보면 평균 체류일수는 3.2일 평균 체류시간은 12시간이었고요.
단기숙박형은 여성과 30살 미만 비중이 높았고, 통근통학형은 남성과 40~50대 비중이 높았습니다.
대구·경북만 보면, 체류인구 배수 상위 10개 지역에 7월에는 영덕, 9월에는 군위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북은 평균 체류일수와 6개월 내 재방문율이 높은 반면, 유출인구 대비 유입인구 비율은 다른 시도에 비해 낮았는데요.
경북 도민들이 다른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가운데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체류인구 유입 규모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체류일수 데이터 등을 활용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토연구원 자료를 보면, 체류인구에 체류일수 가중치를 적용하자 충남 보령과 충북 단양은 규모가 줄었고, 영천과 전남 영암은 증가했는데요.
영천, 영암은 상대적으로 체류인구의 체류일수가 길다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 단기, 장기 체류자 맞춤형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류 인프라 부족도 지적됐는데요.
대규모인 관광숙박업은 전체의 14.1%만 인구감소지역에서 운영 중인데 반해, 소규모인 관광펜션업과 농어촌 민박업은 50~60%가량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인구감소지역 안에서도 격차는 컸는데요.
경기 가평이나 충남 태안, 경남 남해는 체류 인프라가 천 개가 넘는 반면, 고령과 영양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체류인구가 더 오래, 잘 머무를 수 있도록 공간과 사람에 대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공간'에 대해서는 방문, 체류, 정주 매력도를 높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방문과 체류, 이주가 가능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을 보면요.
용도변경에 제한이 있는 유휴 공공건물을 인구감소지역에서 문화, 교육, 숙박시설로 활용할 때는 특례를 도입하고요.
폐교의 무상 대부 요건을 문화시설, 교육용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의 거주자격을 완화하고, 빈집 재생 농어촌 민박 운영 주체로 마을기업과 소셜벤처 등을 특례사업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산간 벽지와 도서지역 외에는 조식만 제공할 수 있는 농어촌 민박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밀키트로 점심과 저녁 식사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단순 방문, 관광이 아닌 '체류'를 위해서는 직업적, 교육적 불이익이 없어야겠죠.
원격 근무와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과 복수 주소제 도입 등 유연한 거주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같이경제' 오아영입니다.
그래픽:김지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같이경제] 생활인구 제도, 활성화하려면?
-
- 입력 2025-04-16 19:15:05
- 수정2025-04-16 19:58:13

가치 있는 소비를 위해 생활 속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같이경제' 시간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 속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인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인구까지 포함된 개념인데요.
지난해 8월 생활인구는 3천3백만 명을 넘어,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5.9배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서 9월 중 최고값으로 행안부와 통계청은 여름 휴가철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류인구 특성을 보면 평균 체류일수는 3.2일 평균 체류시간은 12시간이었고요.
단기숙박형은 여성과 30살 미만 비중이 높았고, 통근통학형은 남성과 40~50대 비중이 높았습니다.
대구·경북만 보면, 체류인구 배수 상위 10개 지역에 7월에는 영덕, 9월에는 군위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북은 평균 체류일수와 6개월 내 재방문율이 높은 반면, 유출인구 대비 유입인구 비율은 다른 시도에 비해 낮았는데요.
경북 도민들이 다른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가운데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체류인구 유입 규모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체류일수 데이터 등을 활용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토연구원 자료를 보면, 체류인구에 체류일수 가중치를 적용하자 충남 보령과 충북 단양은 규모가 줄었고, 영천과 전남 영암은 증가했는데요.
영천, 영암은 상대적으로 체류인구의 체류일수가 길다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 단기, 장기 체류자 맞춤형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류 인프라 부족도 지적됐는데요.
대규모인 관광숙박업은 전체의 14.1%만 인구감소지역에서 운영 중인데 반해, 소규모인 관광펜션업과 농어촌 민박업은 50~60%가량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인구감소지역 안에서도 격차는 컸는데요.
경기 가평이나 충남 태안, 경남 남해는 체류 인프라가 천 개가 넘는 반면, 고령과 영양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체류인구가 더 오래, 잘 머무를 수 있도록 공간과 사람에 대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공간'에 대해서는 방문, 체류, 정주 매력도를 높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방문과 체류, 이주가 가능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을 보면요.
용도변경에 제한이 있는 유휴 공공건물을 인구감소지역에서 문화, 교육, 숙박시설로 활용할 때는 특례를 도입하고요.
폐교의 무상 대부 요건을 문화시설, 교육용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의 거주자격을 완화하고, 빈집 재생 농어촌 민박 운영 주체로 마을기업과 소셜벤처 등을 특례사업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산간 벽지와 도서지역 외에는 조식만 제공할 수 있는 농어촌 민박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밀키트로 점심과 저녁 식사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단순 방문, 관광이 아닌 '체류'를 위해서는 직업적, 교육적 불이익이 없어야겠죠.
원격 근무와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과 복수 주소제 도입 등 유연한 거주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같이경제' 오아영입니다.
그래픽:김지현
인구 소멸 위기 속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인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인구까지 포함된 개념인데요.
지난해 8월 생활인구는 3천3백만 명을 넘어,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5.9배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서 9월 중 최고값으로 행안부와 통계청은 여름 휴가철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류인구 특성을 보면 평균 체류일수는 3.2일 평균 체류시간은 12시간이었고요.
단기숙박형은 여성과 30살 미만 비중이 높았고, 통근통학형은 남성과 40~50대 비중이 높았습니다.
대구·경북만 보면, 체류인구 배수 상위 10개 지역에 7월에는 영덕, 9월에는 군위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북은 평균 체류일수와 6개월 내 재방문율이 높은 반면, 유출인구 대비 유입인구 비율은 다른 시도에 비해 낮았는데요.
경북 도민들이 다른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가운데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체류인구 유입 규모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체류일수 데이터 등을 활용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토연구원 자료를 보면, 체류인구에 체류일수 가중치를 적용하자 충남 보령과 충북 단양은 규모가 줄었고, 영천과 전남 영암은 증가했는데요.
영천, 영암은 상대적으로 체류인구의 체류일수가 길다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 단기, 장기 체류자 맞춤형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류 인프라 부족도 지적됐는데요.
대규모인 관광숙박업은 전체의 14.1%만 인구감소지역에서 운영 중인데 반해, 소규모인 관광펜션업과 농어촌 민박업은 50~60%가량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인구감소지역 안에서도 격차는 컸는데요.
경기 가평이나 충남 태안, 경남 남해는 체류 인프라가 천 개가 넘는 반면, 고령과 영양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체류인구가 더 오래, 잘 머무를 수 있도록 공간과 사람에 대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공간'에 대해서는 방문, 체류, 정주 매력도를 높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방문과 체류, 이주가 가능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을 보면요.
용도변경에 제한이 있는 유휴 공공건물을 인구감소지역에서 문화, 교육, 숙박시설로 활용할 때는 특례를 도입하고요.
폐교의 무상 대부 요건을 문화시설, 교육용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의 거주자격을 완화하고, 빈집 재생 농어촌 민박 운영 주체로 마을기업과 소셜벤처 등을 특례사업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산간 벽지와 도서지역 외에는 조식만 제공할 수 있는 농어촌 민박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밀키트로 점심과 저녁 식사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단순 방문, 관광이 아닌 '체류'를 위해서는 직업적, 교육적 불이익이 없어야겠죠.
원격 근무와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과 복수 주소제 도입 등 유연한 거주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같이경제' 오아영입니다.
그래픽:김지현
-
-

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오아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여기는 안동] 영양군, 산불 피해 복구 292억 원 추경 편성 외](https://news.kbs.co.kr/data/news/title_image/newsmp4/daegu/news7/2025/04/16/80_822955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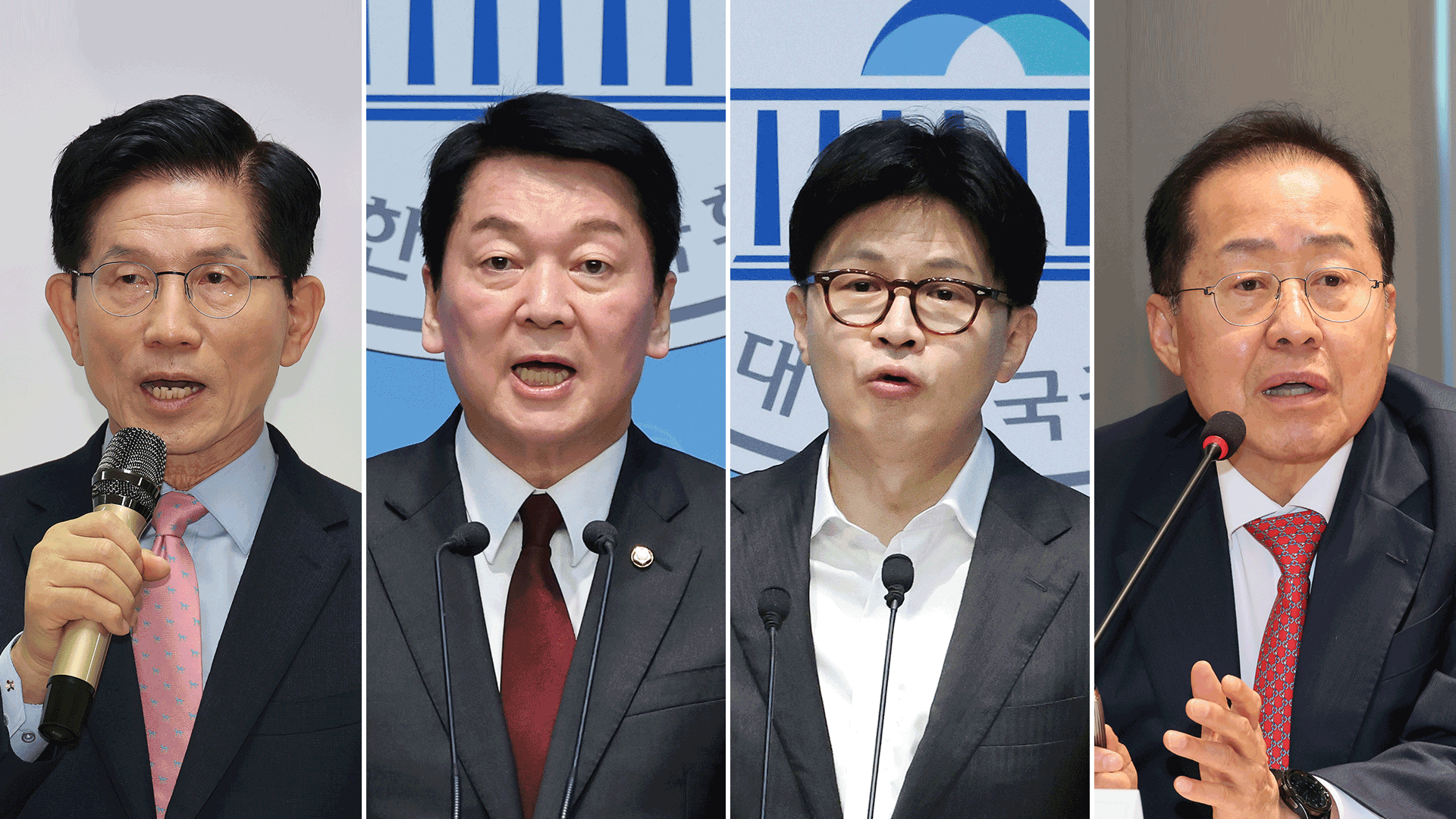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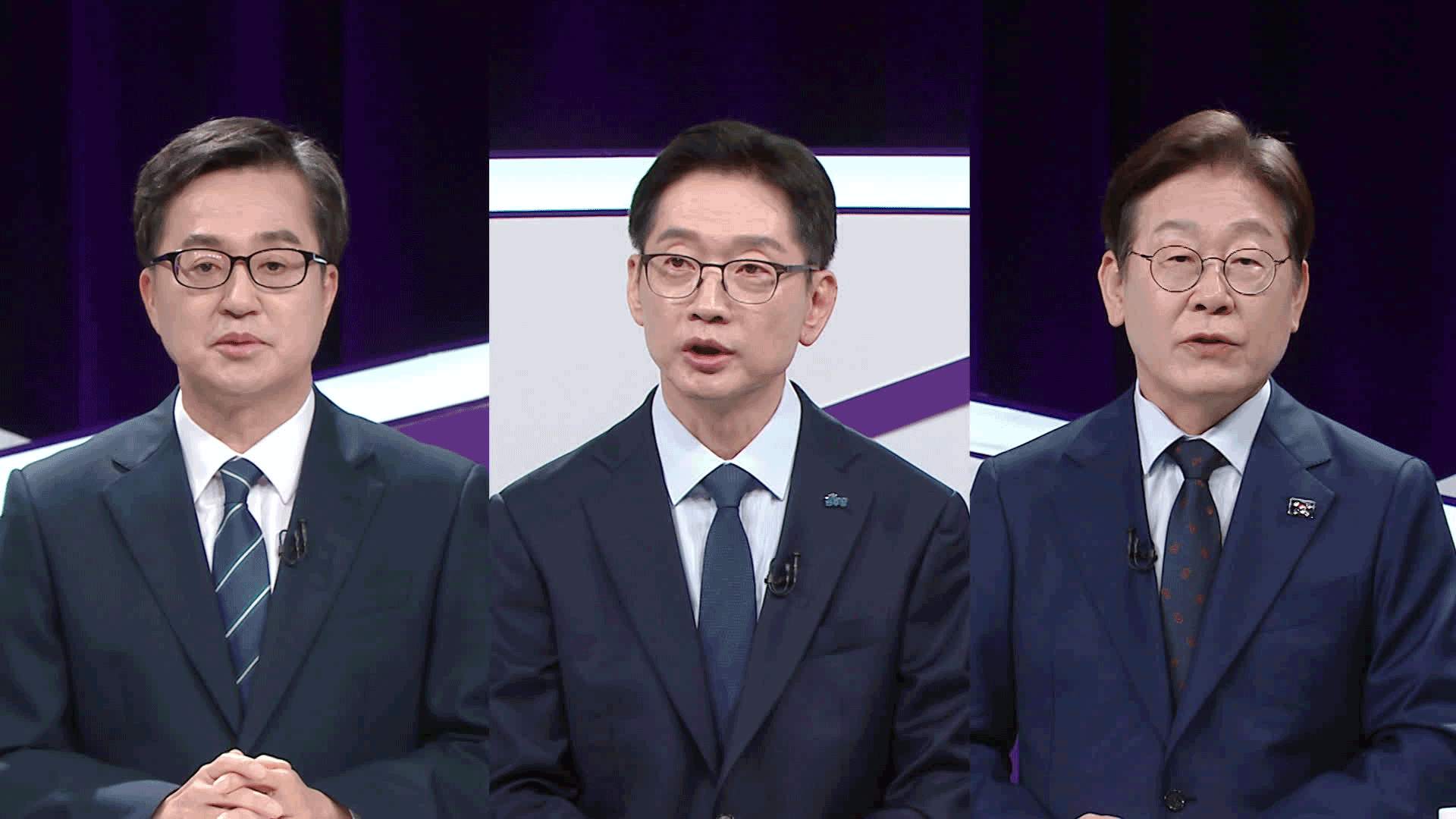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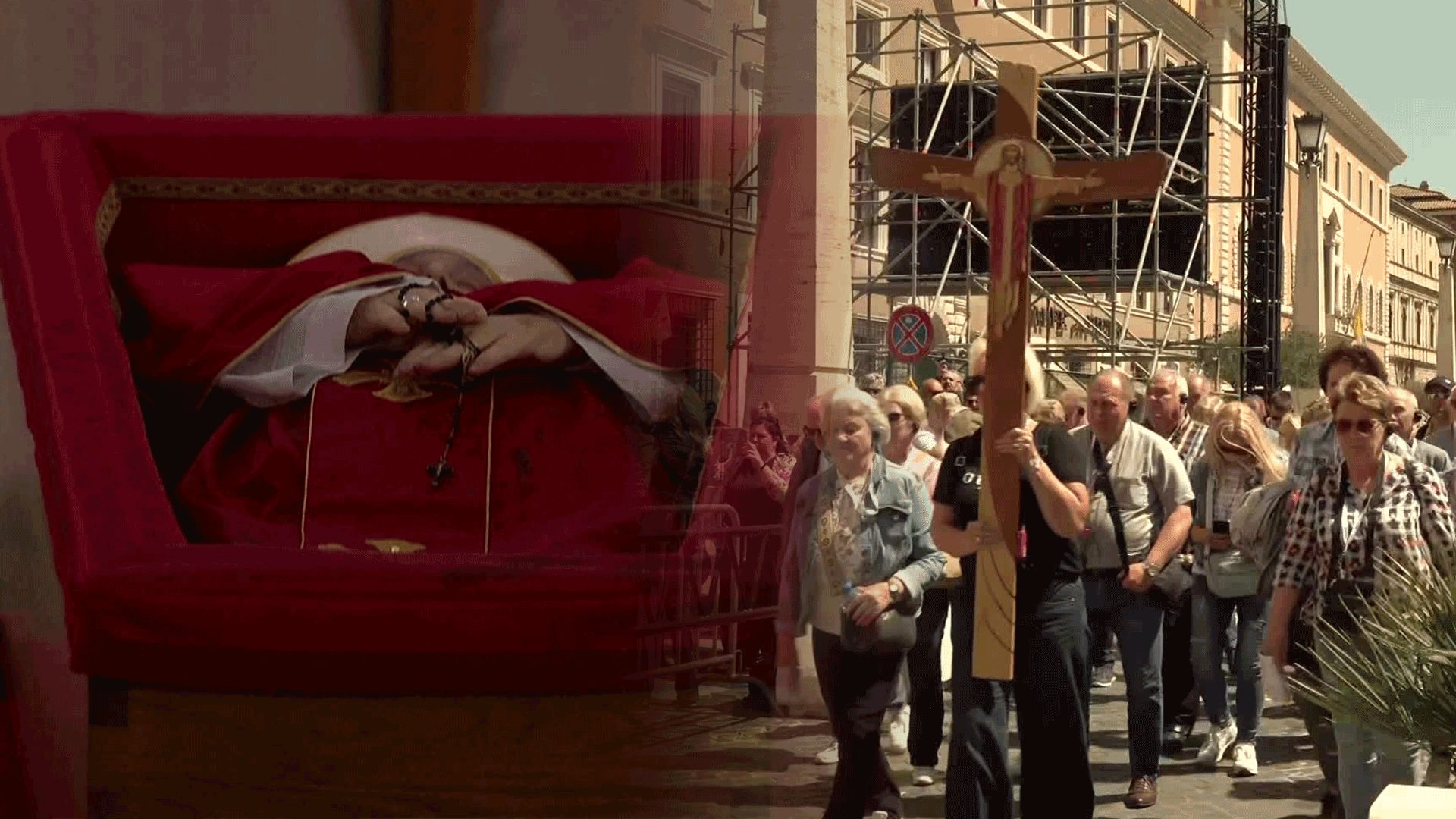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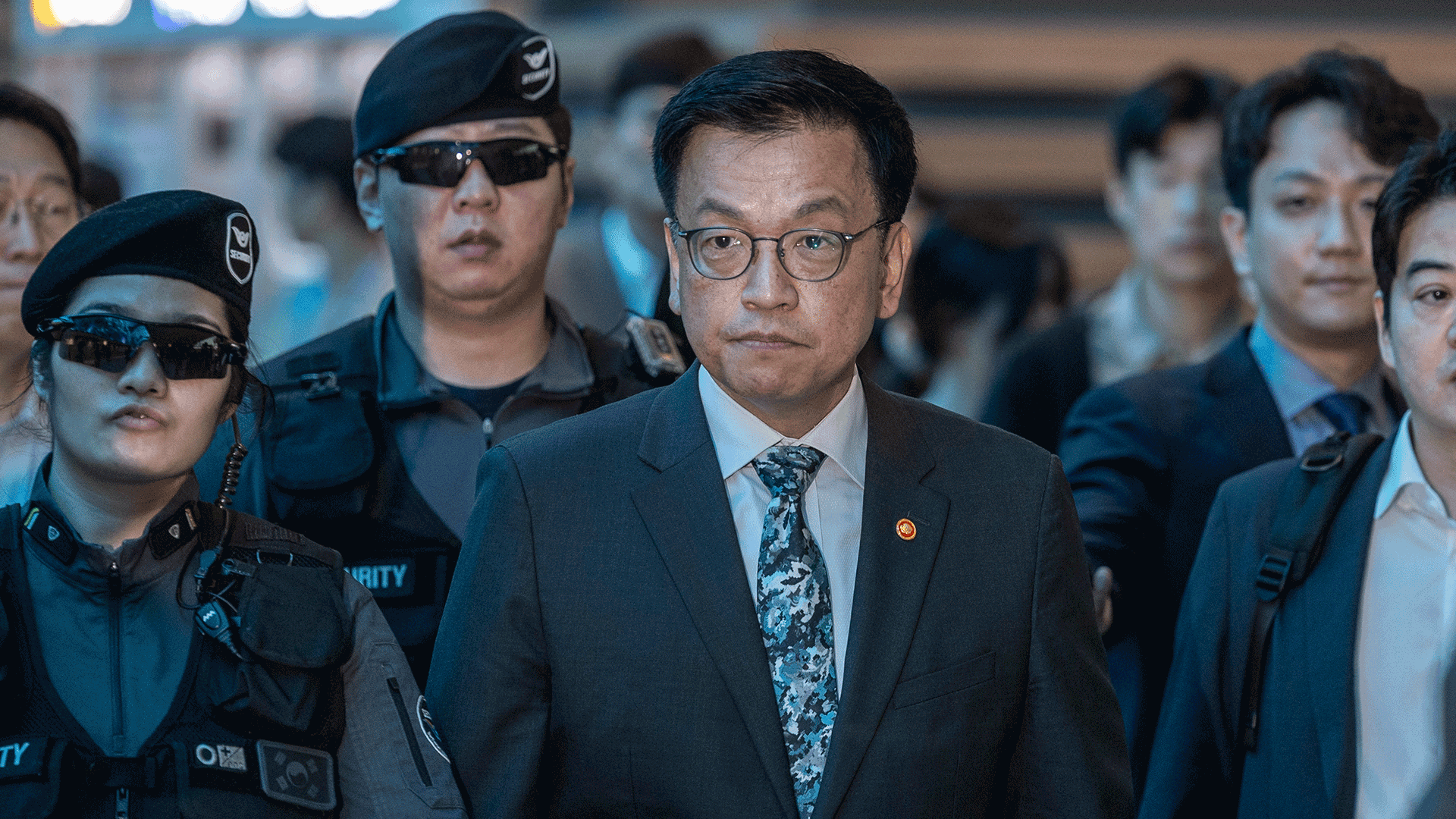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