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수영 유치 한국 ‘제2 박태환 급하다’
입력 2013.07.19 (20:18)
수정 2013.07.20 (14:09)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CLOVA Summary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최고 권위의 세계대회를 유치한 만큼 주최국에 걸맞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대한수영연맹과 체육계는 장기적인 선수 발굴 및 육성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한국 수영은 과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번번이 높은 벽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귀국길에 오르곤 했다. 하지만 안방에서 치르는 대회마저 남의 잔치판으로 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려면 최소한이라도 개최국의 성적이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 수영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2019년까지 남은 6년은 그리 많은 시간이 아닌 듯하다.
1973년 시작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경영 종목의 경우 8명이 겨루는 종목별 결승에 진출한 한국 선수라고는 금메달을 두 차례나 딴 박태환(인천시청)을 포함해 네 명뿐이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는 대표선발전을 거쳐 국내 1인자들만이 나서는데도 사정이 이렇다. 한국신기록은커녕 개인 기록도 단축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선수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 챔피언인 박태환(인천시청)은 "우리 선수들은 국제대회에 나가면 너무 큰 산이 앞에 있어서인지 '내가 저길 오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부터 한다"면서 "예선만 치르고 가자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아시아는 물론 세계무대에서도 강호로 자리매김해가는 중국과 일본을 보면 한국 수영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경영 종목에서는 남녀 평영과 여자 접영, 개인혼영 등은 나름대로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종목들이다.
한국수영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면 무엇보다도 유망주를 일찌감치 발굴해 집중적으로 조련하면서 다양한 국제대회 경험을 쌓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2, 제3의 박태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만 기다라고 있을 수는 없다.
한국은 2011년 상하이 대회 때 경영과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에만 선수를 출전시켰다.
대한수영연맹은 애초 다이빙에도 네 명의 선수를 내보내려 했다. 하지만 세계적인 선수들과의 기량 차가 크다며 당시 개최 시기가 비슷했던 선전 하계유니버시아드 준비에 전념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2년마다 한 번 열리는 세계수영의 최대 잔치에 참가해 경험과 자신감을 쌓을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수영의 도약이나 종목별 균형 발전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2009년 로마 대회에서 큰 실패를 경험한 박태환이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적인 명장인 마이클 볼(호주) 코치의 전담 지도를 받으며 선진 시스템에서 대회를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당시 볼 코치의 급여를 포함해 전지훈련비 등 박태환의 전담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20억원으로, 이는 그해 수영연맹 예산의 절반이나 됐다.
지도자들에게도 수영선진국의 시스템을 보고 배울 기회를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선수들의 자세와 의식 변화를 이끄는 한편 세계수영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도자의 수준이 먼저 받쳐줘야 하기 때문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많이 본 뉴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








![[단독] 한동훈 “민주당, ‘현타’ 올 것…겁박 시위가 오히려 역효과 내”](/data/news/2024/11/15/20241115_zy0ZHv.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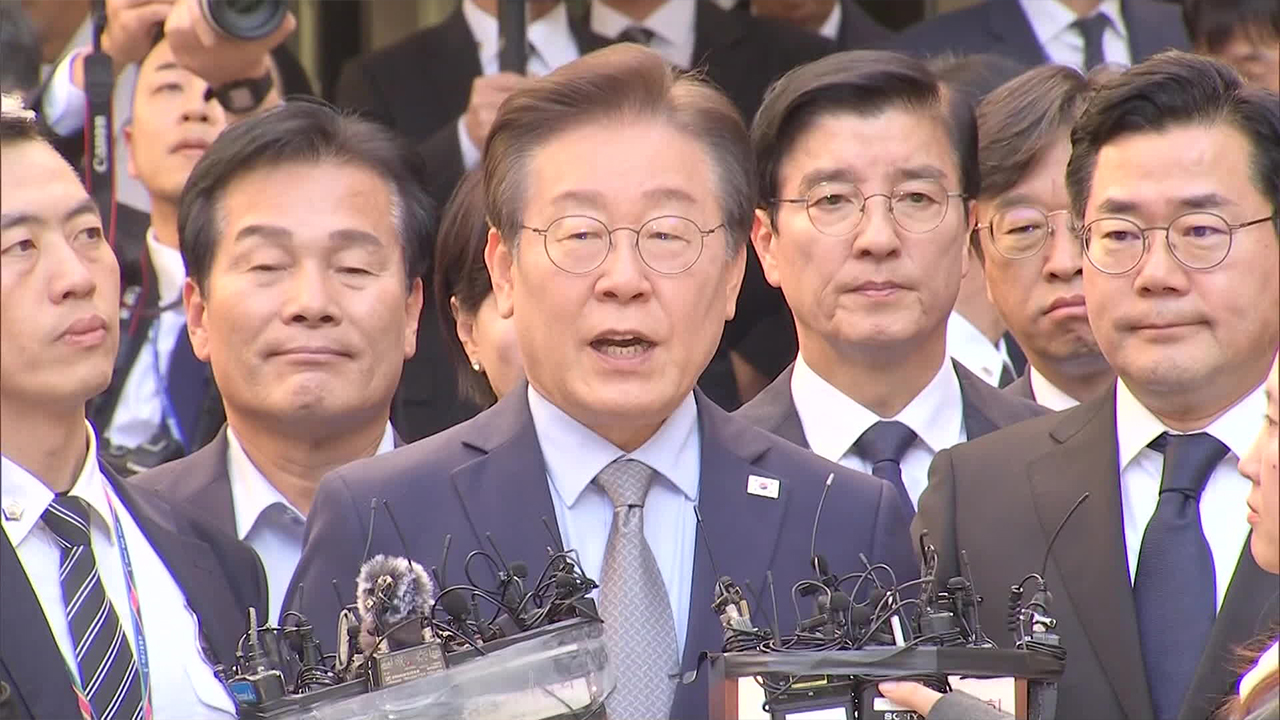


![[건강충전] 눈 앞에 벌레가? ‘비문증’ 대처법은?](/data/news/2013/07/15/2690964_9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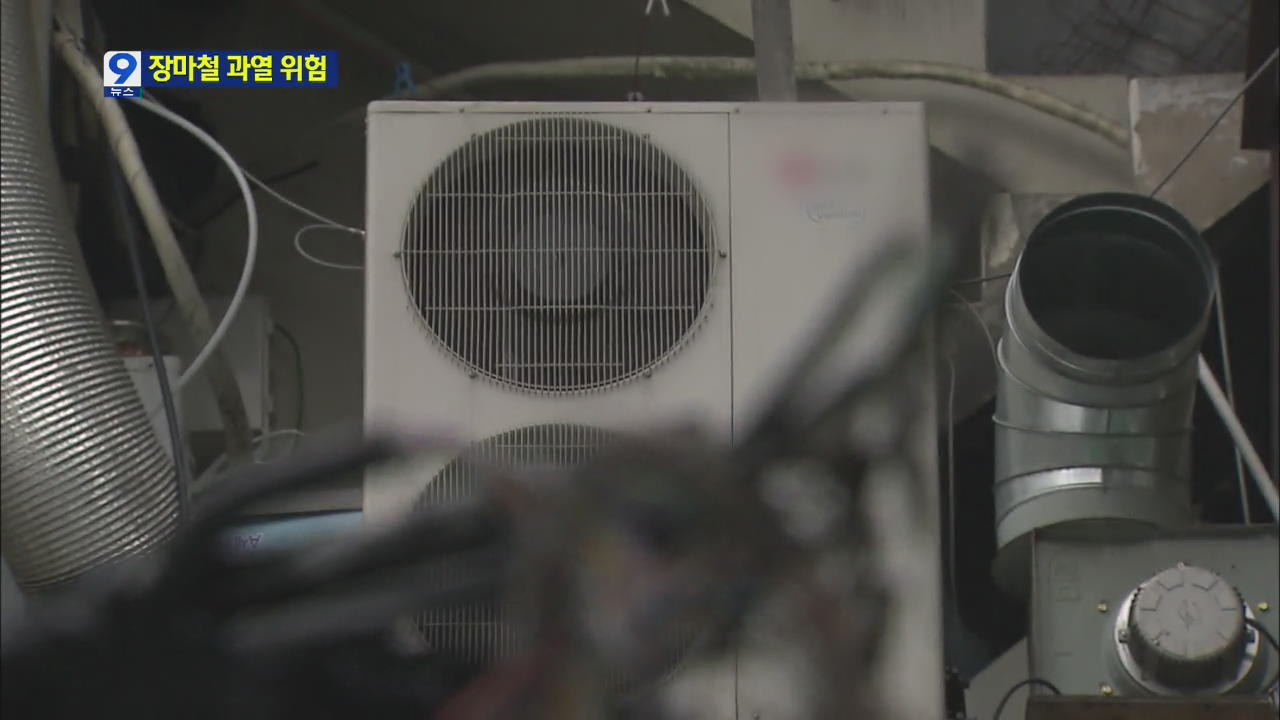
![[화제포착] “집 나간 고양이, 이것만 알면 찾아요”](/data/news/2013/07/25/2696845_13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