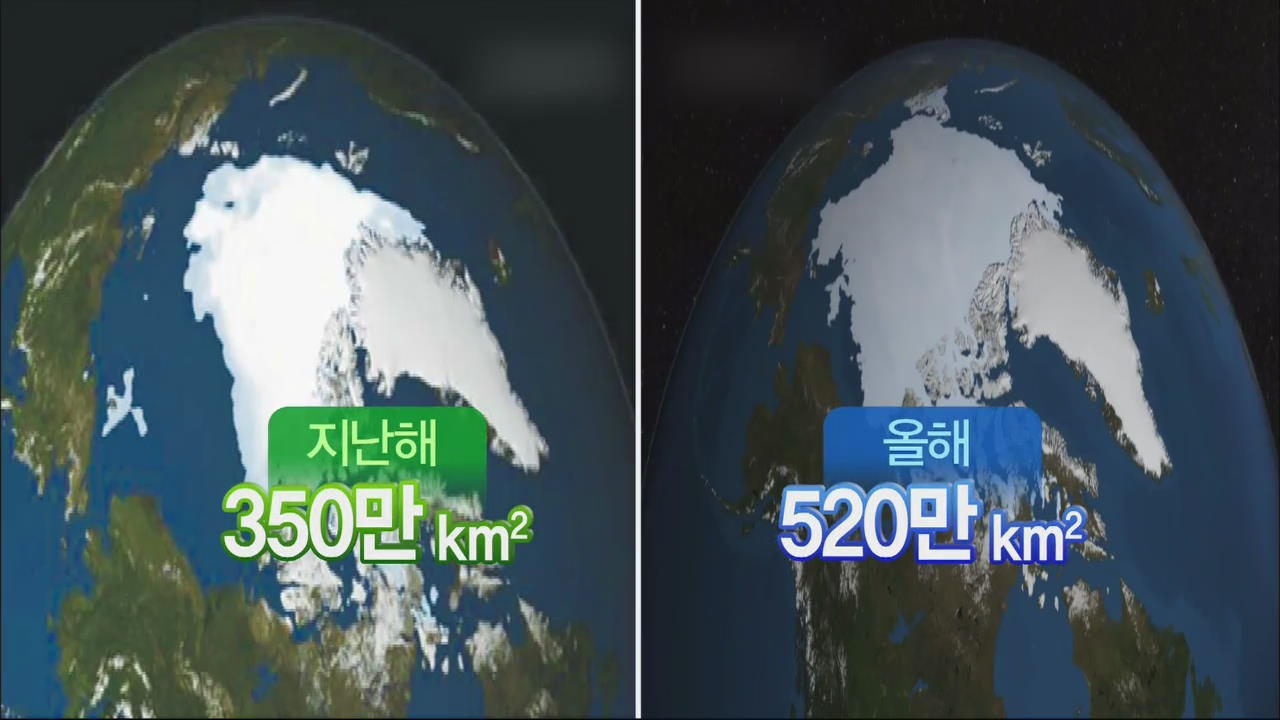LG 저주 푼 ‘김기태 리더십’, 새 역사 도전
입력 2013.09.22 (22:09)
수정 2013.09.22 (22:32)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CLOVA Summary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올해 최고 화제를 몰고 다닌 2위 LG는 22일 NC를 6-1로 제압하고 시즌 승수를 71승(49패)으로 늘렸다.
3위 넥센이 롯데를 4-3으로 잡아주면서 LG는 선두 4팀 중 가장 먼저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했다.
김성근 전 감독이 지휘하던 2002년 한국시리즈에서 삼성에 분패해 준우승에 머문 뒤 11년이 걸린 일이다.
강산이 한 번 변하도록 가을 잔치에서 거푸 소외되면서 LG는 한국프로야구에서 가장 오랜 기간 포스트시즌에 나가지 못한 팀으로 남았다.
1990년과 1994년 두 차례나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르며 단숨에 명문구단으로 자리매김한 LG가 기나긴 암흑기를 겪은 것이다.
팀 색깔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성근 전 감독을 해임한 뒤 이광환(2003년), 이순철(2004∼2006년 중도퇴진), 김재박(2007∼2009년), 박종훈(2010∼2011년) 등 4명의 사령탑이 LG를 거쳐 갔으나 누구도 팀을 4강으로 이끌지 못했다.
LG는 그 사이 8개 구단 체제에서 최하위로 두 번(2006년·2008년)이나 추락하며 망가졌다.
순위 또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6위-6위-6위-8위-5위-8위-7위-6위-6위-7위로 하위권을 맴돌았다.
2002년 올린 시즌 66승을 이후 10년간 한 번도 넘어서지 못한 게 LG의 암울한 현실이었다.
좀처럼 풀리지 않던 '쌍둥이의 저주'를 김기태 감독이 재임 2년째 만에 보란 듯이 깼다.
지휘봉을 잡은 첫해인 2012년 7위에 그쳐 팬들에게 웃음을 돌려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김 감독은 올해 더 큰 위기에 봉착했다.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야구단에 몸담은 프런트 직원을 모두 갈아치우는 등 그룹에서 다잡기에 나선 것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기댈만한 구석이 전혀 없던 김 감독은 특유의 친화력을 앞세워 선수단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이병규, 류택현 등 베테랑을 중용하고 문선재, 김용의 등 젊은 선수들을 과감하게 기용해 팀의 조직력을 배가시켰다.
선수들에게 더그아웃에서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김 감독의 진솔한 모습에 선수들은 더 땀을 흘려야겠다는 자극을 받았다.
코치들에게 전권을 위임해 전문성을 극대화했고, 김 감독은 근성과 팀워크를 강조하며 선수단을 하나로 묶었다.
승리 후 손바닥을 마주치는 하이파이브가 아닌 더 정성을 쏟아야 하는 손가락 부딪히기로 김 감독은 선수들과 마음으로 교감했다.
그 결과 LG는 서서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시즌 초반 잘 나가다가 5월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레다메스 리즈, 벤저민 주키치 두 외국인 투수가 시즌 첫 동반 승리를 낚은 6월 21∼23일 삼성과의 3연전을 기점으로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그리기 시작했다.
이후 11차례 연속 특정팀과의 2연전 이상의 시리즈에서 1승 1패 또는 2승 1패 이상을 거두며 차곡차곡 승리를 쌓았다.
꾸준히 승패 차를 '20' 안팎으로 유지하며 승승장구하던 LG는 13일 KIA를 제물로 67승째를 거둬 시즌 최다승 기록을 11년 만에 깼고, 18일 SK를 이기고 9개 구단 중 가장 먼저 70승 고지를 밟아 포스트시즌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LG는 삼성에서 최고의 셋업맨으로 활약한 정현욱이 자유계약선수(FA)로 가세하면서 아킬레스건이던 마운드가 안정을 찾았다.
해외파 류제국이 합류하고 옆구리 투수 우규민이 선발진에서 두자릿수 승리를 올리면서 LG는 선발과 불펜이 가장 조화를 이룬 팀으로 자리매김했다.
LG의 팀 평균자책점은 3.66으로 전체 1위다.
박용택, 이병규, 이진영, 정성훈 등 베테랑이 중심을 이룬 타선도 대폭발해 팀 타율 전체 2위(0.284)를 기록하며 투타의 앙상블을 끌어냈다.
2002년 당시보다 더 강해진 LG가 올해 포스트시즌에서 11년간 묵혀둔 한풀이를 준비하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많이 본 뉴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
![[단독] ‘킥보드 폭행’ 유치원 교사, 피해 아동 11명 더 있었다…“떨어진 밥 주워먹어”](/data/fckeditor/new/image/2024/11/16/33383173167182637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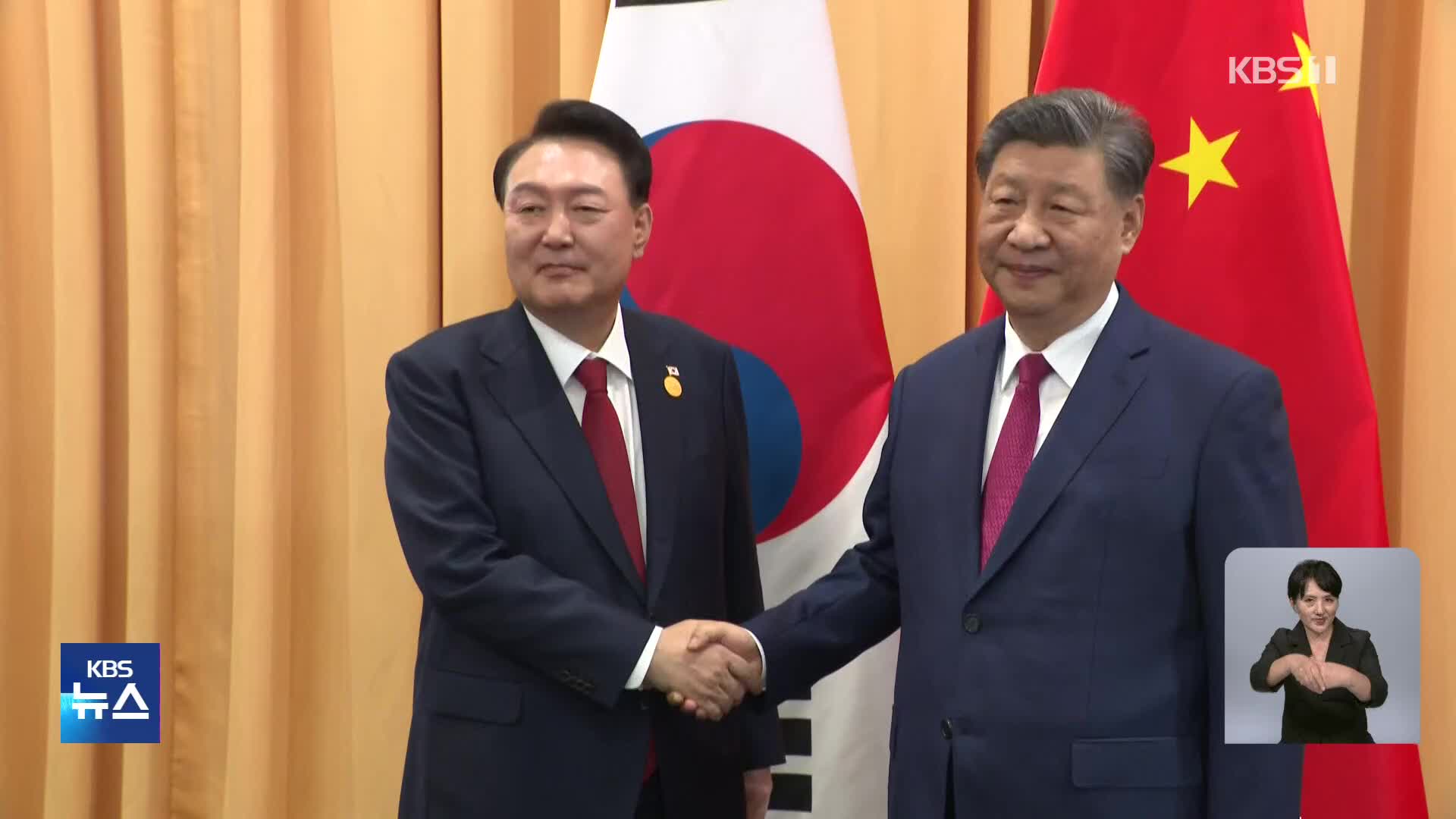
![[영상] ‘삐약이’ 신유빈 등장에 구름 인파…전국 유소년 탁구 축제 당진서 개막](/data/news/2024/11/16/20241116_e1ptDY.jpg)





![[단독] 한동훈 “민주당, ‘현타’ 올 것…겁박 시위가 오히려 역효과 내”](/data/news/2024/11/15/20241115_zy0ZHv.jpg)

![[건강충전] MSG는 몸에 나쁘다?…오해와 진실](/data/news/2013/10/01/2731813_90.jpg)
![[화제포착] 친자 확인 검사, 어떻게 이뤄지나?](/data/news/2013/09/25/2728624_13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