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천하 ‘마침표’…고개숙인 ‘전설’ 신치용
입력 2015.04.01 (21:23)
수정 2015.04.01 (21:31)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CLOVA Summary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영원한 승자는 없었다.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가 기나긴 독주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삼성화재는 1일 경기도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치러진 챔피언결정전 3차전에서 OK저축은행에 또다시 패해 시리즈 전적 3패로 준우승에 머물렀다.
V리그 7연패에 빛나는 관록의 삼성화재가 이제 갓 창단 2년차의 '막내구단' OK저축은행에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무너지는 최대의 이변이 벌어졌다.
삼성화재는 2007-2008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전무후무한 챔프전 7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다.
프로 출범 이전 '백구의 대제전' 시절 1997년부터 2004년까지 8연패를 달성한 것까지 포함하면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배구는 '삼성화재 천하'였다.
삼성화재가 그동안 숱한 위기 속에서도 무적 행진을 이어온 밑바탕에는 '코트의 제갈공명' 신치용 감독을 빼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신 감독은 매년 시즌이 시작될 때면 삼성화재가 어느 때보다 약팀이라며 불안감을 토로하면서도 매번 위기를 딛고 우승이라는 값진 결과를 끌어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 감독의 말을 '엄살'로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말이다.
삼성화재는 V리그 원년부터 우승을 독차지하면서 신인 드래프트에서 늘 뒷순위로 밀려 좋은 선수를 데려올 기회를 얻지 못했다. 우승의 그림자였다.
선수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세대교체는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그 사이 '배구 도사' 석진욱이 은퇴했고, 국내 최고의 리베로 여오현은 현대캐피탈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설상가상으로 올 시즌에는 국가대표 라이트 공격수 박철우가 리그 초반 몇 경기만 뛰고 입대했다. 삼성화재는 국가대표 한 명 없이 올 시즌을 치렀다.
이런 위기 속에서 신 감독은 다시 한번 승부사 기질을 발휘했다.
세터에서 공격수로 변신한 황동일과 프로 2년차 김명진을 번갈아 라이트로 기용하며 박철우의 공백을 메웠다.
수비는 이적생들의 활약으로 해결했다. 시즌을 앞두고 한국전력에서 옮겨온 리베로 곽동혁, 대한항공에서 삼성화재로 유니폼을 바꿔 입은 레프트 류윤식이 제 몫을 해냈다.
이전 소속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이들은 신 감독의 조련 속에서 수준급의 선수들로 탈바꿈했다.
이 과정이 쉬웠던 것은 아니다. 신 감독은 강도 높은 훈련으로 기본기부터 숙달시켰고,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들며 이들을 삼성화재의 시스템에 녹아들도록 했다.
그 결과가 바로 정규시즌 최소 범실(632개) 1위다. 이 부문 2위인 우리카드(696개)보다 64개나 적다.
삼성화재는 올 시즌 범실을 최소화하며 정규리그에서 여유 있게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챔프전에서 황동일, 김명진, 곽동혁, 류윤식, 고준용 등 큰 경기 경험이 적은 선수들이 흔들리자 '우승 제조기' 신 감독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일각에서는 삼성화재 배구를 '몰빵 배구'라고 깎아내리지만 외국인 선수로 누가 오든 성공 사례를 만든 것은 서브 리시브와 수비 등 조직력이었다.
그 조직력에 금이 가자 리그 최고의 특급 용병이라는 레안드로 레이바 마르티네스(등록명 레오)의 파괴력도 눈에 띄게 약화했다.
삼성화재의 8연패 도전 무산과 함께 신 감독은 고개를 숙였지만, 이는 그의 패배가 아니다.
신 감독이 "삼성화재가 10년간 참아 온 밑천이 드러났다"고 말한 것도 그래서다.
삼성화재는 1일 경기도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치러진 챔피언결정전 3차전에서 OK저축은행에 또다시 패해 시리즈 전적 3패로 준우승에 머물렀다.
V리그 7연패에 빛나는 관록의 삼성화재가 이제 갓 창단 2년차의 '막내구단' OK저축은행에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무너지는 최대의 이변이 벌어졌다.
삼성화재는 2007-2008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전무후무한 챔프전 7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다.
프로 출범 이전 '백구의 대제전' 시절 1997년부터 2004년까지 8연패를 달성한 것까지 포함하면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배구는 '삼성화재 천하'였다.
삼성화재가 그동안 숱한 위기 속에서도 무적 행진을 이어온 밑바탕에는 '코트의 제갈공명' 신치용 감독을 빼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신 감독은 매년 시즌이 시작될 때면 삼성화재가 어느 때보다 약팀이라며 불안감을 토로하면서도 매번 위기를 딛고 우승이라는 값진 결과를 끌어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 감독의 말을 '엄살'로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말이다.
삼성화재는 V리그 원년부터 우승을 독차지하면서 신인 드래프트에서 늘 뒷순위로 밀려 좋은 선수를 데려올 기회를 얻지 못했다. 우승의 그림자였다.
선수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세대교체는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그 사이 '배구 도사' 석진욱이 은퇴했고, 국내 최고의 리베로 여오현은 현대캐피탈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설상가상으로 올 시즌에는 국가대표 라이트 공격수 박철우가 리그 초반 몇 경기만 뛰고 입대했다. 삼성화재는 국가대표 한 명 없이 올 시즌을 치렀다.
이런 위기 속에서 신 감독은 다시 한번 승부사 기질을 발휘했다.
세터에서 공격수로 변신한 황동일과 프로 2년차 김명진을 번갈아 라이트로 기용하며 박철우의 공백을 메웠다.
수비는 이적생들의 활약으로 해결했다. 시즌을 앞두고 한국전력에서 옮겨온 리베로 곽동혁, 대한항공에서 삼성화재로 유니폼을 바꿔 입은 레프트 류윤식이 제 몫을 해냈다.
이전 소속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이들은 신 감독의 조련 속에서 수준급의 선수들로 탈바꿈했다.
이 과정이 쉬웠던 것은 아니다. 신 감독은 강도 높은 훈련으로 기본기부터 숙달시켰고,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들며 이들을 삼성화재의 시스템에 녹아들도록 했다.
그 결과가 바로 정규시즌 최소 범실(632개) 1위다. 이 부문 2위인 우리카드(696개)보다 64개나 적다.
삼성화재는 올 시즌 범실을 최소화하며 정규리그에서 여유 있게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챔프전에서 황동일, 김명진, 곽동혁, 류윤식, 고준용 등 큰 경기 경험이 적은 선수들이 흔들리자 '우승 제조기' 신 감독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일각에서는 삼성화재 배구를 '몰빵 배구'라고 깎아내리지만 외국인 선수로 누가 오든 성공 사례를 만든 것은 서브 리시브와 수비 등 조직력이었다.
그 조직력에 금이 가자 리그 최고의 특급 용병이라는 레안드로 레이바 마르티네스(등록명 레오)의 파괴력도 눈에 띄게 약화했다.
삼성화재의 8연패 도전 무산과 함께 신 감독은 고개를 숙였지만, 이는 그의 패배가 아니다.
신 감독이 "삼성화재가 10년간 참아 온 밑천이 드러났다"고 말한 것도 그래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많이 본 뉴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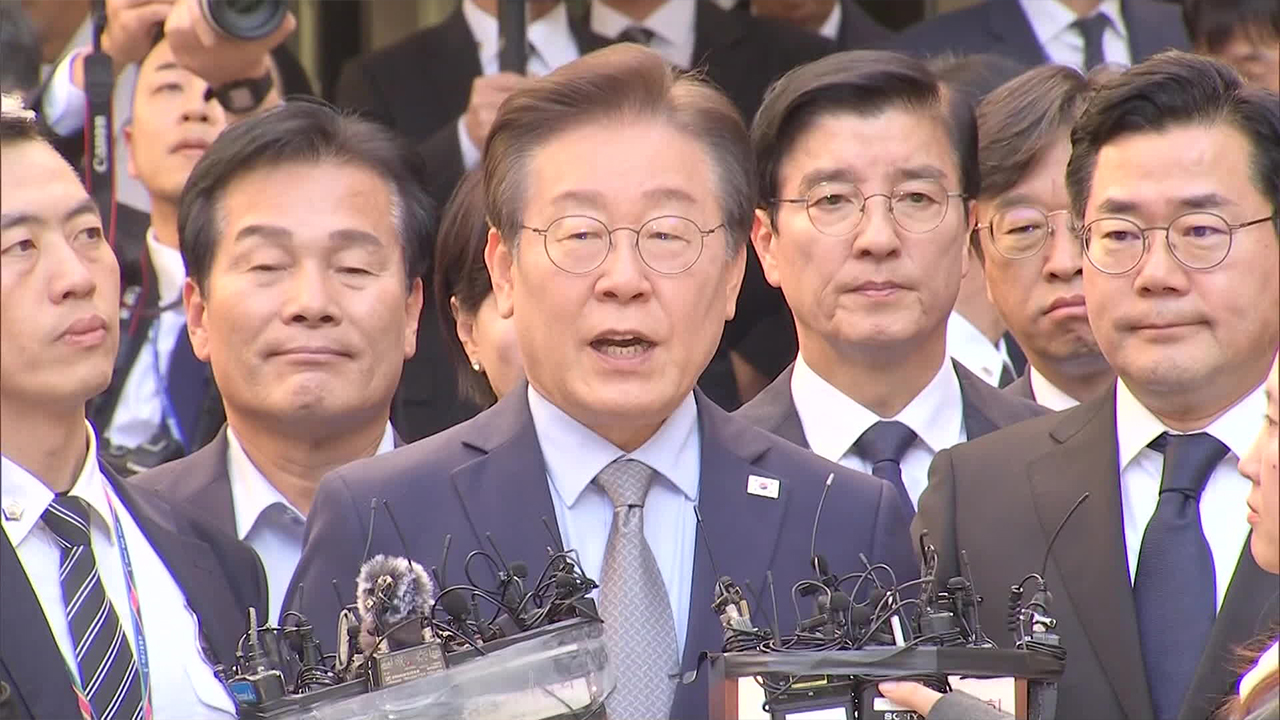






![[단독] 한동훈 “민주당, ‘현타’ 올 것…겁박 시위가 오히려 역효과 내”](/data/news/2024/11/15/20241115_zy0ZHv.jpg)



![[133회] “손톱 발톱 색깔을 보세요”…나의 건강을 알 수 있습니다](/data/news/2015/03/30/3046939_y2i.jpg)
![[135회] 술 마신 다음 날 아메리카노, ‘숙취 해소’에 도움될까요?](/data/news/2015/04/13/3056094_CwE.jpg)

![[충전! 여자의 아침] ‘실버타운’ 이것이 궁금하다!](/data/news/2015/04/02/3048926_7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