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열·로이스터, ‘가을 야구’ 전쟁
입력 2008.10.08 (07:59)
수정 2008.10.08 (08:01)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및 OpenAI 社의 AI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부임 첫 해에 만년 하위팀 롯데를 3위로 끌어올린 로이스터 감독은 포스트시즌에서 '단기전의 도사들'과 지략 대결을 펼친다. 곧 롯데의 성적과 직결되기에 로이스터 감독의 작전에 모든 이의 이목이 쏠려 있다.
정규리그에 참가한 8팀 중 상위 4팀이 대망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다투는 한국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다.
일본프로야구가 최근 포스트시즌 제도를 도입하긴 했으나 '번외 경기'라는 성격이 강하고 여전히 양대리그 정규시즌 우승팀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
단기전에서 독자적인 역사를 구축해 온 한국프로야구는 2년 전 초대 월드베이스볼클래식 4강과 올해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세계에 강한 인상을 심었다.
정규 시즌과 전혀 다른 불펜 운용과 허를 찌르는 변칙 작전 등이 한국식 단기전의 성공 비결이었다.
로이스터 감독이 처음으로 상대할 선동열(45) 삼성 감독은 포스트시즌에서는 백전노장이다.
선수 시절 해태의 한국시리즈 6차례 우승을 일궈낸 선 감독은 일본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곤스에 건너가 1999년 일본시리즈도 경험했다.
삼성 수석코치로 지도자 데뷔한 2004년 이후 5년 연속 가을 잔치에 출장했고 감독에 오른 2005년과 2006년에는 2년 연속 한국시리즈를 제패하고 명감독의 반열에 올랐다.
1999년 일본프로야구 센트럴리그 우승까지 합쳐 선 감독이 프로에서 맛본 우승 횟수만 9차례. 선수로서, 감독으로서 '우승 노하우'를 그만큼 잘 아는 이도 드물다.
반면 메이저리그에서 16년간 LA 다저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등 5팀에서 뛴 로이스터 감독은 애틀랜타 유니폼을 입었던 1982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에 출전한 게 유일한 '큰 경기' 경험이다.
지도자로 변신한 뒤 2002년 밀워키 브루어스 감독으로 빅리그 사령탑에 데뷔했으나 53승94패에 그쳐 포스트시즌은 꿈도 꾸지 못했다.
마이너리그 감독으로 잔뼈가 굵은 로이스터 감독은 1989년, 1991년, 1995년과 1996년 네 차례 마이너리그팀을 이끌고 포스트시즌에 나갔으나 1회전 고비를 못 넘고 패퇴한 징크스가 있다.
1989년에는 다저스 산하 루키리그 GCL 다저스를 지휘했고 리그 결승전에서 아쉽게 2위에 그쳤다.
1991년에는 역시 당시 다저스 산하 싱글A 팀 베로비치 다저스를 맡았고 1995년에는 샌디에이고 산하 더블A 팀 멤피스 칙스를 지도했다.
'올해의 지도자'상을 받았던 1996년에는 샌디에이고 산하 트리플A 라스베이거스 스타스를 퍼시픽 코스트리그 3위로 이끌었고 플레이오프에 나갔으나 또 첫 관문을 넘지 못했다.
로이스터 감독으로서는 선수 시절을 합쳐 이번이 6번째 포스트시즌 도전이다. 통 큰 야구를 펼쳐온 그가 포스트시즌에서도 똑같은 색깔로 한국식 단기전 전법에 맞설지, 포스트시즌 1회전 징크스를 한국에서 깰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가을의 전설’
오늘의 핫 클릭
많이 본 뉴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



![[주요장면] SK, 2년 연속 정상 등극](https://news.kbs.co.kr/newsimage2/200811/20081101/166141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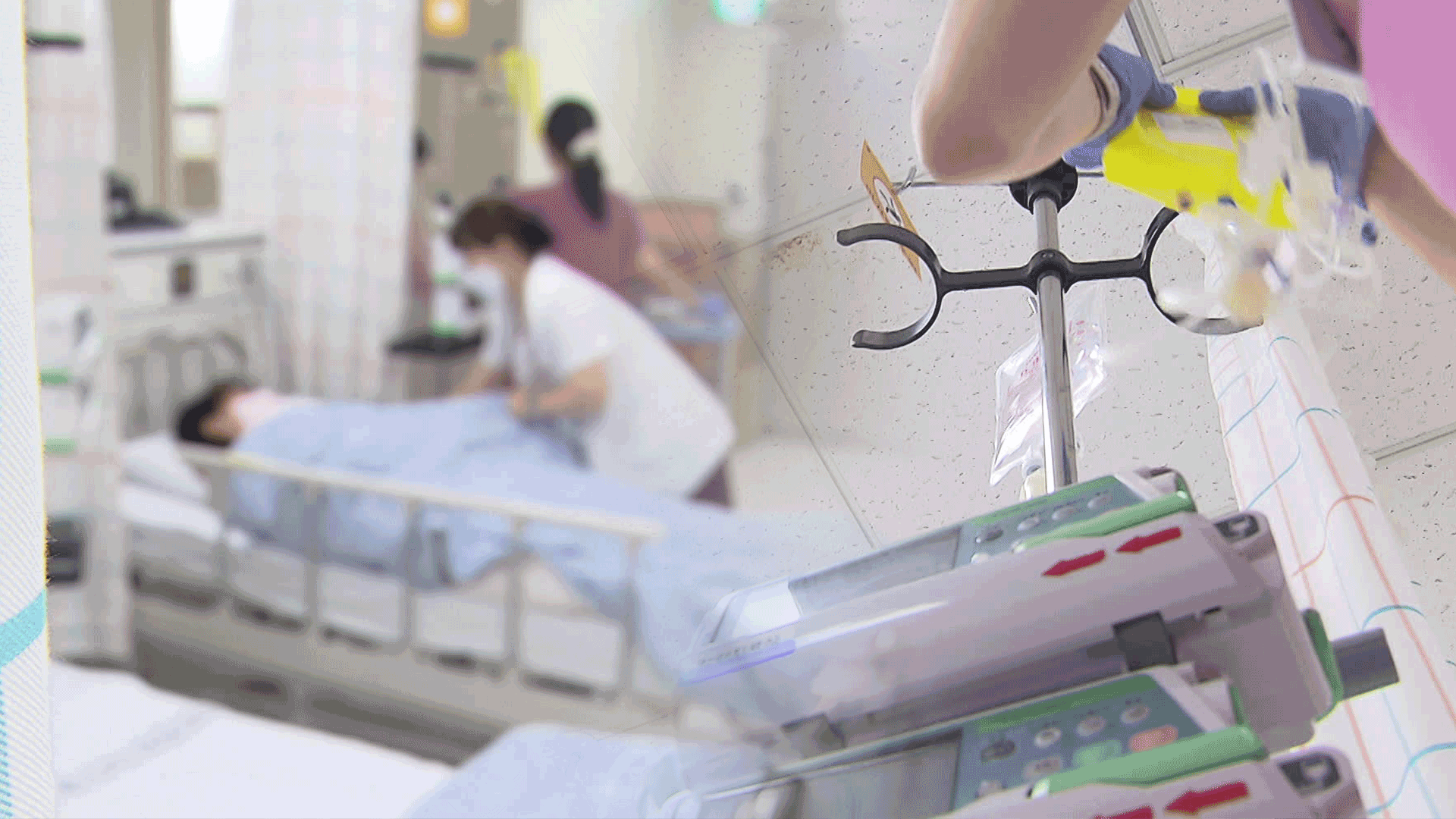



![[연예수첩] 연예계 큰 충격…빈소, ‘눈물바다’](/newsimage2/200810/20081003/164383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