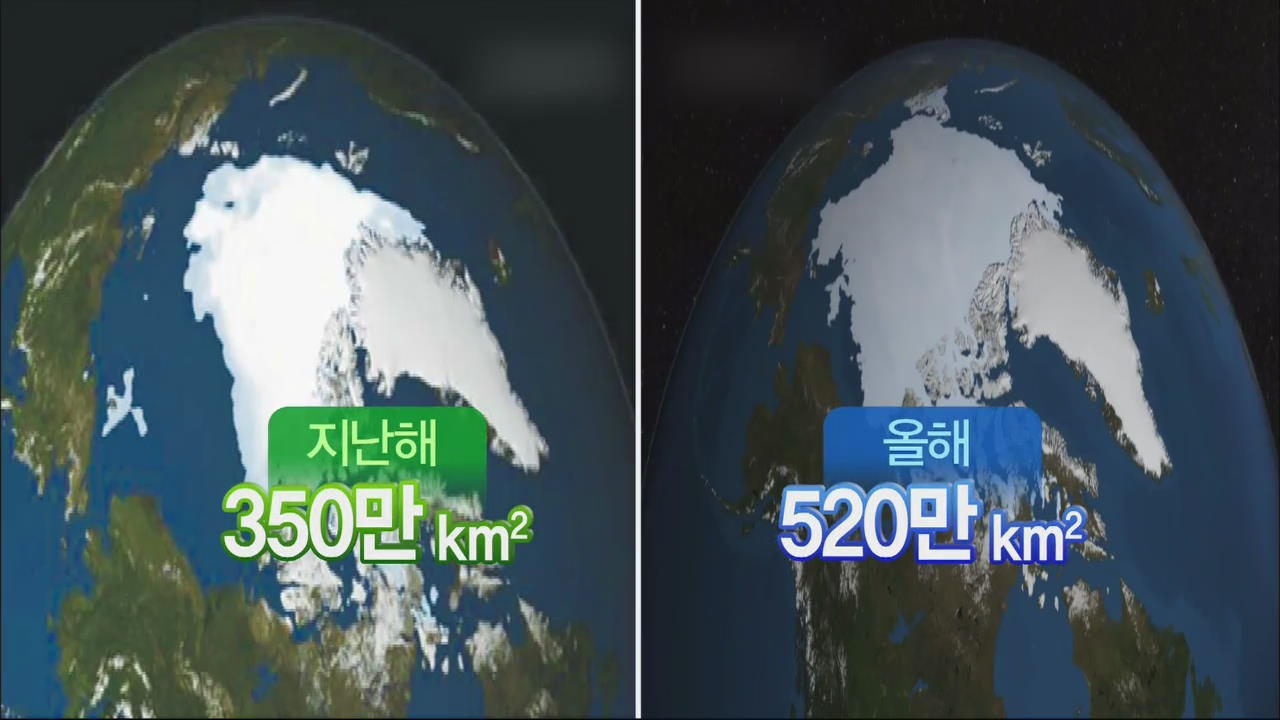머리 복잡한 두산, ‘두 마리 토끼’ 잡아라!
입력 2013.09.23 (19:06)
수정 2013.09.23 (21:12)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CLOVA Summary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김진욱(53) 감독이 2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경기를 앞두고 가장 여러 번 되풀이한 말이다.
정규리그 막판까지 순위 경쟁이 예상 이상으로 치열하게 펼쳐지면서 4강을 사실상 확정한 삼성, LG, 넥센, 두산 등 네 개 구단 사령탑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을 법한 생각이다.
보통 이맘 때쯤이면 판도가 정해져 각 구단이 포스트시즌 준비를 시작하곤 하지만, 올해는 팀당 6∼10경기를 남겨둔 이날까지도 1∼4위가 2.5경기 차이로 붙어 있어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벌여야 할 참이다.
하지만 무리하게 총력전을 벌이다가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주전들의 컨디션을 관리하지 못한 채 포스트시즌에 돌입해 '가을걷이'까지 망칠 수도 있어 사령탑들의 머리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6경기를 남겨두고 1위 삼성과 2위 LG를 2.5경기 차이로 추격 중인 두산은 속내가 더 복잡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2위 이상을 차지해야 준플레이오프를 건너뛰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2.5경기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LG와 두 경기를 남겨둔 터라 완전히 가능성을 접을 상황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 두산은 17일부터 22일까지 6연전을 벌이며 경기당 3명 이상의 계투를 계속 투입하는 강행군을 벌이고 있다.
대신에 20일 김상현과 정재훈을 2군에 내려보내고 니퍼트와 이정호를 불러올렸다.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되 '돌려막기'를 하듯 선수단을 순환시켜 포스트시즌에 대비해 컨디션을 끌어올리도록 하는 식으로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셈이다.
이날도 김 감독은 선발 노경은에 이어 왼손 유희관을 계투로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혀 승리에 '올인'할 뜻을 내비쳤다.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음에도 총력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하는 김 감독은 끊임없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김 감독은 이날 '사실상 삼성과 LG는 멀리 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삼성은 대구니까 멀리 있고 LG는 잠실이니 가까이 있다"는 농담으로 받아쳤다.
하지만 LG와 두 경기를 남겨둔 상황이 맞물리다 보니 단순한 농담으로만 들리지도 않는 것이 사실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많이 본 뉴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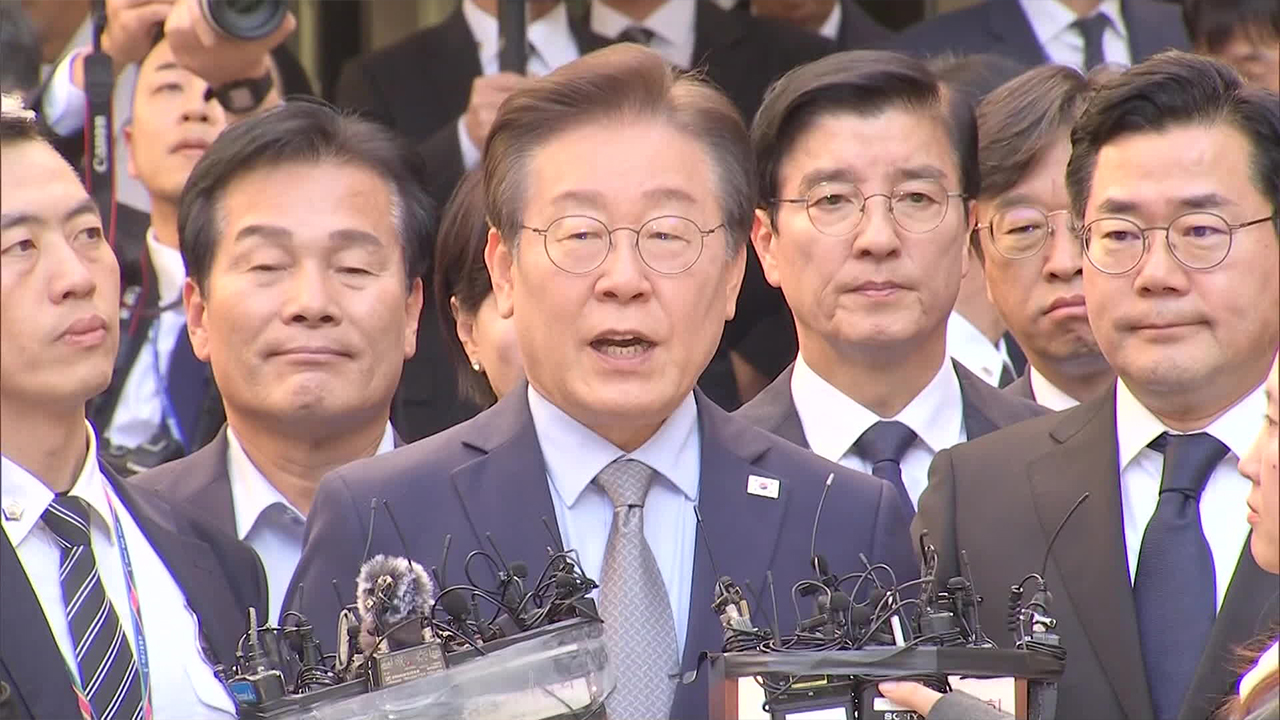








![[단독] 한동훈 “민주당, ‘현타’ 올 것…겁박 시위가 오히려 역효과 내”](/data/news/2024/11/15/20241115_zy0ZHv.jpg)


![[영상] 이재명 “오늘 이 장면,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항소할 것”](/data/news/2024/11/15/20241115_Wysjmw.jpg)
![[건강충전] MSG는 몸에 나쁘다?…오해와 진실](/data/news/2013/10/01/2731813_90.jpg)
![[화제포착] 친자 확인 검사, 어떻게 이뤄지나?](/data/news/2013/09/25/2728624_13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