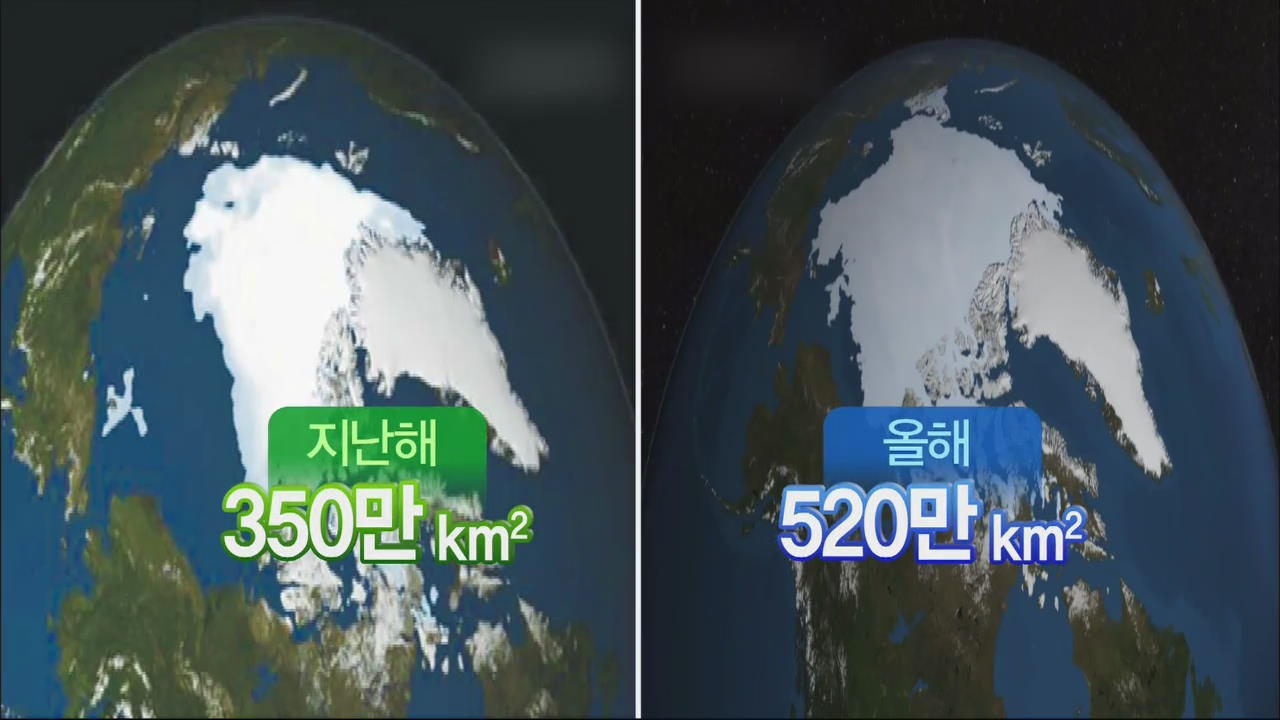악몽 떨친 한국 레슬링, 14년만 ‘화려한 부활’
입력 2013.09.23 (08:51)
수정 2013.09.23 (17:15)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CLOVA Summary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안한봉·박장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3일(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막을 내린 2013 시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동메달 각각 1개씩을 따냈다.
그레코로만형 74㎏의 김현우(삼성생명)와 66㎏급의 류한수(상무)가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55㎏급 최규진(조폐공사)이 은메달, 60㎏급 우승재(조폐공사)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당당히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성적이다.
터키 앙카라와 그리스 아테네에서 나뉘어 열린 1999년 대회에서 김인섭(그레코로만형 58㎏급), 손상필(그레코로만형 69㎏급), 김우용(자유형 54㎏급)이 금메달을 목에 건 이후 14년 만에 세계선수권 금메달이 나왔다.
한 대회에서 네 개의 메달이 쏟아진 것도 2001년 대회(은메달 2개·동메달 2개)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 레슬링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연달아 '노 골드'에 그치는 등 2000년대 들어 깊은 침체를 겪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김현우의 금메달로 자존심을 되찾는가 했지만 악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30년간 한국 레슬링을 뒷바라지해 온 삼성이 지원을 중단하면서 대한레슬링협회는 새로운 후원사를 찾아 나서야 했다.
레슬링협회의 '스폰서 찾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 사정이 좋은 편이 아니다.
여기에 올해 초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레슬링을 하계올림픽 핵심종목에서 탈락시켰다가 이달 초 총회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다시 선택하는 해프닝이 벌어지면서 분위기가 더 뒤숭숭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내우외환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찾은 것이 이번 대회의 경사로 이어졌다.
올림픽 핵심종목 퇴출 파문을 겪으며 국제레슬링연맹(FILA)이 룰 개정에 나서자 한국 레슬링계는 체력이 강한 국내 선수들에게 유리하다며 반색했다.
올해 초 지휘봉을 잡은 안한봉·박장순 감독도 체력훈련의 강도를 끌어올리며 선수들을 독려했다.
여기에 이례적으로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2주 가까이 현지 적응 훈련을 치러 선수들의 컨디션과 자신감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 메달을 따낸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앞으로에 더 큰 기대를 갖게 만든다.
한국 레슬링의 간판스타인 김현우는 첫 세계대회 정상을 밟아 '그랜드 슬램'을 눈앞에 뒀다.
이미 올림픽과 아시아선수권대회를 제패한 그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정상에 선다면 박장순, 심권호 등 한국 레슬링의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55㎏급 최강자인 최규진은 아쉽게 결승에서 패배했지만 무릎 인대 부상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3년 만에 다시 시상대에 올라 부활의 전주곡을 울렸다.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낸 류한수와 우승재는 대표팀의 세대교체를 상징한다.
두 선수는 모두 올해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단 신예임에도 단숨에 메달을 목에 걸고 새로운 기대주로 떠올랐다.
이번에 대표로 발탁되지 못한 김지훈(성신양회), 정지현(삼성생명) 등 이들의 체급에는 강한 경쟁자들이 많아 내부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량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랫동안 스타 기근에 시달리던 한국 레슬링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1년 앞두고 '르네상스'의 가능성을 본 셈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많이 본 뉴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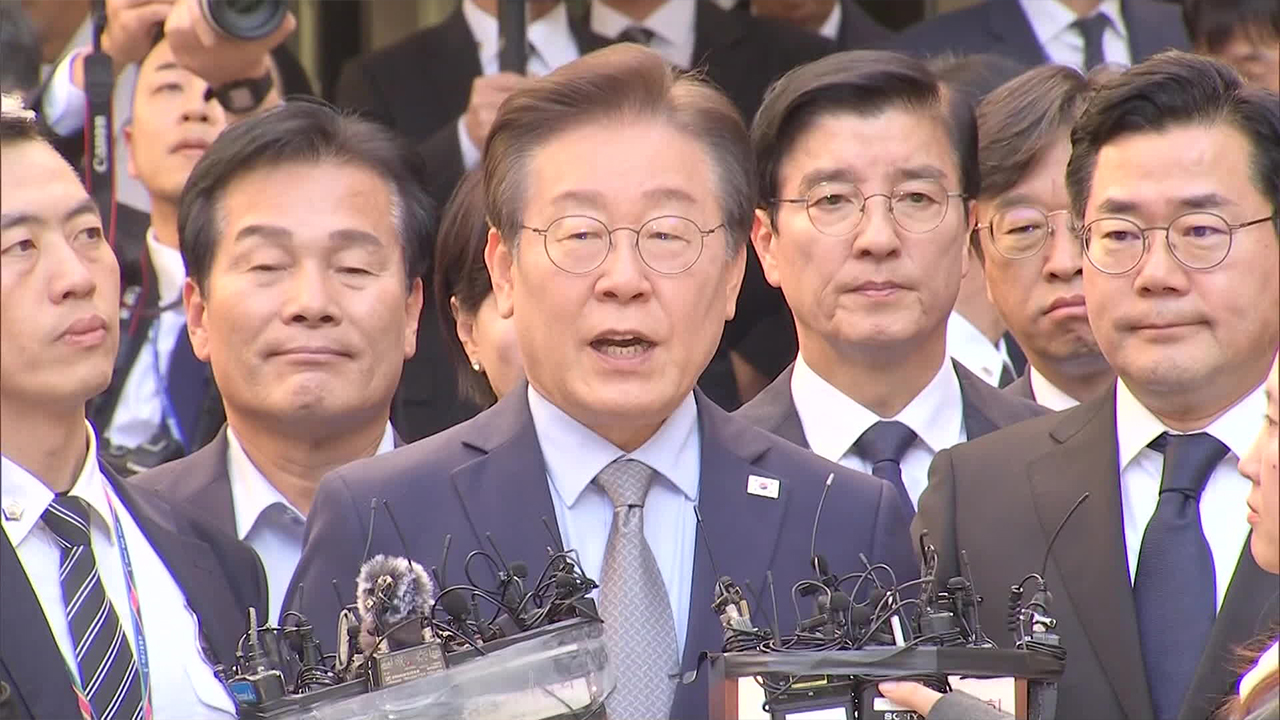






![[단독] 한동훈 “민주당, ‘현타’ 올 것…겁박 시위가 오히려 역효과 내”](/data/news/2024/11/15/20241115_zy0ZHv.jpg)





![[건강충전] MSG는 몸에 나쁘다?…오해와 진실](/data/news/2013/10/01/2731813_90.jpg)
![[화제포착] 친자 확인 검사, 어떻게 이뤄지나?](/data/news/2013/09/25/2728624_13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