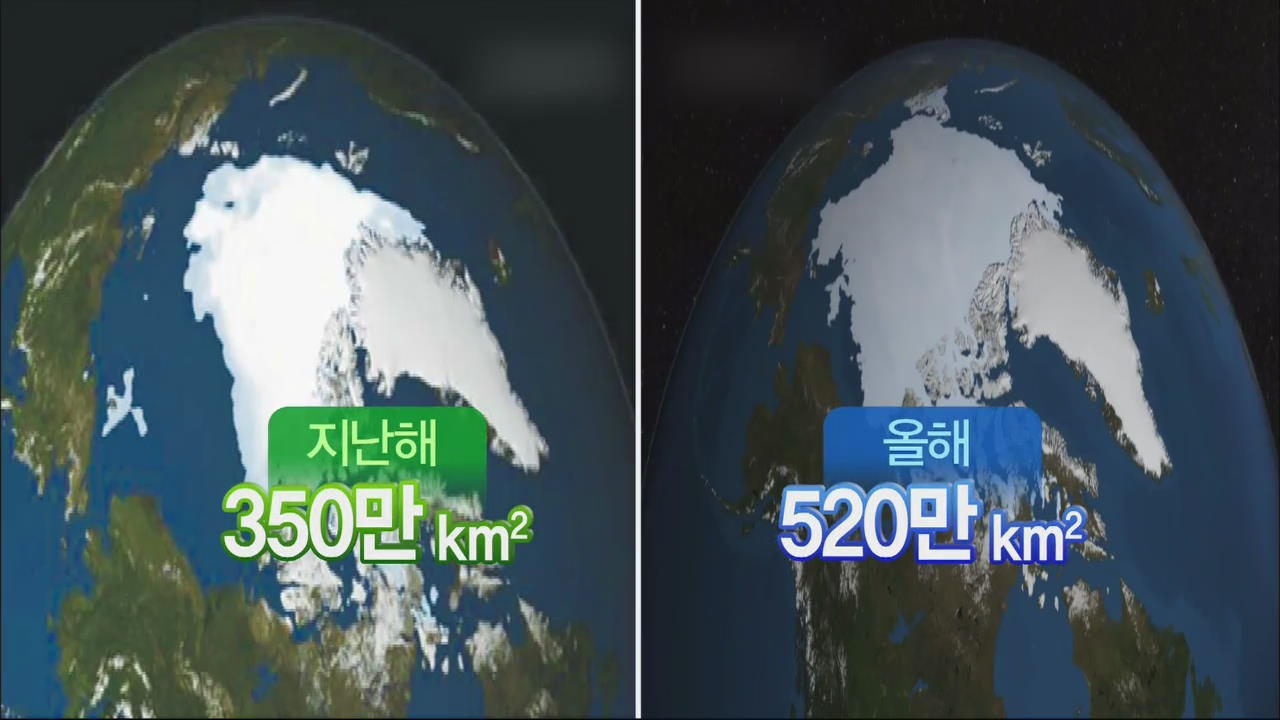레슬링 김현우·류한수, 체급 올리고 ‘펄펄’
입력 2013.09.23 (10:52)
수정 2013.09.23 (13:43)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CLOVA Summary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23일(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13 시니어 세계선수권대회 그레코로만형 74㎏급 금메달을 따낸 김현우는 원래 66㎏급에서 활약하던 선수다.
지난해 런던올림픽에서 한국에 8년 만의 금메달을 안긴 종목도 그레코로만형 66㎏급이었다.
평소 체중이 76∼77㎏ 정도로 경기 전마다 10㎏ 이상을 빼야 하던 김현우는 고심 끝에 올 시즌부터 74㎏급에 도전하기로 했다.
레슬링에서 체급을 바꿔 성공하는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선택이었다.
한 체급 위에서 맞붙어야 하는 경쟁자들은 이전 체급보다 체격이나 힘 등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수준이 높은 이들이기 때문이다.
한국 레슬링 사상 유일하게 두 체급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심권호 대한레슬링협회 이사는 "자신의 한계를 두세 차례 넘어서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66㎏급에서 한 차원 높은 힘을 자랑하던 김현우는 새 체급으로 맞은 첫 시즌인 올해 국내 경쟁자들을 차례로 꺾고 태극마크를 확보했다.
이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 불과 1년 만에 두 체급에서 정상에 오른 주인공이 됐다.
결승에서 격파한 상대는 2011년 세계선수권대회와 2012년 런던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최강자' 로만 블라소프(러시아)였다.
새 체급의 절대 강자를 꺾었으니 66㎏급과 74㎏급의 '통합 챔프'에 등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현우는 지난해 올림픽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금메달을 확정지은 뒤 매트 한가운데에 태극기를 펼치고 큰절을 하는 특유의 세리머니를 펼쳤다.
레슬링인들은 늘 김현우를 두고 '여전히 기술적인 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큰 선수'라고 평가한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그랜드 슬램을 이루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까지 더 큰 업적을 쌓으리라는 기대가 높아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김현우가 선수 생활을 길게 이어가고자 체급을 올렸다면, 류한수는 돌파구를 찾고자 66㎏급으로 올린 경우다.
2006년 아시아주니어레슬링선수권대회 60㎏급 정상에 오르는 등 유망주로 꼽혔지만 성인 무대에서는 2∼3위에 머물렀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정지현(삼성생명)과 동년배 우승재(조폐공사)가 늘 그의 앞을 가로막은 라이벌이었다.
결국 지난해 런던올림픽 선발전에서 다시 고배를 마신 뒤 66㎏급으로 종목을 바꿨다.
공교롭게도 정지현 역시 런던올림픽을 마치고 66㎏급으로 체급을 올렸지만, 올해 류한수는 정지현을 물리치고 마침내 첫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았다.
이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체급을 올린 지 2년이 되지 않아 거둔 성과다.
류한수는 새 체급에서 경험한 체격과 힘의 열세를 스피드와 운동량으로 만회했다.
워낙 다른 선수들보다 스텝이 빠르고 많이 움직이는 스타일인 류한수는 체급을 올린 후 이런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량을 끌어올렸다.
공격적인 레슬링을 추구하는 새 규정은 류한수의 스타일에 날개를 달았다.
류한수는 이번 대회에서도 예선부터 줄곧 빠른 움직임으로 경기를 주도해 상대를 압박하는 데 성공했다.
경쾌한 경기 스타일은 세리머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류한수는 우승을 확정하고 나서는 태극기를 들고 '말춤'을 추며 즐거움을 표현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많이 본 뉴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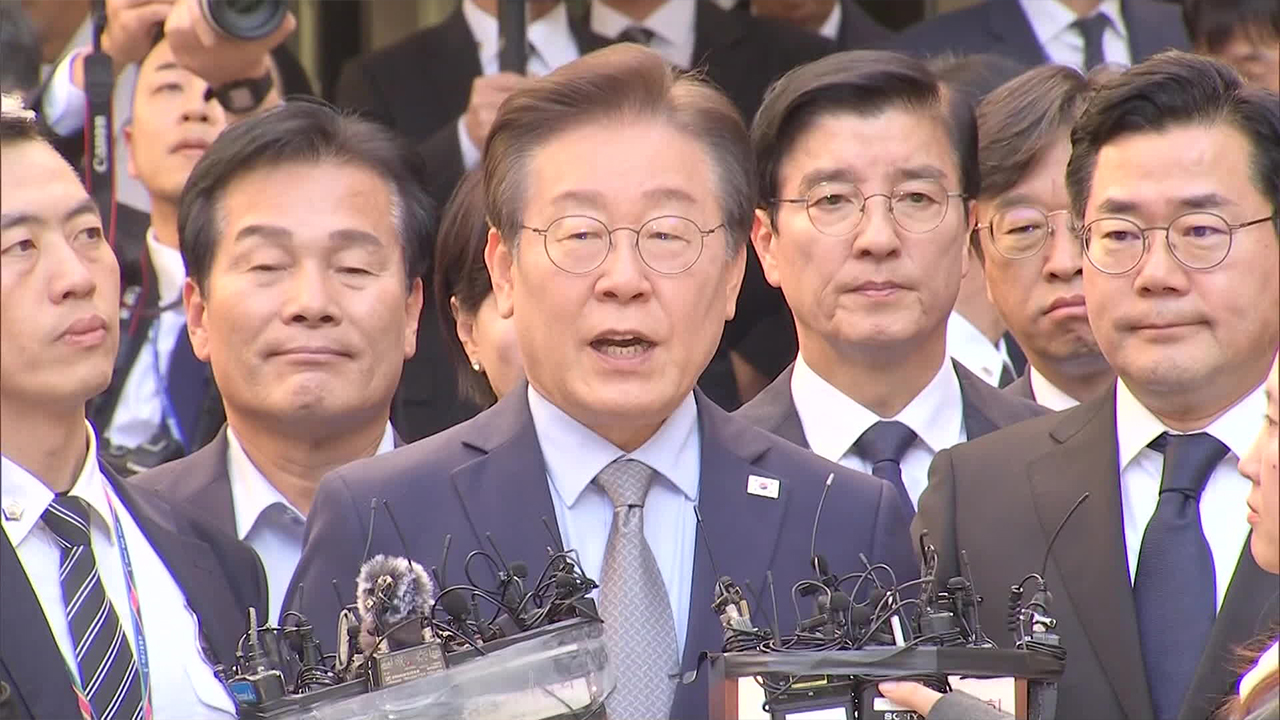






![[단독] 한동훈 “민주당, ‘현타’ 올 것…겁박 시위가 오히려 역효과 내”](/data/news/2024/11/15/20241115_zy0ZHv.jpg)





![[건강충전] MSG는 몸에 나쁘다?…오해와 진실](/data/news/2013/10/01/2731813_90.jpg)
![[화제포착] 친자 확인 검사, 어떻게 이뤄지나?](/data/news/2013/09/25/2728624_13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