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릴 듯 열리지 않은 ‘서울극장’ 잘 싸웠다
입력 2013.11.10 (07:46)
수정 2013.11.10 (08:46)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CLOVA Summary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9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승 2차전이 열린 중국 광저우의 텐허 스타디움에는 경기 시간 2시간 전부터 4만2천여 명의 관중이 운집했다.
중국 공안당국은 구름 관중이 집결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찰 1만명을 동원해 경기장 곳곳에 배치했다.
당국은 훌리건의 난동을 막기 위해 보안을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수준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장 출입문에는 전자 검문대가 설치·운영됐다.
광저우 서포터스는 광저우 구단의 홈 유니폼 색깔에 따라 관중석을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였다.
서울은 녹색 원정 유니폼을 입었다.
서울을 응원하는 관중은 한국에서 건너온 500여명과 광저우 교민 500여명 등 1천여명에 불과했다.
경기 시작 전 역대 AFC 챔피언들의 활약상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경기장에 방영됐다.
2006년 전북 현대, 2009년 포항 스틸러스, 2010년 성남 일화, 2012년 울산 현대의 플레이가 자막과 함께 흘러나왔다.
K리그의 자존심을 걸고 출전한 서울을 응원하는 1천여 팬들은 환호성을 냈다.
그러자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광저우 팬들은 바로 집단 야유로 환호성을 지워버렸다.
서울은 전반 내내 이렇다 할 득점 기회를 잡지 못한 반면 광저우는 서울을 계속 몰아붙였다.
관중은 광저우가 서울 진영에서 공을 소유할 때마다 우렁찬 환호로 광저우 공격진에 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나 응원은 광저우의 공격이 번번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자 차츰 시들해지기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조용하던 경기장은 후반 12분 광저우 엘케손의 선제골이 터지자 함성으로 떠나갈 듯이 흔들렸다.
그것도 잠시. 4분 뒤 서울의 데얀이 동점골이 터지자 경기장에 갑자기 적막이 흐르면서 서울 서포터의 환호만 메아리쳤다.
이 골은 광저우가 이날까지 올 시즌 AFC 챔피언스리그 14경기에서 허용한 첫 홈 실점이었다.
서울은 한 골만 더 터뜨리면 아시아 정상에 설 수 있었다.
후반 추가시간까지 서울의 공격은 계속됐다. 서울은 극적인 역전쇼를 자주 펼쳐 서울 구단의 경기는 '서울 극장'으로 불렸다.
골은 터질 듯 터질 듯 끝내 터지지 않았다.
두 구단은 1차전 2-2, 2차전 1-1, 합계 3-3으로 비겼으나 적지에서 더 많은 골을 넣는 쪽이 이기는 원칙에 따라 우승 트로피는 원정에서 2골을 터뜨린 광저우에 돌아갔다. 서울 선수들은 그대로 그라운드에 쓰러져 눈물을 쏟았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많이 본 뉴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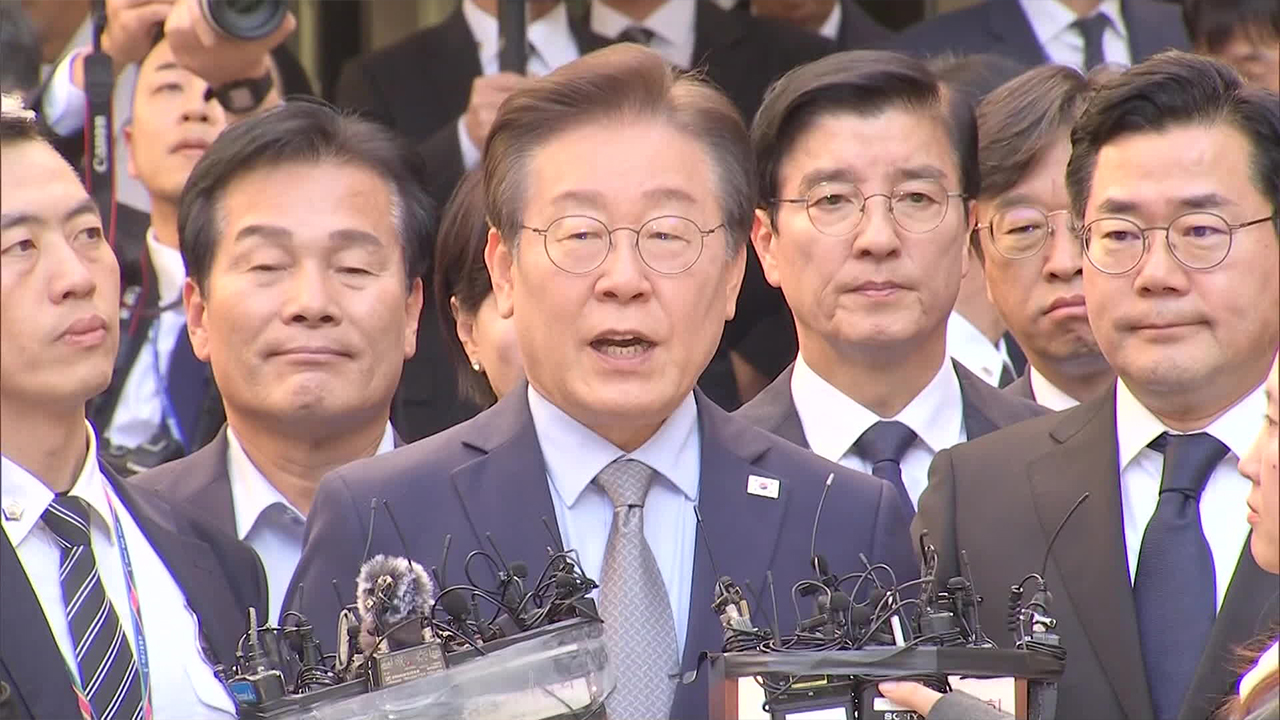






![[단독] 한동훈 “민주당, ‘현타’ 올 것…겁박 시위가 오히려 역효과 내”](/data/news/2024/11/15/20241115_zy0ZHv.jpg)




![[활력충전] 식품건조기 써보니…장·단점은?](/data/news/2013/11/13/2754433_130.jpg)

![[활력충전] 김장배추, 맛있게 절이기 간편 방법!](/data/news/2013/11/18/2756984_130.jpg)